책을 읽다보면, 이 책에서 읽었던 것을 다음 책에서 발견한다던가, 이 책에서 나왔던 누군가가 혹은 장소가 다음에 읽게 되는 책에 나온다던가 하는 유일한 독자인 '나'만이 발견하고, 즐거워라 하는 그런 우연들을 종종 만나게 된다.
예를 들자면, 닐 게이먼의 <네버웨어> (런던 지하도시에서 일어나는 고딕시티판타지물)를 읽고 나서, 이기중의 <유럽맥주견문록>을 읽는데, <네버웨어>에서 나왔던 중요한 열쇠를 얻기 위해 찾아갔던 블랙프라이어(blackfriar) 역이 나온다. 이기중의 책에서 <네버웨어>에서 처음 봤던 런던의 블랙프라이어역이 떡하니 나오면서, 블랙프라이어역이 있는데, 검은수도사란 뜻이다. 라는 설명이 나오면, ' 나 이거, 알어! 알어!' 하면서 괜히 반가워 하는 식.
혹은 요네하라 마리의 <미식견문록>을 읽다가 식물학자 플리니우스 이야기가 나오면, 아, 얼마전 <위대한 박물학자>에서 봤던 로마의 플리니우스! 하면서 즐거워하는 식.이다. 사실 <위대한 박물학자>를 읽고 나면, 그 후에 읽는 많은 책에 영향을 끼치긴 한다. 지금 읽고 있는 오노레 드 발작의 <나귀가죽 Magic skin> 에 조르즈 퀴비에에 대한 장광설이 나오는데, (실제 발작이 조르즈 퀴비에를 무척 좋아했다고 한다.) 고생물학의 창시자인 조르즈 퀴비에, 역시 <위대한 박물학자>에서 멋지구리한 아프리카검은 따오기 뼈대삽화와 함께 보았던 것이다.





뭐, 워낙 책을 많이 읽으니깐, 이건 우연도 뭣도 아니고, 필연까지는 아니라도, 상당히 높은 확률로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일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방금 만난 우연에는 꽤 놀랐단 말이지.
지금 내가 간만에 무지 흥분되는 책을 만났다. 이 책에 대한 페이퍼를 쓰려고, 두 개쯤의 길디긴 페이퍼를 '임시저장' 해 놓긴 했는데, 맘에 안 들어서, '올해의 책', '수년간 나온 프랑스에 관한 가장 멋진책' , '내가 좋아하는 여행에세이', 등등을 생각하며, 아껴서 꼭꼭 씹어 읽고 있는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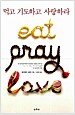

얘기하고 싶어 입이 근질거리긴 하는데, 막상 이야기하려니 뭐부터 이야기해야 좋을지 모르겠고, 그래서 이야기 못하고,
계속 입만 긁고 ... 는 아니고;;
무튼, 이 책은 파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뉴요커 기자인 저자가 파리에서 5년간 (1995-2000) 거주하면서 느낀 일들을 쓴 책이다.
정치,문화,경제,인간, 도시,인문, 등등에 대한 이야기들이 하나하나 예사롭지가 않다. 분명 잠깐 들리는 '여행'과 그곳에서 '거주'하는 것은 다르다. 크게 봐서 집 떠나서 먹고 자니 '여행' 에 속한다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정말 멋진 글, 감탄이 절로 나오는 글, 생각거리들을 부르는 글.들이다. 글 자체도 조근조근하지만, 각 챕터의 완성도가 놀랍다. 가벼워서 후 불면 날아가버릴 것 같은 목차의 제목들과 '파리에 중독된 뉴요커의 유쾌한 파리 스케치'라는 카피에 별 기대도 안하고 집었던 책임에도 불구하고, 대만족.
한챕터씩 그야말로 '아껴' 읽고 있다. 방금 읽은 챕터의 제목은 '프랑스제 원격오류'
'무엇을 만들어도 필립 스탁이 만든것처럼 만드는 프랑스인들이 만든 프랑스제 팩스'는 그런대로 효율적이지만, 그 조그만 창에 뜨는 그날의 사건 사고에는 약간의 문제가 있다. 로 시작하는 이 글은 프랑스인, 미국인, 프랑스의 외국인에 대한 이야기들로 이어진다. 이 챕터의 소챕터중 '이방인의 외로움' 에서는 '외국에 거주하는 사람의 외로움은 약간 색다르고 복잡하다. 자유롭고 탈출했다는 기분과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고 이야기하기도 한다.
얼마전 읽은 엘리자베스 길버트의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고>도 그렇고, 이 책도 그렇고, 외국에의 거주, 생활과 여행에 대한 생각들을 하면서 책을 덮고, 다음 책으로 넘어갔다.
지금 읽고 있는 책은 <쿠엔틴 타란티노>, <파리에서 달까지>, 발작의 <나귀 가죽>, 그리고 이제 새로 읽기 시작한 장정일의 <구월의 이틀>이다. 무지 맘에 드는 책을 읽다가, 그닥 내키지 않는 책을 심드렁하게 펼쳐들었는데, 첫 페이지가
 |
|
|
| |
어느 도시로 여행을 가는 것과 그 도시에 살러 가는 것은 분명 다른 일이다. 아무리 작은 이사라도 소풍처럼 간단할 수는 없다. 어떤 사람은 새로운 도시에서 자신이 몰랐던 욕망을 정확히 알게 되고 그래서 그 도시와 하나가 되고, 또 다른 사람은 환멸을 배우거나 혼돈에 빠져 허우적거리다가 왔던 곳으로 되돌아간다.
|
|
| |
|
 |
로 시작한다.
제목가 작가 이름만 보고 샀던 책이라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고, 첫 다섯줄 읽은 정도라, 이 책이 어떤 이야기를 할지는 짐작도 안 간다만, 방금까지 읽고 있던 <파리에서 달까지>에서의 감성이 뜬금없이 고스란히 이어지는 기분이라, 아마 후에라도 장정일의 책을 보면, 애덤 고프닉이 떠오르겠구나. 싶었다. (책의 내용보다, 책과 관련된 사소한 사실들을 더 잘 기억하는 나;;)
아마, 장정일의 책은 파리의 뉴요커가 쓴 책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겠지만, <파리에서 달까지>의 책장을 덮고, <구월의 이틀>의 책장을 펼친 나에게는 우연 중의 우연.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