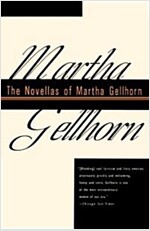사유를 동반하는 산책 혹은 걷기를 불어로 flanerie라고 하고 그 행위자 flaneur 의 여성형 명사가 없다는 점에서 이 책은 시작한다. 남성 시선의 대상으로 '구경거리'였던 여성들이 주체가 되어 걸으며 철학적 혹은 전복적 시선을 주위에 던졌던 그 길들을 같이 걸으며 그녀들의 예술도 짚어보는 책이다. 더불어 저자 자신의 여러 도시 경험도 서술한다.
책의 출간 당시 저자는 30대 후반의 뉴욕 출신으로 파리에 거주(혹은 정착)하는 여성이다. 그는 이 책에서 두 언어 사이를 오가고, 유대교, 유럽 이민자, 미국, 프랑스의 여러 역사와 문화 사이을 오가며 되짚어본다. 하지만 그 시작은 아주 귀여운 백인 여성의 유러피언 판타지로 보였다. 메트로폴리탄 도쿄의 외국인 거주지 호텔/레지던시에서 프랑스인 애인 은행 관리직의 동거인으로 비교적 ‘특권’을 누린 위치에서 그 편협함이 어김없이 드러나기 까지 한다. 1999년 스무살 때 파리에 가서 라쿠폴라에서 노트에 뭔가를 적으며 오래 앉아있었다더니.... 몽파르나스, 서울의 고터에 해당하는 그 거리, 나는 왜 기억하는가. 아 그 17세기 돌벽 건물 사이의 골목길, 달큰한 냄새를 풍기던 오전의 카페를 나는 기억하네. 그리고 조금 설렜네. 하지만 동양인 여자에게 더 좁은 골목길, 덜 자유로운 도시였음을 중년의 아줌마가 되어서도 기억한다네. 또 책을 잔뜩 주문했지 머야. (겔혼 책은 번역된 게 없다. 2012년 영화도 품절)
저자에 대한 신뢰가 약하니 내용에 집중할 수도 호응을 하기도 어려웠다. 하지만 이 책에서 소개하는 ‘도시를 걷는 여성 예술가’들 중 런던의 버지니아 울프와 파리의 바르다, (걷기 보다는 주로 뛰고 굴렀다는 이미지인) 스페인 에서의 마사 겔혼의 이야기는 강렬하다. 저자가 처음부터 언급하는 flanerie의 정의가 꽤 넓게 적용되는 듯 하지만 결국 사적인 공간을 떠나 공적인 공간을 자신의 의지로 걷고 타인(주로 남성)의 시선을 견뎌내고 더 나아가 자신의 시선을 던져서 관찰하고 맞서고 비판하며 기록하는 여성 예술가들의 이야기! 야말로 내가 이 책에서 만나야 할 대상이었다. 하지만 종종 끼어드는 이 저자의 어설픈 서술에 내 독서는 방해를 받았다. 게다가 마무리 부분에서 캣콜링을 즐기는 '주체적 여성' 입장 해명이나 '우리 모두는 난민' 서술은 의아함을 한참 건너 뛰어 버린다.
매일 아이들을 채근해 각각 컴퓨터 앞에 앉히고 끼니를 챙긴 다음 나는 나 대로 책 속으로, 파리로, 뉴욕이나 기원전 그리스나 때론 우주로 날아가, .... 걷는다.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으로 나의 (날 찾지 말아라) 시공간을 확보하고 숨을 고른다. 책들의 공간과 서재, 작가들, 또 사이버 공간을 걷는다. 교보, 예스, 밀리의 서재, 그리고 나의 본진 알라딘. 이 코로나 시대의 걷기, 남의 시선 따위 무시하고 내 멋대로 생각하며 방랑하기는 최고의 사치 아이템이 되었다. 저자 로런 엘킨은 자신의 이 첫 책에서 (어쩐지 티가 났어) 실망을 불렀지만 이 시국에 이처럼 유혹적인 책을 만나기도 쉽지는 않다. 이제 버지니아 울프의 런던을 걸어야 겠다.
덧: 현지 시간으로 일요일, 프랑스 오르세 미술관에 스무 명 정도의 여성들이(FEMEN) 상의를 벗고 시위를 했다. 가슴엔 "음란함은 니들 눈에 있다" 라고 써놓았다. 며칠 전 가슴이 너무 패인 옷을 입었다고 출입을 거절당한 미술관 관람객 뉴스에 항의하는 시위였다. 시위가 끝나자 다른 관람객들이 박수를 쳐주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https://www.bfmtv.com/paris/des-femen-au-musee-d-orsay-apres-qu-il-a-refuse-l-entree-a-une-femme-a-cause-de-son-decollete_AN-20200913009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