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77년 서울에서 태어나 단국대 공대를 졸업하고 단국대 문예창작과에서 박사를 받은 것으로 들었지만 확실하지 않다. 2008년에 쓴 어느 블로그 글에서 단국대 공학부를 졸업했고, 현재 박사과정에 재학중이며 2002년에 동아일보 신춘문예 시부문에서 <가문비냉장고>가 당선해 등단했다고 써 있으나 나는 블로그 글을 별로 믿지 않는 사람이다. 1977년생 김중일이 1996년에 단국대 공학부를 졸업했다니 이때 나이 만 19세. 이게 사실이면 적어도 이 양반, 영재 아냐? 하여간 블로그에 이렇게 나와 있다니까 글쎄. 근데 문예창작과 박사학위는 얻은 거 같다. 지금 광주대학 문예창작학과 교수이자 학과장으로 있는 걸 봐서. 우리나라가 학위 없으면 강사도 하기 힘든 학벌 국가잖아. 아무튼 잘 했다. 시만 써서 어디 목구멍에 풀칠이나 제대로 하느냐는 말이지. 교수 명함 가진 시인이 시인 모임에 나가면 술 마시던 보통의 시인들이 전부 일어난다잖아. 술값 낼 교수님 오셨다고. 그 “교수 시인”이 쓴 시에서 읽었다.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겠지만. 하긴 요즘에 갤러리아 백화점 옥상에서 돌 던지면 시인 아니면 화가가 맞는 세상이긴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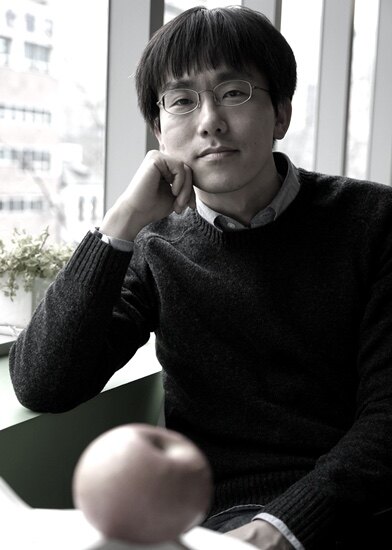
김중일
나는 김중일의 시가 어떻고 저떻다, 라는 말을 할 재주도, 능력도, 시각도 갖고 있지 않다. 그냥 읽은 소감, 느낌을 얘기할 뿐이다. 이 시집은 그저께 읽었다. 그런데 시인 김중일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읽은 소감, 느낌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는다. 분명히 읽었고, 읽는 중에 자주 지루했으며, 시가 대체로 길었다, 정도. 물론 짧은 시도 있다. 예를 들어 이런 거.
기념일
우리가 함께 매일매일 무수히 구부렸던
숫자들을 모두 도로 감쪽같이 펴놓아야지
물고기처럼 평생 물거품과 키스해야지 (p.97 전문)
짧아서 좋지? 어차피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자 쓴 시인 줄 모를 텐데 길게 쓰면 길게 쓸수록 독자는 미로에 더 깊숙이 빠질 것 같으니. 1연에서 ‘숫자’가 어떤 날짜를 가리킨다는 건 알겠다. 뜸하지만 간혹 시집 읽은 눈치로. 그러나 ‘기념일’이 구부렸던 걸 펴는 게 아니라 반대로 빨랫줄처럼 이어지는 날짜들 가운데 하루를 접어서 구부려 그 날을 기념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 그걸 다시 편다면, 혹시 기념일이 귀찮기만 하고 아무짝에도 쓸모 없다는 뜻일 수도 있고. 2연에서 평생 물거품과 키스하는 물고기라는 말은 도통 이해불가. 당연히 현대시가 독자에게 무슨 이해를 바라는 바도 아니고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기는 하지만. 시집 속에 부제를 “흥얼거림으로의 떠듦”이라 붙인 <아스트롤라베>라는 시가 있다. ‘아스트롤라베’는 고대, 중세 시대 때 사용하던 천문관측기구를 말한다. 이 시에 이런 구절이 등장한다.
어제보다 한 마디쯤 더 작곡된 오늘 밤의 음계
그 속에 귀속된 마당의 파란 대문은 도돌이표처럼 부유하는 밤의 음표인 우리를 되풀이해 연주하고 있었다.
우리집 속에서, 조금씩 쇠락해가는 개집 속에서 하룻밤 묵은 사막여우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울부짖었다. 하늘은 해변으로 떠밀려온 부패한 해산물처럼 꾸물거렸다. 새들이 철퍼덕철퍼덕 날갯짓하며, 하늘로 하늘로 노 저으며 까마득히 내동댕이쳐지고 있었다.
환절기의 새들은 야간비행에 있어서만큼은 대열 속에서 합심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았다. 가장 가까이서 날고 있는 자신을 낳은 이가 가장 위협적인 암초가 되기 때문이었다.
아주 드물게는 집고양이가 그 새들을 잡기도 했다. (부분. p.13)
이걸 어떻게 읽어야 하나? 오늘 밤이 어제보다 한 마디쯤 더 작곡한 음계라니 시의 서정이나 감정이 아닌 음악, 음률로? 그럴 각오를 하고 읽으면 또 음률적으로 그럴듯하다. 물론 그럴 경우엔 “있어서만큼은”이라는 여섯 글자 단어가 위험하지만. 같은 여섯 글자 단어라고 해도 “철퍼덕철퍼덕”은 세 글자 단어인 “철퍼덕”을 연이어 사용해 충분히 음률적이다. 그거 하나 빼면 음악적으로도 읽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러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은 왜지? 틀림없이 무슨 메시지를 담은 시 같다. 그게 뭔지 몰라서 문제지만. 이 시에서 야간비행하는 환절기의 새들이 나오는 것처럼 시인은 새, 사막여우, 낙타 같은 척추동물을 자주 등장시킨다. <새들의 직업>이라는 시도 있다. 거기에서:
동생(同生)이 죽었다.
동생은 죽어 지금 내 발목에 그림자 대신 매달려 있다. 동생은 나름 허공에 질질 끌며 땅속을 걷는다. 땅 속을 걷다보면 태어날 자들과 죽은 자들의 이마에 손을 얹고, 내년에 피고 질 꽃들을 미리 꺾을 수 있을까.
동생이 죽었다.
움직이는 하늘의 파오 속으로 찬바람이 들어왔다. 바람이 막사 안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듯, 동생의 곡두가 슬픔과 권태의 바깥에서 긴 칼날을 막사 안으로 푹푹 찔러넣듯, 까마득한 하늘 저 멀리 뾰족한 철새떼가 무수히 박혔다 사라졌다.
동생이 죽었다.
동생은 구름이란 보풀만 가득 핀 허공을 걸치고 있다가, 한 떼의 새들에 의해 허공과 함께 기워져버렸다. 어제로 벗겨져버렸다. (부분. P.25~26)
시 속에 나오는 ‘파오’는 이동형 주거 천막인 게르. 곡두는 허깨비, 허상, 헛것을 뜻한다.
동생은 아우를 말하지 않는다(라고 나는 생각한다). 물론 아우를 칭하는 ‘동생’을 한자어로 쓰면 同生이 맞다. 이 시에서 ‘동생’은 나하고 같이(同) 태어난(生) 것. 그래서 흔하게 이야기하는 ‘내 속의 또다른 나’일 수도 있고, 시 속에서 말한대로 그림자처럼 나한테 매달린 ‘무엇’일 수도 있다. 특히 ‘그림자’의 서양적/유럽적 해석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림자보다 훨씬 중요한 매개변수로 작동한다. 그게 죽어, 없어져… 그게 뭐, 어떻게 됐는데? 모르겠다. 내년에 피고 질 꽃을 미리 꺾을 수 있을지 궁금해했다가 난데없이 어제로 벗겨져 버렸으니, 동생의 시간은 거꾸로 흐른다. 거꾸로 흐른다기 보다 “꼬리에 꼬리를 문다”는 것이 더 적당하다. 당연히 이 의견은 평론가 조강석의 해설을 읽으면서 배운 거다.
<늙은 역사와의 인터뷰>에서 “역사”는 힘이 센 역사(力士)를 말한다. 얼마나 늙었느냐 하면 “늙은 아들이 방금 집안에 남은 마지막 명부(冥府)행 티켓을 훔쳐 달아났다”니까 한 마디로 겁나게 늙었다. 그러니까 말은 역사(力士)라고 하더라도 늙은 내력을 봐서 역사history로 봐도 무방하다. 아우가 아닌 동색(同生)을 보듯. 이 <늙은 역사와의 인터뷰>에서는 이런 구절이 나온다.
이 모든 의혹에도 아랑곳없이 피곤한 역사는 오늘도 검은 그림자를 벨벳망또처럼 질질 끌며 방으로 돌아옵니다. 백열여덟해 동안 이 전설적인 역사가 아직 한번도 내던지지 못한 게 있다면, 유일하게 역사의 무거운 그림자뿐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과연 그렇습니까?
……
역사는 제 그림자의 긴 지퍼를 열고, 침낭같이 목관같이 어둡고 아늑한 그 속으로 들어가 몸을 눕힌다. 이봐 친구,
나는 할 말이 없으니 부탁인데 이제 그만 그 달 좀 치워줘
내 그림자와 함께 안전하게 사라질 수 있도록 (부분 p.76~77)
이 시에서 등장하는 그림자. 118년 동안 힘센 역사가 단 한 번도 던져버리지 못한 유일한 것. 자기 자신 말고 또 뭐가 있을까? 결국 늙은 力士 또는 歷史는 그렇게 시체 처리용 검은 비닐 속으로 들어가 지퍼를 올린다. 지금 여러분은 이렇게 또 한 히스토리가 사라지는 현장을 목격하고 계십니다.
김중일의 그림자는 <외과의사 늘의 긴 그림자>로 가면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그림자 이야기만 나온다. 의사의 이름이 “늘.” 물론 중의적이다. 언제나와 같은 의미로 늘을 생각해도 괜찮을 듯.
늘 그도 사실 자신의 대책 없는 환자들처럼, 평생 태양의 발등 위에 두 발을 올려놓고 태양과 같은 속도로만 매일 아등바등 걷는다면 감쪽같이 제 그림자를 숨길 수 있다고 믿었지. 구름의 문양으로, 각양각색 병들어가는 걸 숨길 수 있다고 믿었지. 하지만 그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예방법. 늘의 동공과 하늘의 달은 잘못 끼워진 단추처럼 빛을 발한다. 마지막 단추가 풀리듯 달이 구름 속으로 스며든다. (부분. P.122)
그만 쓰자. 독후감이 너무 길다. 한 마디만 보태자면, 김중일의 시는 불면이고, 밤이며, 죽음이라는 것. 그만 쓰고 시도 이제 그만 읽을까? 대체로 우리 현대시, 다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는 전제로, 너무 어둡고 무겁고 우울해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 게다가 내 수준으로는 너무 어렵기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