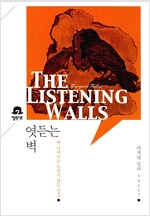
마거릿 밀러 <엿듣는 벽> 리뷰
(미스테리아 4호에 게재된 김용언 님의 리뷰입니다)
마거릿 밀러는 당대에는 남편 로스 맥도널드를 뛰어넘는 작가로 군림하였으나 사후 한동안 많은 이들에게 잊혔고(장르를 막론하고 많은 여성 작가들이 겪는 부당한 대우다), 2000년대 들어와 여성 미스터리 작가들의 재조명이 이뤄지면서 재평가받고 있다. 마거릿 밀러의 예리하고 섬세한 범죄가 안겨주는 통증은 더 널리, 깊게 읽힐 가치가 있다.
다섯 명의 여자들이 있다. 에이미는 얼마 전에 이혼한 친구 윌마를 위로하기 위한 멕시코 여행을 함께 왔다. 어쩌면 에이미의 남편 루퍼트와 모종의 관계가 있었을지도 모르는 윌마가 추락사한다. 충격 받아 거의 실성하다시피 한 에이미를 데려가기 위해 루퍼트가 달려오지만, 집에 도착했을 땐 루퍼트 혼자뿐이다. 그리고 멕시코 호텔방 벽에 귀를 대고 에이미와 윌마 사이의 신경전을 엿듣는 종업원 콘수엘라가 있다. 루퍼트를 사모하는 사람 좋고 단순한 버턴 양, 시누이 에이미를 싫어하지만 남편 앞에서 차마 불만을 늘어놓지 못하는, 자신의 가정을 지키는 데에 혈안이 된 헐린이 있다.
이 여자들 모두 자신이 원하는 상과 바깥에서 보는 상이 다르며 그 간극에 대해 불만을 느끼지만, 또한 그녀들의 사회적 위치와 계급, 바깥에서 기대되는 역할에 따라 불만을 표출하는 방식이 확연히 달라진다. 가장 제멋대로 사는 것처럼 보였던 여자는 불행한 결말을 맞고, 계급의 가장 아래쪽에 속해 있던 여자는 자신의 욕망을 겁 없이 휘두르다가 광기에 휩싸이고, 가장 소극적으로 살던 여자는 예기치 못한 순간 날카로운 발톱을 살짝 내보인다.
『엿듣는 벽』에서 ‘살인범이 누구인가’는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물론 극 초반에 죽은 여인 윌마가 자살인지 타살인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친구 에이미가 범인일지도 모른다는 의혹만 남긴 채 에이미조차 사라지고, 에이미의 행방에 대해 모호하게 발뺌하는 남편 루퍼트가 혹시 그녀를 살해한 건 아닐까 하는 의혹이 짙어간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수수께끼가 꼬리를 물고 덤벼든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하지만, 범인이 누구인가는 사실 그렇게 궁금하지 않다. 심지어 마지막의 반전조차도, 어떤 해명이 덧붙여지지 않은 채 그저 툭, 우리 발 앞에 내던져질 뿐이다. 별다른 이유 없이 죽은, 사실 그럴 필요 없었는데 날씨와 기분의 타이밍이 더럽게 맞지 않아 일이 그렇게 되고 만 어떤 운 나쁜 시체처럼.
대신 독자를 사로잡는 것은 살아 있는 여자들이다. 정확하게는 그 여자들의 머릿속에 더럽고 치사하며 어두운 생각들이 어떤 식으로 불쑥 비밀스럽게 출몰했다가 예쁜 외관 뒤로 얼른 숨어버리는지, 타인에게 그것을 내보이지 않기 위해 얼마나 조용하면서도 치열한 전투를 벌이는지에 관한 묘사야말로 『엿듣는 벽』의 백미다. 길리언 플린의 『나를 찾아줘』보다 70여 년 앞서 마거릿 밀러는 믿을 수 없고 수상쩍인 여자들을, 남자들에게 그리고 사회적으로 통용되던 ‘이상적인 여성상’에 언제든 충격을 안길 수 있는 여자들을 그려냈다.
물론 남자들도 등장한다. 여자들의 욕망과 분노를 불러일으키며, 그들의 가정이 불안한 토대 위에서 가까스로 안정을 유지하는 정도로 허약한 건축물이었음을 가장 뒤늦게 깨닫는 인물들. 자신들이 여자를 보호하고 아껴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여자들의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그렇게 패배해야만 다시금 공인된 제도 안에 안주할 수 있는 인물들. 하지만 『엿듣는 벽』에선 어디까지나 여자들의 결투가 우선이다. 정숙하고 평온한 아내·부인·연인으로서의 역할만 요구받던 여자들의 마음속에 몰아닥치는 광기는 아주 조용하게, 천천히 드러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독자들이, 혹은 그녀들 자신마저도 이 변화를 눈치채기 힘들다. 그러나 일단 드러나는 순간, 그것은 ‘부엌 조리대 위의 식칼’ 같은 무시무시한 존재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