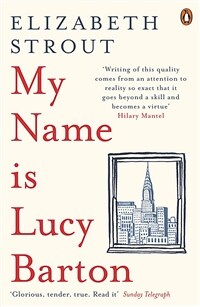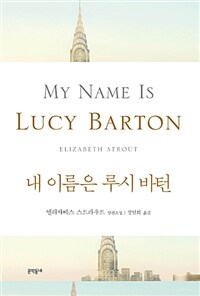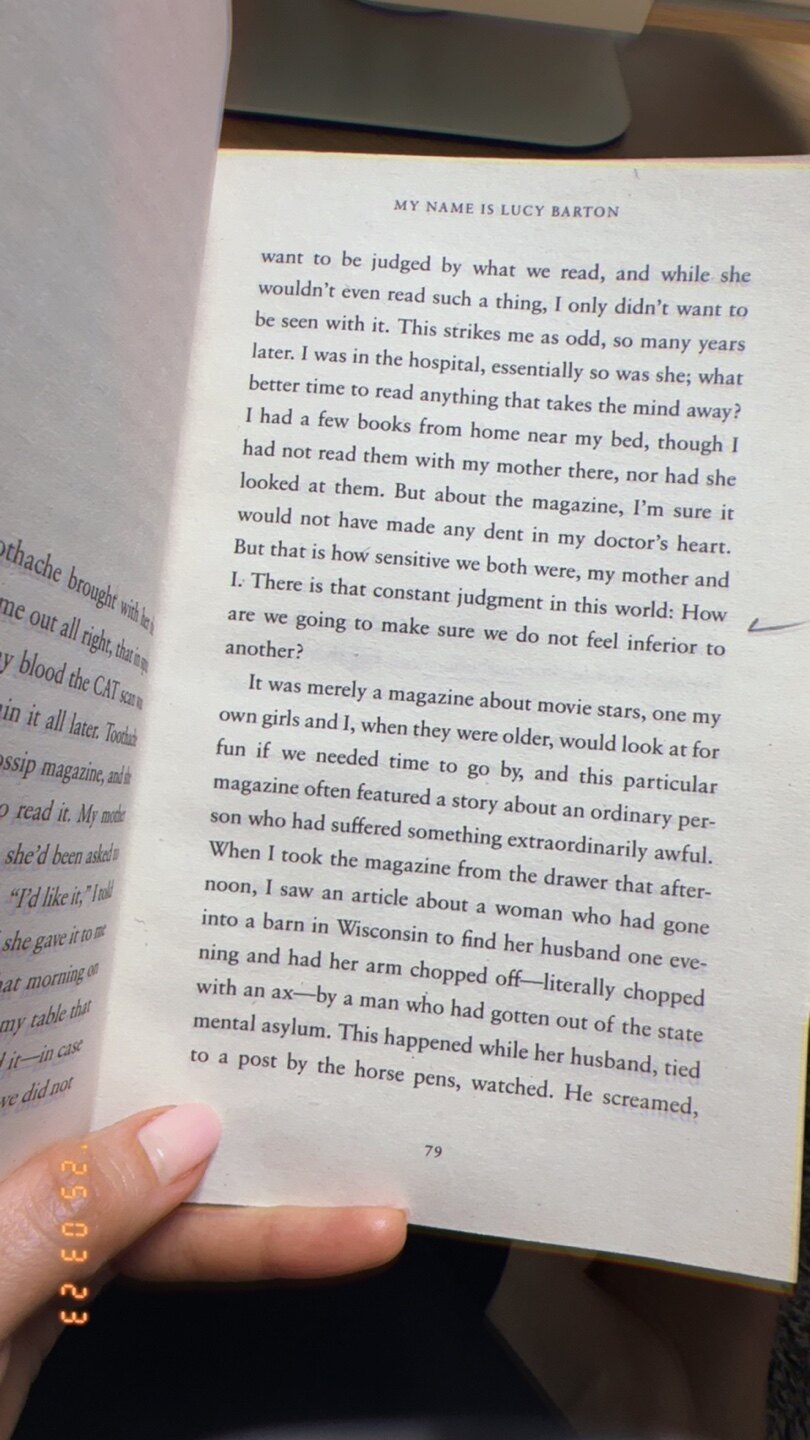
소설을 읽다가 문장들을 읽다가 작년에 겪었던 일과 재작년에 겪었던 일을 떠올려보고 인간이 인간을 그냥 싫어하는 게 어떻게 가능할까 했는데 '그냥'은 그러니까 그냥_이 아니라 다 까닭이 있는 거였다. 인간이 인간을 쉬이 좋아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인간이 인간을 싫어하는 데에도 다 나름의 원인이 있다는 사실, 쉽지는 않으나 그런 식의 방식도 가능할 수 있구나 싶은. 마찬가지로 아끼니까 차단을 하는 것도 말이 되네, 싶었다. 세세하게 다 설명하기는 불가능하지만. 이 책을 읽은 거 같은데 책 자체가 깨끗한 걸 보니 번역본으로 읽은듯. 내용은 모두 기억나는 걸 보면. 단골 카페에서 어떤 청년이 책을 읽고 있었는데 어떤 책인지 궁금했다. 화장실을 다녀오고 아이가 말했다. 저기 저 테이블, 완전 훈남, 이라고. 잘생겨서 훈남인가? 책을 읽고 있어서 훈남인가? 물어보니 둘 다, 라고 아이가 해맑게 웃으며 말했다.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좋은 시간과 나쁜 시간 모두 다 합쳐서.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서로를 잘 모르겠는 경우도 있는 거고. 얼마 전에 친구와 또 단골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걔를 혹시 무시하나? 했더니 친구가 대답했다. 응, 무시해, 라고. 귀가하면서 또 그 질문과 답이 떠올랐다. 나는 왜 걔를 무시하나? 라고. 그 인간의 덕성과 장점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는 까닭은? 인간 경시일까? 아니면 나도 모르게 계급성을 가지고 있는가? 혹여나 질투인가? 다방면으로 퍼즐을 맞추어보았지만 원인이 무엇이건 만나고난 후면 항상 찜찜했다. 그냥 촉인가? 그냥 선입견에 불과한가? 아직도 모르겠군. 그냥 읽다가 이 문장들을 마주하는데 딱 두 인간이 떠오르는 거였다. 읽기와 이해력의 상관관계, 어둠이 빛 너머로 서서히 다가오는 시간, 어두워도 더 이상 냉기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바로 여름 시작이다. 의도한 바 아니지만 작년 이때도 한 인간을 떠나보냈고 올해도 같은 경험을 했다. 오래도록 이 문장을 기억하게 될듯. 내가 중년이어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루시가 소설 속에서 한 말이 뭔지 딱 알겠구나 싶은 그 심정. 인생은 어쨌거나 흘러간다는 것. 더 이상 흐르지 않는 그 순간까지는. 괄호 속 문장 보고 또 나 혼자 환호성 내질렀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