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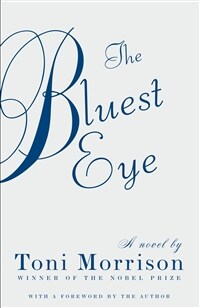
서그즈 첫 번째 소설 [가장 푸른 눈]은 백인의 잣대로 아름다움을 평가했던 흑인 공동체가 불러온 한 어린 흑인 소녀의 파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백인들의 기준으로 탁월함을 판단하는 학계와 출판계에서 자기만의 문학적 가치를 어떻게 발전시켜나가셨습니까?
모리슨 [가장 푸른 눈]을 집필할 때 바로 그런 생각이 앞섰던 것 같습니다. 그러려고 시도하기도 했고요. 그 자체로 미적 완결성을 가진 작품을 읽고 싶었습니다. 그 자체로 미적 완결성을 가진 작품을 읽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지만요. 다만 백인들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애쓰지 않는 책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었어요. 독자가 백인이라고 상정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고 싶지 않았죠.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쓴다고 생각하고 싶었어요. 그게 가능해지자 어떤 것들은 저절로 떨어져 나갔어요. 어떤 설명, 혹은 정의 내리기가 필요 없게 되었죠. 그리고 주제에 대해, 그러니까 그 소녀들, 그들의 내면과 나의 내면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게 되었어요. 어떤 면에서는 흑인 음악가들이 해온 것처럼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가치가 없으며 무엇이 구원받아 마땅한가에 대한 판단을 스스로 내릴 수 있게 되었지요. 바로 이것이 이 책의 동력이 되어주었습니다. 저는 남성이 쓴 굉장히 힘 있는 흑인문학을 상당히 많이 읽었지만 그 작가들이 남의 얘기를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나를 계몽하기 위한 글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무언가를 해명하기 위한 글이었지요...... 그들은 이런 해명을 아주 중시했습니다. 리처드 라이트(1908-1960, 소설 [미국의 아들]을 집필한 미국 흑인 남성 소설가)는 "미국이 어떤 곳인지 제대로 보여드리죠"라고 말하고 싶어 했어요. (20-21)

개인적으로는, 올해 읽은 몇 권의 책 중에서 굳이 탑을 꼽자면 토니 모리슨의 [가장 푸른 눈]이 심장을 가장 두근거리게 만든 책. 심장에서 심장이 다시 펄떡거리고 그 펄떡거리는 심장에서 또 심장이 새로이 생성되고 그 혈관이 쭉쭉 뻗어나가고 그 사이로 피가 마치 파도처럼 춤을 추면서 이동을 하니 읽는 동안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였다. 얼마 전에 친구와 오래도록 술을 마시지 않고서도 길게 전화 통화를 했는데 그때 힌트가 되어준 게 누구는 누구를 궁금해하고 누구 글은 읽고 싶지도 않고 한때 아릴 정도였는데 지금은 뭐 노관심이고 그런 일상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토니 모리슨의 인터뷰 글을 오늘 아침 읽다가 결국 카르마라는 게 생성이 되려면 이러한 것들이네, 알았다. 그건 또 어제 정신분석을 받고 온 친구가 들려준 이야기랑 겹쳤고. 마음이 저절로 가고 어디가 또 좋지 않을까 걱정되는 마음이 들고 별 거 아닌 일에도 신경이 쓰이고 그렇다면 그건 동시에 내 혈관이랑 겹치는 지점들인지라. 나이가 들어서 좀 좋은 건 하나하나 모조리 무게를 두지 않는다는 것. 업장소멸이라. 그럼 이쪽 뺨을 맞았으니 맞은편 뺨도 때리소서 하고 얼굴을 돌리는 게 업장소멸인듯 싶은데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20년이 가까워오는 시간 동안 그 업장소멸을 하려고 애쓴 건가 싶기도 싶었고 올해 일어난 사건들을 쭉 사후적으로 훑자니 또 업장소멸의 텐션이었던가 싶기도 싶은 것이다. 허나 따지고 들자면 업장소멸하기 위해서 태어났고 업장소멸하기 위해서 살아가고 업장소멸하기 위해서 죽는 거 같은데 깨달음의 길은 올곧게 한쪽 길인지라 이게 참 애매한 거지. 이것 봐, 애매하다고 하잖아, 깨닫기 싫은 거지. 우리 민이 표현대로 하자면 삐딱이 중의 삐딱이, 이 마음. 마음이 일어나서 하는 바가 아니면 애초에 그 마음으로 뭔가를 형성하지 않는 편이 세상에도 이롭고 본인에게도 이로운 거 아닌가 라는 스쳐 지나가듯 마주한 문장도. 슬렁슬렁 옷을 껴입고 나갈 시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