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살구나무가 있어 여름마다 공짜 살구가 잔뜩 생긴다. 작년에는 살구청을 담그고 재작년에는 살구잼을 만들었는데 올해는 그냥 도토리 까먹는 다람쥐처럼 서너 개씩 틈틈이 씻어 먹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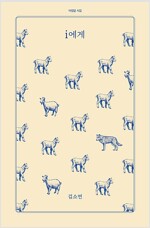
"좋아하는 친구가 베란다에서 키운 부추를 주어서
나란히 누운 부추를 찬물에 씻지
(중략)
부추를 먹는 동안엔 부추를 경배할 뿐"
김소연 <경배> 중에서
나 역시 살구를 먹는 동안엔 살구를 경배하고
내 살과 피를, 생명을 경배한다.
살리는 살, 죽이는 殺.

잊을 수 없는 살구 이미지를 남겨준 리베카 솔닛의 글.
애증의 관계였던 어머니가 죽은 후 남겨진 살구나무에서 수확한 살구들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양이 많았다. 나 역시 작년과 재작년에는 살구잼과 살구청을 만들겠다고 욕심을 한껏 부리는 바람에 그 엄청난 살구들에 질렸던 경험이 있다. 검은 씨를 빼낸 자리는 꼭 눈알을 파낸 것 같아 무서웠고 단번에 처리하지 못해 며칠간 유예된 살구들에서는 고름같은 진물이 흘렀다.
육박해오던 살구들.
윽박지르던 살구들.
재촉하고 회유하려 들던 살구들.

뭔가 음산하면서도 고요하고 아름다운, 이혜미의 시 <살구>를 옮겨본다.
메모했던 것을 보고 옮기느라 행갈이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
기다렸어 울창해지는 표정을
매달려 조금씩 물러지는 살의 색들을
우글거리는 비명들을 안쪽에 감추고
손가락마다 조등을 매달아
검은 씨앗을 키우는 나무가 되어
오래 품은 살殺은 지극히 향기로워진다
뭉개질수록 선명히 솟아나는 참담이 있어
마음은 죽어서도 끝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나무는 침대가 되고
어떤 나무는 교수대가 된다
열매들이 다투어 목맨 자리마다
낮은 신음소리가 흘러나왔다
매일밤 들려와
나무들이 개처럼 죽은 개처럼
허공을 향해 짖어대는 소리가
구겨진 씨앗을 입에 물고 웃는다
과육은 핑계였지
깨어져야만 선명해지는 눈동자들이 있었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