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는 일주일에 한 편 정도 업로드해야 구독자가 끊기지 않는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는 어디에서 들었을까. 정확한 출처가 기억나지 않는데 ‘어디서 들어본’ 것만은 확실하다. 이런 식으로 하나둘씩 출처 불명의 정보가 쌓이고 쌓여 ‘카더라’로 숙성되고, 곧 가짜뉴스로 다른 사람에게 옮겨지지는 않을지 신경이 쓰인다. 그래봤자 블로그 글이지만, 어쨌든 글을 읽을 최소한의 한 사람인 나를 속이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시간을 들여 글을 읽어주는 고마운 몇 사람을 위해서라도, 정확하게 꾸준히 써 보려 한다. 그러려면 시간과 체력이 많아야 하겠지만 지금은 일요일 저녁이고, 어린이는 오늘 점심을 늦게 먹었으니 저녁도 늦게 먹겠지.
연말연시인 관계로 회사는 어느 파트나 할 것 없이 바쁘게 움직이지만, 어쨌든 나는 내적으로 한 고비를 넘었다. 덕분에 연휴에는 그간 지지부진 읽던 책들을 마무리할 수 있었다. 그러고는 이내 또 버릇처럼 ‘올해 다 가기 전에 읽을 수는 있을까’ 생각하며 새 책을 두세 권 집어 들었으니, 스스로 책의 굴레에 매이기로 작정한 것도 아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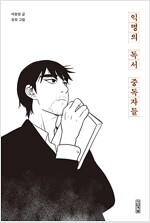
『익명의 독서 중독자들』은 말 그대로, 자신의 하는 일, 이름을 모두 드러내지 않을 수 있는 한 독서 클럽 구성원들의 이야기다. 책 읽는 사람들 사이에서 공감할 수 있는 유머 코드가 곳곳에 있어 읽는 내내 나도 모르는 친구들을 만난 듯한 반가움이 들었다. 발췌독을 대하는 등장인물들의 태도가 전에 읽었던 『책, 이게 뭐라고』와 상반되는 것도 흥미로운 지점이었다.
읽으면서 ‘책을 읽는 사람들 사이에 있고 싶다’는 생각을 참 많이도 했다. 책을 읽는 것 자체로 ‘신기하고 대단한’ 취급을 하는 사람들 말고, 무슨 책을 어떻게 읽었는지 진지하게 듣고 말하고 반색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서로 힘이 되어 주는 사람들 사이에 있고 싶다는 생각.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취업 준비하면서, 어린이를 돌보면서 참가하던 독서 모임조차 멀리하게 된 건 나다.
+그리고 지금 수도권의 현실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다.
(만약 책을 읽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일이 회사의 회의나 미팅에 버금가는 공적인 일이 된다면? 하고 잠깐 생각해 보았으나, 그렇게 되면 책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조차도 독서 모임 비슷한 것에 끼어 책을 ‘자유롭게’ 토론하는 일 없이 어떻게든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바라겠지.)
(따지고 보면 책을 매개로 한 SNS-바로 이 알라딘 서재 같은- 활동도 느슨한 독서 모임으로 볼 수 있을 텐데, 내 글을 쓰는 것 외에 다른 사람의 글과 활동에 충분히 감응하고 있는지를 반문한다면, 독서 모임 운운도 사실은 ‘여기가 아닌 어딘가로’ 가고 싶다는 회피 욕구의 반영 아닐는지?)
거리에는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내는 것이 조명밖에 없지만, 우리 집 어린이는 선물을 제때 받았다. 카드도 받았다. 산타…… 아저씨로부터.
선물 받을 나이가 한참 지난 나는 언젠가 ‘어차피 크면 산타 같은 건 없다는 걸 알게 될 텐데 굳이 헛된 수고를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지극히 내 편의를 기준으로 생각한 적이 있다. ‘동심’은 ‘파괴’되어야 할 어떤 것이 아니라 어린이의 세계 그 자체라는 것을 안 뒤에는 그 언젠가의 생각을 크게 부끄러워했다. 비슷하나 결이 한층 깊어진 논의가 (내 기준으로 2020년 올해의 책이라 여기는) 『어린이라는 세계』에 나온다.

어떤 어른들은 어린이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울리고 싶어한다. 어린이가 우는 모습조차 귀여워서 그럴 것이다. 그저 장난으로, 어린이의 오해를 유도해서 울게 마든다. 그 우는 모습을 ‘반응’이라고 여기며 즐거워한다. 잠깐이니까, 울고 나서 달래면 되니까, 정말로 큰일은 아니니까, 귀여워서 그러는 거니까 괜찮다고 생각할 것이다. 어쩌면 이만큼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애들은 다 그러면서 크는 거라고 가볍게 생각하는지도 모른다. 어쨌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은 분명하다. 어린이를 울릴 수도, 울음을 그치게 할 수도 있다고.
이런 상황에서 어린이는 대상화된다. 어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 (...) 어린이를 감상하지 말라. 어린이는 어른을 즐겁게 하는 존재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어른의 큰 오해다.
-김소영, 『어린이라는 세계』, 226-227쪽
어린이가 하기 싫어하는 일을 시킬 때마다 ‘산타’를 열심히 팔았으니, 아직은 글자를 읽지 못 해도 이왕이면 카드도 쓰는 게 좋겠지, 라는 생각은 곧 딜레마에 부딪혔다.
‘산타는 어느 나라 말을 쓰지?’
어린이의 내면에 있는 세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아주 큰 문제였다. 산타 아저씨(=나)가 익숙한 언어(한국어)로‘만’ 카드를 쓰는 것이 가장 최선이겠으나, ‘일관성’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다. 왜냐하면 얼마 전 어린이에게 보여주었던 산타 영상통화 어플에서는 줄곧 영어만 나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영어‘만’ 사용하기에는 산타 아저씨의 영어가 짧다. 산타 아저씨(할아버지)는 전 세계를 돌아다니니까 모든 나라의 언어에 능통해야 할 텐데…….
그래서 절충안은? 첫 인사와 마지막 이름은 영어로, 본문은 한국어로 썼다. 써 놓고 보니 내용도 어린이에게 쓸 내용인가 싶어 더 후회가 된다. (요약하자면 착한 행동에 대한 보상으로 선물을 준비했다는 것인데, 『어린이라는 세계』를 읽었으면서도 정작 우리 집 어린이에게는 ‘착함’을 ‘평가’의 언어로 쓰다니, 나는 아직 멀었다.)
새 책을 읽어야 하는데 일상에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쓴 것 같은 한 해였는지라 평소에 즐겨보던 사회과학 쪽은 엄두가 나지 않았다. 예전에 사 놓고 읽지 않은 소설이나 에세이가 있나 전자책 구매 리스트를 죽 내려보다가, 읽지 않은 ‘아무튼 시리즈’ 한 권이 있어 연휴 기간에 냅다 읽었다.

『아무튼, 외국어』는 대학에서 불어불문학을 전공했지만 전공과 크게 관련 없는 일을 하는 저자가, 외국어의 기초를 배우는 취미, 외국어가 구성하는 세계 등에 대해 쓴 에세이다. 왠지 고르고 보니 크리스마스 전후로 내가 겪었던 딜레마가 반영된 선택인 것처럼 보이지만, ‘의식적’인 선택은 아니었다.
책 말미에 그는 대학생 시절 과외 제자였던, 외국어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을 자신에게 던졌던 S의 일화와 후일담을 소개하며, “외국어 배우기 책을 써야 할 사람은 실은 내가 아니라, S였던 것이다”라고 겸양의 태도를 보이지만, 나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한다. 어쩌면 ‘실용과는 거리가 먼 외국어 배우기’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실용주의에 경도된’ 한국 땅에서는 생각보다 흔치 않기에 저자야말로 『아무튼, 외국어』를 쓰기에 맞춤한 필자가 아니었을까? 실용적이지 않은 일이 곧바로 의미가 없거나 하찮아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그런 일과 세계가 더욱 많아져야 하지 않을까? 나는 아직도 ‘철없이’ 그렇게 생각한다.
이번 크리스마스에 내가 한 일을 되짚어 보면 자연스레 고개가 숙여진다. 반성의 의미로. 멋지고 화려한 것이 아니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최선’을 다해 어린이의 선물에 대해 신경을 썼는가? 마음을 전달하는 일에 있어서는 선물 못지않게 마음을 기울였는가? 어쩌면 나는 세계의 안위와 평등을 탐구하고 신경 쓴다는 핑계로 우리 집 어린이의 마음과 행동을 살펴야 할 의무로부터 한 발짝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글은 이 정도로 쓰고 오늘 어린이 저녁 메뉴로 무엇을 먹일지 고민해 보아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