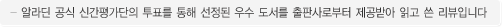이 책을 읽으면서 발칙한 상상을 해봤다. 이 지구상에서 저임금을 받고 온갖 허드렛일을 하는 노동자들이 갑자기 전부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고. 어쩌면 거리엔 오물과 쓰레기가 넘쳐날 것이고, 처리할 데가 없어서 창밖으로 오물을 던지고 똥을 피하기 위해 하이힐을 신었던 17세기 유럽사회로 돌아가야 할런지도 모를 일이다. 아니 그보다 더 할 것이다. 온갖 산업폐기물과 가정에서 나온 쓰레기들로 넘쳐나는,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장면과 맞닥뜨리며 살아갈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끔찍하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건 누구인가? 조용히 거리를 쓸고 오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치우고, 잡다한 쓰레기들을 분류해서 재활용하는데 일조하고,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을 돌보는 등의 묵묵히 일하는 저임금의 노동자들일 것이다. 그들 덕분에 세상은 반짝반짝 빛이 난다.
하지만 그들의 사회적 지위는 어떠한가, 어둡고 암울한 이야기로 가득한, 한마디로 밑바닥이다. '직업에 귀천이 없다'는 소리는 허울 좋은 구호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뺀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미 몸으로 감정적으로 터득한 사실이다. 그 바닥에서 그 일을 직접 체험하고 거기서 나온 수입으로 생활을 해보지 않은 이들의 입에서 나온 소리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고단한 삶에 그러한 문구가 위안이 될리도 만무하고, 달콤한 당의정으로 씌운다고 해도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을테니 말이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에서 벗어날 길이 없고, 저임금으로 하루살이 인생처럼 그날 그날 먹고 살아야 하므로 다른 곳에 눈 돌릴 겨를 조차 없다. 노동자로 산다는 게 어떤 건지를 에런라이크는 몸소 체험하고서 쓴 <노동의 배신>에서 기술하지 않았던가, 그들의 삶은 그야말로 최악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과도, 문화적인 삶에서도 소외되어 빈곤과 질병으로 인해 만신창이 삶을 사는 저임금의 노동자들! 경제적 불평등은 모든 것에 여파를 미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듣기 좋은 말로 인간 모두는 평등하다고는 하지만 분명히 우리는 계급사회에 살고 있다. 한정된 자유 안에서 기만적이게도 자유 경쟁 운운하면서 자신이 올라선 사다리를 거침없이 걷어차 버리는 비정한 사회속에서 살고 있다. 그러니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은 사다리를 쳐다볼 엄두조차 내지도 못한 채 계속 밑바닥 삶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는 것이다. 가난은 대물림으로 나타나고 있고, 가진 자는 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 있다. 과연 이게 옳은가 하는 문제와 부딪칠 수밖에 없는 <노동의 배신>은 인간의 배신으로까지 여겨진다. 정의를 외치는 사회에서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 분배의 문제와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이다. 노동의 대가 없이도 수억을 벌어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탈세와 편법으로 부당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버젓이 고개를 들고 있는 세상에서 하루하루 정직하게 일해서 사는 저임금의 노동자들은 빈정거림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노동이 생존에 필요한 수단이라고는 하지만 노동은 삶의 연속성 안에서 이상하리만치 삶의 모습을 비틀고, 뜻하지 않은 방향으로 끌고 가기도 한다. 특히 저임금 노동자들은 쉴 새 없이 일을 해야지만 생활이 그나마 유지되고보니 끊임없이 일을 찾아 헤매야 하고 그 비슷비슷한 일들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다. 고용주들은 당근과 채찍으로 노동자들을 길들이고, 복종과 침묵을 강요 하는 구조를 마지막 장인 왜 악순환이 계속되는가에서 다루고 있다. 동료라는 이름으로 족쇄를 채우고 노예처럼 일해야만 하는 그 구조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하였지만 책이 나온 지 10년이 지난 후에도 역시 달라진 건 없다. 저자는 상황은 더 나빠졌다고 진단한다.
무수한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악한 환경과 근무조건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을 것이다. 노동의 배신은 순전히 육체적 노동에 비례해서 대가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노동과 노동자 사이에는 항상 고용주라는 사람이 끼어 있기 마련이고, 고용주는 최대의 이익을 위해 노동자들을 당근과 채찍으로 길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시장자유주의가 모든 것을 자율성에 맡기고 뒷짐지고 있는 사이에 출발점이 다른 사람들은 죽어라 일해도 그 자리에서 맴도는 삶을 떨쳐낼 수가 없게 되었다. 그렇다면 분배를 재정립해야 하지 않는가? 가진자들의 주머니를 털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자는 소리가 아니다. 고용주와 기업이 이윤의 극대화만 추구하는 파렴치한 짓을 그만둔다면, 나몰라라 뒷짐지고 있는 정부가 뒷짐을 풀고 나서준다면 해결의 실마리는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를 '생명에는 귀천이 없다' 는 것으로의 전환이 절실하게 요구될 뿐만 아니라 공생이라는 구호가 그 자리를 대신할 것이다. 이 책을 덮으면서 노동의 배신이 아닌 노동의 정당한 대가가 돌아오는 그런 사회를 꿈꾸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