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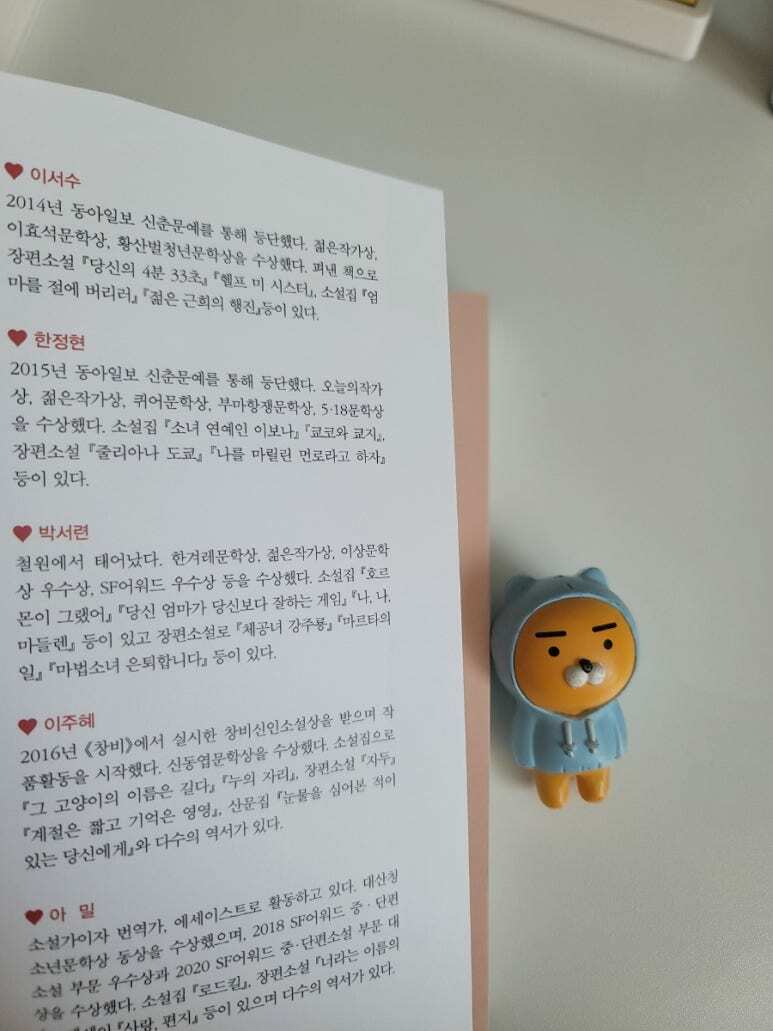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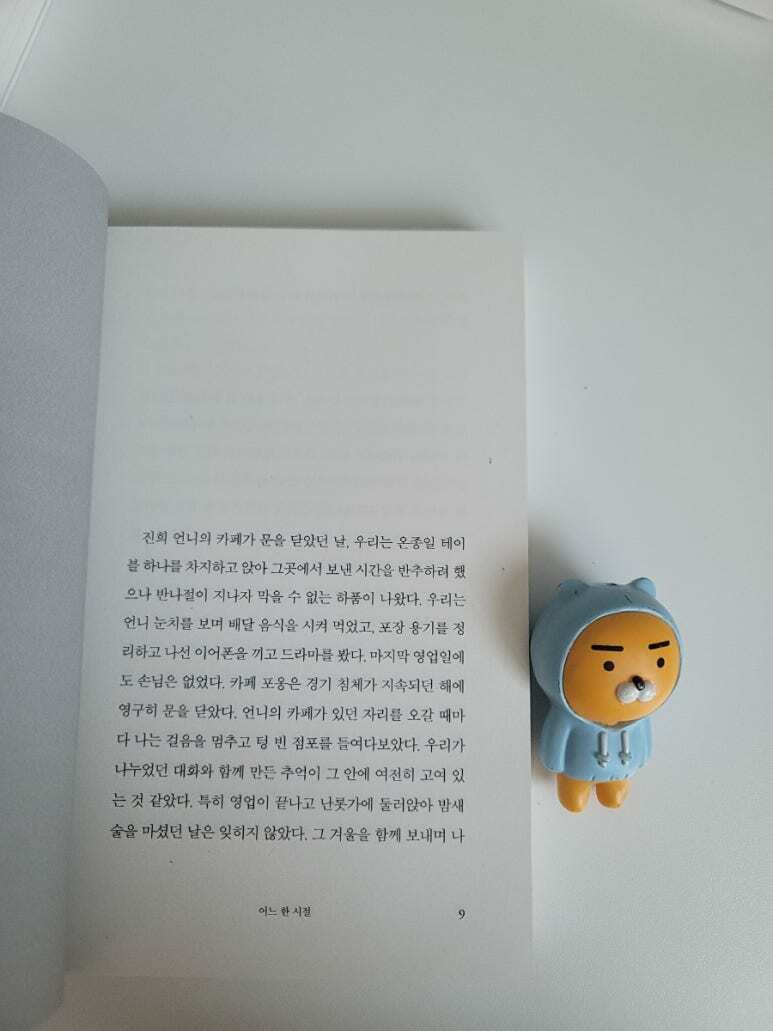
학원에서 만난 그 사람을 뭐라고 불러야 할까. 일상적인 대화가 어려웠기에 아무와도 이야기를 나누고 싶지 않았다. 제일 구석에서 고개를 숙인 채 세 시간의 수업을 듣고 차를 탔다. 차에는 나와 그 사람뿐이었는데 대번에 나를 아는 척했다. 아마 같은 교실에서 수업을 들었나 보다. 조금의 거리낌도 없이 나에게 알은척을 해서 이 사람이 전부터 나를 알고 있나 나만 기억에서 잊고 있었나 착각이 들 정도였다.
한국 사람들이 처음 만나면 의례적으로 그렇듯이 나이를 물어보기에 내 나이를 말해주고 질문이 왔으면 질문을 다시 해주는 게 인지상정.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몰라 호칭은 생략한 채 몇 살이냐고 물었다. 쉰 여덟이라고 하길래 없는 사회성을 찾아내어 와 보기보다 엄청 젊으시네요 했다.(잘한 거 맞겠지.)
집에 가는 방향이 맞아서 차에서 자주 만났다. 그 사람은 나를 자기 혹은 이름 뒤에 씨라고 붙여 부르기에 나는 어떻게 불러야 하나 고민했다. 여사님은 좀 그렇고 선생님? 이것도 아닌데 그럼 언니? 이제 나에게는 사회성이 아예 없나 보다. 마지막 헤어질 때까지 나는 그 사람을 그 어떤 호칭으로도 부르지 않았다. 어차피 다시 만나지 않을 건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 이서수의 단편이 실린 『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를 그즈음에 읽고 있었는데 그럼 언니라고 한 번이라도 불러도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쉽다. 더 이상의 친교나 사교는 사절이라는 마음으로 지내다 보니 이렇게 되어 버렸다. 『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에는 다섯 명의 작가의 단편이 실려 있다. '언니'라는 주제로 말이다.
모두 시절 인연이라서 가슴이 아리기도 아프기도 하다. 인생에서 가장 멍청한 일이 후회하기라는데 『언니라고 불러도 될까요』에는 후회와 회환의 정서가 가득하다. 여성으로서 사는 거 힘들고 고달픈데 소설에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읽는 동안 과거의 나를 미워했다. 나를 언니라고 부르는 것도 내가 언니라고 부르는 것도 낯설고 이상하다.
이제는 내 이름 뒤에 씨를 붙여서 불리는 것도 거부감이 든다. 님도 그렇고. 그럼 대체 뭐라고 불러야 해 따지겠지만 나를 부르지도 찾지도 말아 다오. 꼭꼭 숨어 있을 거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