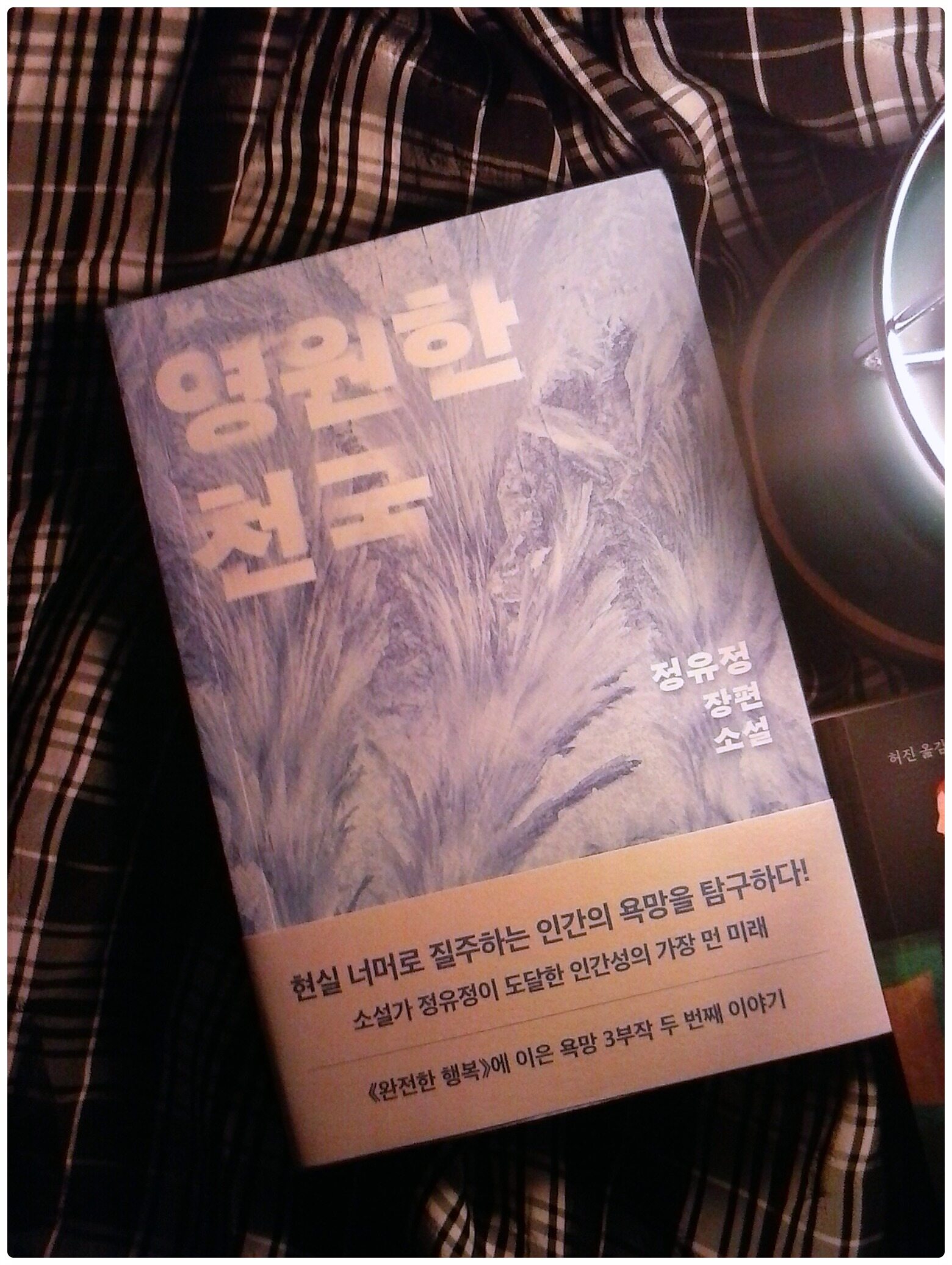여전하다. 초반 적응과 파악하는 시간이 지나면 무서울 정도로 스토리에 몰입된다. 이번엔 꽤 따끔거리며 저항감을 주는 설정이라서, (혼자서)성질을 불쑥 부리기도 했지만, 스토리텔링의 힘은 강력하다.
“롤라”가 무엇인지 개념과 구성과 작동 방식을 잘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이 선결조건인 문학이다. 과학을 조금 알아서 동시에 몰라서 느끼는 반발심도 이 작품을 즐기는 재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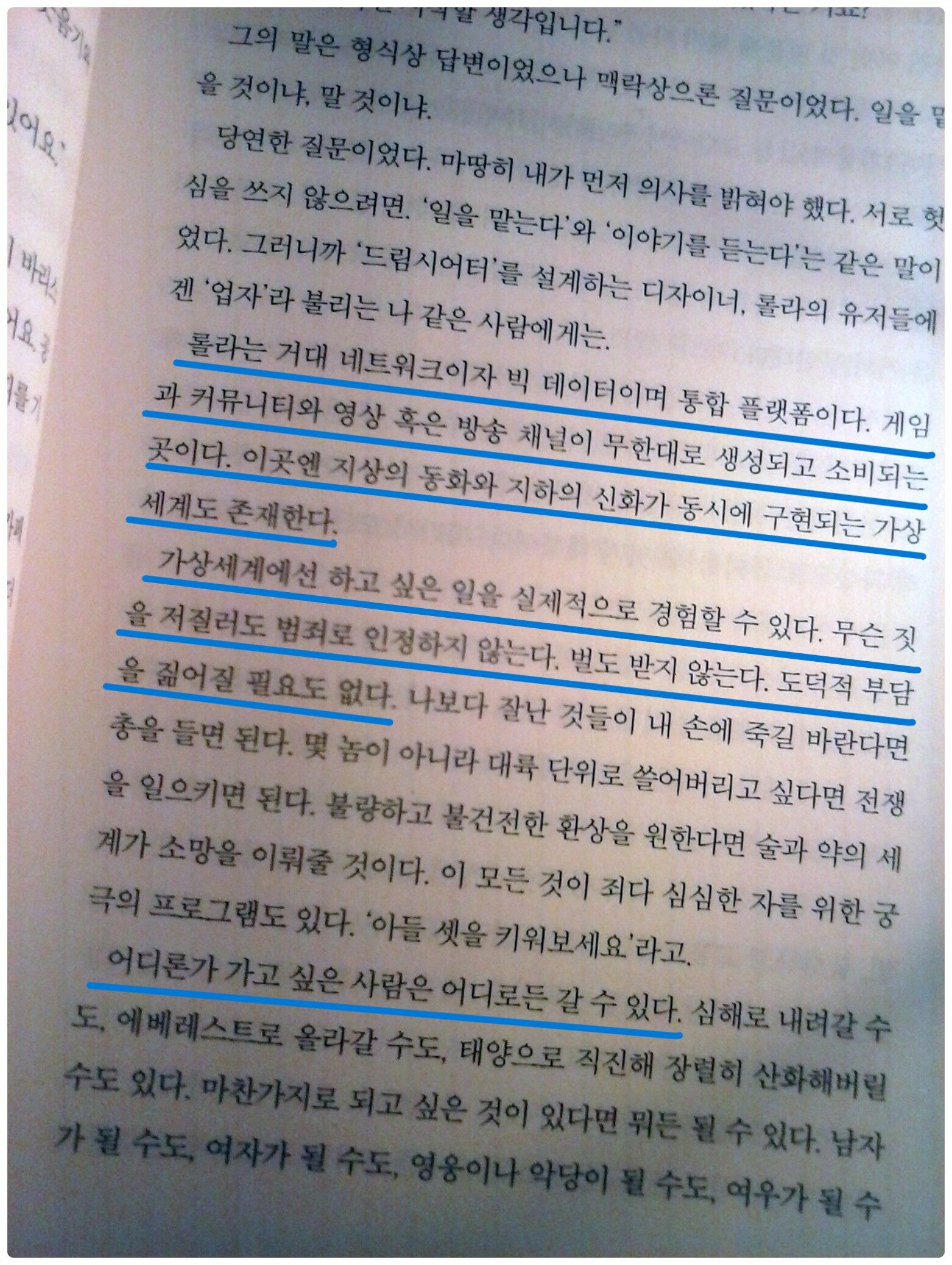
어쨌건, 하고 싶은 일은 “무슨 짓”이든 저지를 수 있고 도덕적 부담조차 없다는 무서운 가상 세계를 열심히 상상해본다. 어릴 적부터 순간이동 초능력만을 탐냈던 나는 “어디로든 갈 수 있다”는 조건에 혹하고 만다.
공용 극장 롤라 말고, “자신의 실제 인생을 두 번째로 살게 된다”는 개인용 극장인 드림시어터에 몹시 끌린다. 이번 생에서 만나고 사랑하고 이별한 이들이 그리워서, 결말은 같을 지라도 꼭 다시 만나고 싶고 보고 싶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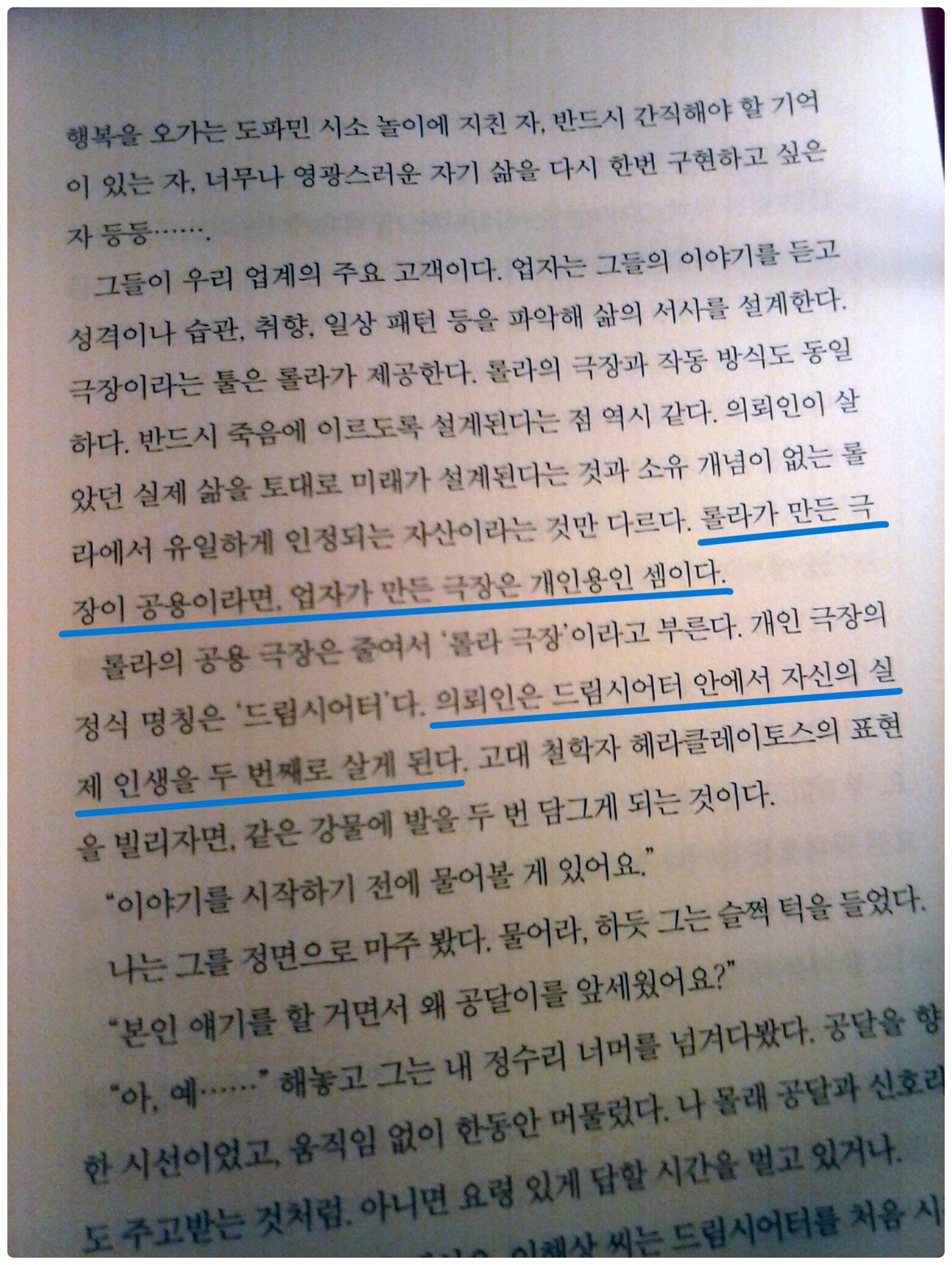
일견 근미래 SF 같아 보이지만, 실은 지치도록 반복된 욕망과 주제다. 절대 명령인 생존. 현재 인간의 몸은 일회용이지만, 작품의 설정처럼 현 존재를 모두 정보로 전환하여 영생할 수 있다면, 다음 세대로의 번식은 불필요하다.
그 방식을 구원이라고 부를 지는 다른 논쟁의 문제이고, 과학기술이란 매력적일수록 접근 기회가 불평등하다. 과학적으로도 “몸을 뺀 나머지”를 정보로 전환한다는 건 어불성설이기도 하다. 우리가 가진 실체는 몸뿐이니까.
같은 논리로 실제와 똑같은 가상현실이란 모순이다. 동일 존재가 차원적으로 동시에 존재할 수는 없다. 물론 이건 최신과학기술에 대한 정보부족과 무지에서 비롯된 생각일 지도 모른다. 양자역학도 아직 이해 못하면서 뭘.
마지막 “설계”는 충격적이었다. 기발하도록 아름답지 않아서 일종의 상처를 입었고, 가만 생각해보니, 야성을 깨우고 적극 저항하기 위한 대처상황으로 완벽했던 것도 같다. 잘 녹지 않는 사탕처럼 오래 입 속에서 굴려볼 작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