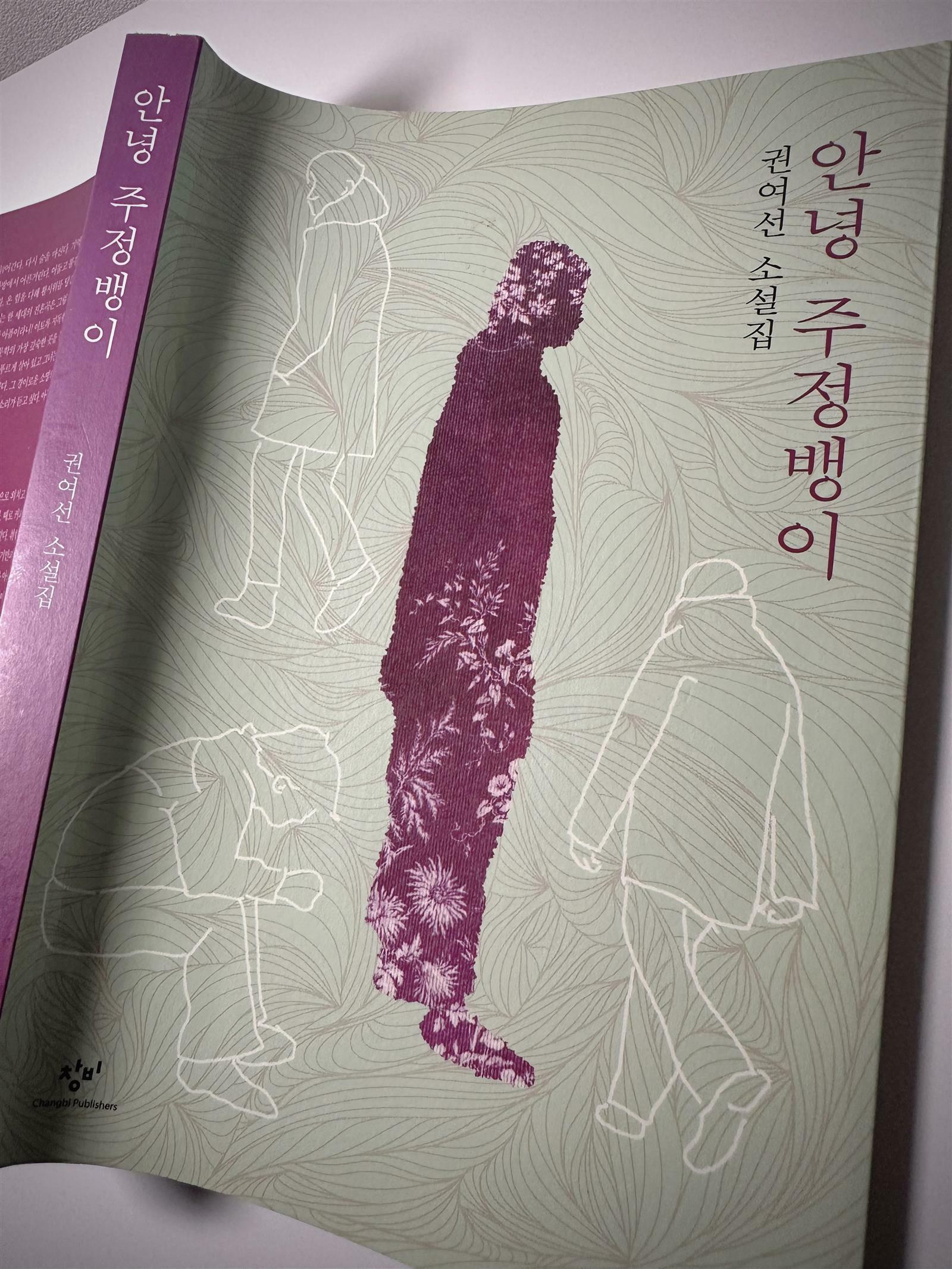잡념이 많아져서 조금은 기대고 싶어지는 책이 있다면, 내겐 그 중 하나가 권여선 작가님의 책이 아닌가 싶다.
겉으로는 강퍅해 보이지만 속은 따뜻할 것 같은 ‘여자 어른’과 무겁지 않은 먹거리를 안주 삼아 술잔을 주고받으면서 인생의 달고 쓴 이야기를 들을 때의 그 묘한 따뜻함이 간절할 때가 있다. 그래서 괜히 잘만 살다가도 가슴 깊숙한 곳에 잘 눌러 싸매놓은 감정이 올라올 때면 자연스레 작가님의 책에 손이 간다.
이 책 7편의 단편들에서 마음의 위안을 얻고 싶은 마음에 책을 펼쳤다. 무언가를 꼭 얻기 위해 책을 읽는 건 아니더라도 가끔은 기대하고 싶다.
천천히, 천천히, 욕심내지 않고 읽어내려갔다.
시간이 지나도 쉽게 잊히지 않을 상처를 입은 「봄밤」에 영경은 켜놓은 촛불이 금방이라도 꺼질 듯 위태로워 보이는 모습에 안심하고 들여다볼 수 없었다.
결국 꺼져버린 연기만 허무하게 바라보게 되진 않을지 염려하는 마음으로 보는 것 말고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다.
영경에게 필요한 건 현재로썬 컵라면과 소주 한 병 같다.
내 전부를 잃게 된 사람들의 만남.
그런 두 사람 앞에 펜션처럼 보이는 요양원과 응급환자들을 수송하기 위한 앰뷸런스 그리고 아담한 정원이 보인다.
조경이 잘된 산책로까지 함께.
신용불량자 수환과 알코올 중독 환자가 돼 버린 영경은 서로 불행한 삶을 살다가 뒤늦게 만나 동거하게 된 사이인데 서로 힘들었던 시간만큼 모든 게 아파졌다.
류머티즘을 앓고 있던 수환의 상태가 너무 안 좋아져 이제는 요양원에서 지내야만 했다. 그와 떨어져 살지 않기 위해 함께 들어온 영경까지.
불안한 자신의 몸 상태를 알기에 보호자가 늘 곁에 있어주길 분명 바랬을 텐데도, 수환은 영경에게 염려와 걱정 대신 그녀를 기다리는 컵라면과 소주 한 병이 있는 편의점으로 기꺼이 보내준다.
네가 나를 이해하듯, 그런 내가 너를 이해하면서.
섣불리 이해하는 척하며 들여다볼 수는 없었다.
내가 겪어보지 않은 삶의 대해 말하는 것이 난 조심스럽다.
내가 경험한 감정과 맞닿은 인물은 간병인 종우였다.
누군가의 죽음을 대면해 본 적 없었던 종우의 마음.
자신이 돌보는 환자인 수환의 동거녀 영경을 때론 이해할 수 없는 마음과 원망의 눈빛으로 바라봤지만, 수환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영경의 눈빛을 멀리서 바라보니 감히 자신이 헤아릴 수 없는 감정 또한 느꼈나 보다.
(P. 35) 난 아줌마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쩔 때 아줌마가 아저씨 빤히 쳐다볼 때는 괜히 눈물나요.
사람에게 최후로 남아있는 감각이 청각이라는 얘기를 들은 종우가 수환 곁에서 계속 자신의 소소한 이야기들을 꺼내는 동안 이 두 사람을 들여다보는 내 가슴과 눈두덩이가 너무 뜨거워졌다.
무서워 하지 말라며 흐르는 눈물을 교묘하게 감추고 더 잘 들리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의젓하고 어른스럽게 건넨 나의 목소리가 아직도 너무 생생하면서도 믿어지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그때의 심정으로 종우를 들여다보니 왜 이리 고마운지.
아니, 어쩌면 수환과 영경의 힘겨움을 들여다보는 게 내겐 너무 벅차서 종우에게 내 감정을 덜어낸걸 지도 모르겠다.
영경이가 이들과 지금 함께 있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
두 사람만이 주고받던 불행도 때론 아주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걸 느꼈으면 하는 마음에.
누군가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니까.
너무 슬픈 눈으로만 바라보지 않으려고 했다.
이번 생에 더는 없을 줄 알았던 행운이 남아있다는 벅찬 감정을 영경이가 느낄 수 있도록 해준 수환이가 있어서 참 다행이었고, 그들이 주고받는 눈빛과 손길은 너무 따뜻했으며, 더없이 사랑했으니까.
(P. 32) 취한 그녀를 업었을 때 혹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나지 않을까 염려될 정도로 앙상하고 가벼운 뼈만을 가진 부피감에 놀랐던 기억이 있다. 그 봄밤이 시작이었고, 이 봄밤이 마지막일지 몰랐다.
터질듯 말듯 위태로우면서도 이제 더는 손 쓸 수 없는 상황인 부부, 규와 주란 그리고 이들의 친구 훈이 함께 떠난 여행 이야기를 담은 「삼인행」은 읽는 동안 마음이 너무 불편했다.
딱히 맞는 구석이 없어 보이는 이 세 사람이 내뿜는 금방이라도 폭발할 듯한 그 기운을 들여다보는 게 힘들었다.
친구로서 규와 주란의 관계가 개선되길 바라는 마음이야 당연히 있었을 테지만 훈은 섣불리 긍정의 말들을 건네지 않는다.
그런데도 종종 낄낄거리면서 원래 그래온 사람들처럼 서로 들여다보고 함께 할 뿐이다.
규의 모습에서는 예전의 나를 봤다.
그래서 아주 불편했다. 지우고 싶은 시절의 꽁꽁 숨기고 싶은 그때의 나와 닮은 모습을 또 봐서 그랬다.
마음에선 안 그런데 꼭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시가 돋친 말로 상처를 주고, 입 밖으로 말이 나가는 그 순간부터 후회할 걸 알면서도 억한 감정만 쏟아내는 그 낯설지 않은 모습을 보자니 입이 떫었다.
주란이 운전대를 잡은 차가 고속도로에서 최고속도 175킬로미터를 넘어간다. 무아지경에 빠진 그녀 옆에서 규는 속도 낮추라는 듯 쇠고삐 당기는 소리를 내어 제동을 걸었다.
이들의 불완전함을 뒤에서 바라보던 훈은 시야를 돌린다.
창밖으로 탁 트인 바다가 보이고, 한적한 마을을 바라만 볼 뿐이었다.
(P. 53) 훈은 잘린 시간의 단애 앞에서 화들짝한 분노와 무력한 애잔함에 사로잡혔다.
타인의 불행을 들여다보는 마음이 당연히 좋을 수가 없다.
어떤 이야기는 차마 손도 댈 수 없는 무너짐을 바라만 봐야 하는 입장으로 읽어야 했다.
그 사람이 쥐고 있는 술잔은 내려놓고 대신 내 손을 붙잡게 해주고 싶은 사람도 있었고, 내 잔도 하나 집어들고 옆에 앉아서 같이 마셔주고 싶은 사람도 있었다.
생각지도 못한 비극에는 소름이 끼치기도 했다.
그 상황보다 사람의 이면에서 풍기는 비릿한 냄새가 더 그랬다.
7편의 이야기들을 모두 다 읽고 난 뒤에도 훌훌 털어내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 「봄밤」의 수환과 영경이가 자꾸만 떠오른다.
굳이 행복과 희망을 말하지도 않고 기운 내라고, 힘 내보자고 어깨 두들겨 주고 손잡아주지도 않는다.
그런데도 난 왜, 이 책을 읽으면서 묘한 위안을 얻었을까.
뚜렷하지 않음에도 분명히 느낄 수 있는 이유는 뭘까.
내가 그렇듯, 그들 모두가 묵묵히 고통을 견디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지 않을까?
(P. 135) 그들은 오랫동안 그렇게 앉아있었다. 세상의 모든 시간이 멈추고 그들 둘만 돛단배를 타고 캄캄한 강물에 실려 떠내려가는 것 같았다. 관희가 무릎 위에 얹힌 문정의 주먹 쥔 손을 살며시 펴주며 말했다.
“그렇게 꽉 쥐지 말아요, 문정씨. 놓아야 살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