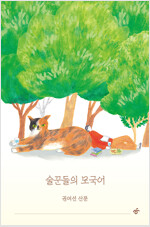겨울 무와 배추는 달다
야채가 달다는 건 나이가 들면서 알았다.
어릴 때 야채에서 단맛이 나온다는 걸 아는 아이가 있을까
오래 씹으면 단맛이 나오는 것 그리고 국물에 야채의 단맛이 슴슴하게 배어있다는 걸 아는 건 세월의 선물이다.
단 그 시간 야채를 계속 먹어와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먹지 않은 음식이 나이가 들었다고 갑자기 깊어진 맛을 알아차릴 수는 없다.
지금은 배추와 무를 많이 먹어도 된다.
이 시기 김장을 했던 건 가장 맛있을 때 가장 오래 보존하는 요리법이 김장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배추국을 끓일 때 그동안은 육수를 먼저 내고 된장을 풀고 생배추를 넣어서 끓였다. 그것도 나쁘지는 않았다. 끓이다 보면 배추의 단맛이 국물에 배어나온다고 믿었다.
새로운 방법을 알았는데 배추와 무에 약간의 간을 한 후 중간불로 뭉근히 가열하면 야채에서 채수가 나왔다. 야채가 타는 것이 아니라 수분이 나와 채수가 고였다
거기 물을 더해 된장을 풀고 국을 끓인다.
이미 익어서 달아진 야채에 간을 하는 것이다.
사실 아직은 두가지 맛의 차이를 알지 못한다. 다만 조금 더 정성이 들어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한다.
배추를 썰 때도 칼을 많이 쓰는 것이 아닌 크게 쪼개서 찢어내는 방식을 이야기 한다. 채소든 뭐든 쇠가 많이 닿는 건 좋지 않다는 의미일 것이다.
배추국을 끓이고 무 나물을 하고 배추 나물을 할 것이다.
간을 세게 해서 겉절이를 하면 흰 밥에 비벼 먹기도 좋겠지만 가끔은 슴슴한 맛이 그리울 때가 있다.
입맛은 어린 시절 기억으로 남는 모양이다.
어릴 때 배추로 만든 음식들이 유난히 기억에 남는다.
배추전, 배추 겉절이 식초를 많이 넣은 배추 생채, 배추국과 배추 나물
외가집에서 먹었던 간장배이스로 익힌 배추 나물이 생각나는데 어떻게 만드는지 알 수가 없다.
가끔 엄마도 해 주었는데 외가집에서 먹었던 것이 더 오래 기억에 남는다.
안방 둥근 상에서 남녀가 나뉘어서 (그래봐야 할아버지와 그 나머지 식구들) 밥을 먹을 때 늘 있었던 반찬 물컹해진 배추 식감과 초콜렛 색으로 간이 배인 길게 찢어놓은 배추가 가끔 그리울 때가 있다.
한 번 시도를 해봤지만 영 그맛이 아니었다.
외가집 음식에서 생각나는 건 늘 청어를 먹던 외할아버지. 유난히 가시가 많은 생선이어서 아이들은 쉽게 젓가락을 댈 수 없는 그 생선
외할아버지 상에 올라갔다가 남으면 다시 가족 상으로 내려왔던 그 청어 살이 잘 부서지고 가시가 많은 생선
연근전 연근을 구멍이 숭숭나게 가로로 자르는 것이 아니라 세로로 길게 잘라서 반죽을 뭍여 지져 놓는다. 뜨거울때 먹으면 한 입 베어 물때 마다 길게 실이 늘어지는 것이 재미있기도 하고 성가시기도 했다.
연근전과 배추전은 외가집 제사상에는 늘 올라갔던 음식이었다. 제사상을 기억못하지만 음식을 준비하던 외숙모의 모습은 기억난다.
안방 부엌과 연결된 문 앞에서 전기 프라이팬을 늘어놓고 전을 부치던 모습 그리고 창에서 내리는 햇살을 기억한다.
아마 내가 아무 할 일이 없어서 조금은 심심하고 편안해서 그들의 노동에 대한 감각은 모르고 마냥 평화로운 풍경을 기억한다.
친가에서의 기억은 추운날 부엌과 마당에 펼쳐진 음식하는 풍경이다.
친가는 시골집이었다. 마루에서 내려와 신을 신고 부엌으로 가야했고 부엌도 불을 때고 큰 가마솥이 있었다고 기억한다.
좁은 부엌때문에 제사나 큰 일이 있을 때는 마당에 불을 피우고 도구를 꺼내와서 음식을 하는 풍경을 기억한다.
솥뚜껑에 기름칠을 하고 전을 지져내고 고기를 볶는 것
여자 어른들은 모두가 바빠 보여서 낯선 그 곳에서 나는 계속 갈 곳을 모른 채 방황한다.
따뜻한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해도 낯설기는 방이 더 그렇다. 사촌들도 낯설고 어른들도 어렵다.
코가 빨개지도록 마당을 서성이면 간혼 엄마가 불러서 볶은 고기나 막 지져낸 전을 입에 넣어주기도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다.
그때도 지금도 이상했던 건 그렇게 종종거리며 바쁜 여자들과 달리 남자 어른들은 방안에서 너무나 여유있게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
그때 기억나는 건 엄마가 시집가서 돼지고기를 처음 먹었는데 (그럴리가 ) 김치랑 막 볶아낸 그 고기가 참 맛있더라
식재료가 좋아서인지 아니면 대량으로 해서인지 그 게 참 맛있었다는 이야기
그러나 사실 나는 그 맛이 기억나지 않는다.
숙모가 솜씨가 좋아 김치나 음식이 맛갈난다고 하지만 기억나지 않는다.
어린 마음에 마음이 편하지 않아서 어디에도 내가 낄 틈이 없고 서성거리게 되는 것 그래서 음식도 상홛도 기억이 나지 않은 것일까
좋아하는 음식을 생각하면 음식과 함께 그 음식에 대한 기억이 함꼐한다.
누구와 먹었나, 언제 먹었나 어디서 먹었나 그때 나의 감정은 어떠했는가 그때 풍경은 어떠한가
맛은 미각만이 아니다.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이 맛으로 남는다.
돈가스를 쓸면서 쟁반도 함께 썰어버릴만큼 긴장했던 첫 데이트
엄청나게 혼나고 억지로 쥐어주는 수저를 내팽겨치기엔 미안하고 무서워서 한 술 뜬 비빔밥이 그렇게 맛있어서 내 생각과 달리 한그릇을 다 비워버린 초등학교 시절
무서운 기름속에 퐁당 빠진 도넛 반죽이 떠오르기를 간절하게 기다리던 그 순간
주전자 뚜껑으로 동그랗게 반죽을 빚는 그 기억들
밤에 혼자 끓여먹는 라면
누군가를 위해 애써 차려냈던 수육과 잡채들
좋아하는 음식은 결국 좋아하는 시간이고 좋아하는 사람이며 그때 좋았던 나를 떠올리게 한다.
나는 슴슴한 맛을 좋아한다는 건
슴슴하고 무던한 삶이 가장 어렵고 가장 간절한 것이기 때문이다.
조금씩 변하는 입맛은 조금씩 알아가는 세상에 대한 깨달음, 반성과 감사함이 섞여 있다.
내일 나는 무엇을 가장 좋아하는 음식으로 이야기 할까
그건 또 내가 살아야 할 시간들이 알려줄 것이다.
입맛을 잃는다는 건 삶에 대한 의욕을 내려놓는 것이다.
아직 세상에는 맛있는 것들이 많고 내가 모르는 맛들이 있을거라는 기대
그것은 아직은 살아볼만하다는 기대 그것과 같은 말
좋아하는 음식이 계속 바뀌고 좋아하는 순간이 계속 바뀌면서 그렇게 내 삶이 채워진다.
그렇게 또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