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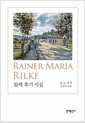
-
릴케 후기 시집 ㅣ 문예 세계 시 선집
라이너 마리아 릴케 지음, 송영택 옮김 / 문예출판사 / 2015년 4월
평점 : 


온전하게 구성된 릴케의 시집은 처음이다. 너무도 유명해서 오히려 제대로 읽어보지 못한 시인이기도 하다. <릴케 후기 시집>에 처음 끌렸던 것은 표지 그림이다. 표지 그림을 보는 순간 다른 곳으로 눈길을 돌릴 수가 없었다. 이 그림의 정체는 클로드 모네의 <부지발의 다리> (1869) 이다. 릴케보다 한세기 앞선 모네의 그림이 자연과
깨달음을 주제로 한 릴케의 이번 시집과 잘 어울리는 느낌이다.
총 5장으로 구성된 릴케의 시편들 중에서 가장 이해하기 쉽고 마음에 와 닿았던 시들은 1906년에서 1920년 사이에 쓴 ‘새 시집 이후의 시’ 에 실린 시들이다.
‘왜 한 사람이 나서서’라는 시에서 시인은 어떤 상황에 있어 왜 한 사람이 나서서 알지도 못하는 물건을 짊어져야 하고 감당할 수 없는
영향 속에 노출되어야 하는지 한탄하고 있다.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보이는 그
한사람이 혹시 나는 아닌지, 어쩌면 우리 모두인지 조금 깊게 생각하게 한다. ‘만약 도시의 군중들이’ 에서는 시끄럽고 엉클어진 도시의 소음과 대중교통의 혼잡속에서 살아가는 군중들이 흩어졌던 가축의 무리를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가볍고 느리지만 신중한 발걸음을 가진 목자와 같은 마음과 태도를 가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느껴진다.
절묘한 시 구절이 눈에 띄는 시들도 있다. ‘나르시스’에는 ‘그는 사랑했다, 자신으로부터 나갔다 다시 돌아온 것을.’ 이라는 구절이 있다. 나르시스를 흔히들 말하는 자아도취형의 인간으로 보지 않고 그가 자아도취
될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의 영혼이 이전과는 다르게
변함으로써 그 영혼을 사랑하게 된 것일 수 있다는 다소 신앙적인 느낌이 들면서도 신선하게 다가오는 구절이었다.
‘눈물’ 에서는 ‘나를 더 기울게 하라, 그래서
눈물이 흘러나오게’ 라는 구절이 있다. 사람의 몸이 컵도 아닌데 눈물이 나오도록 기울게 해달라는 표현은 슬프지만
신선함이 느껴져서 오히려 반가웠다.
‘방금 나의 창문으로’ 에서는 집안에 있다가 갑작스레 맞은 돌풍이 평온한 일상에 여러가지 의미로 다가옴을 이야기 한다. 이 돌풍은 자연이 맹목적으로 달려드는
것 같기도 하고, 세상 떠난 사람의 몸짓이거나 죽어서 암담해진 소년이 울며 다가오는 것처럼도 느껴지는
것이다. 이 시를 읽고 있으려니
류시화 시인의 ‘새들은 우리집에 와서 죽다’라는 시가 생각났다. 이 시에서도 평온하던 오후의 집 마당에
갑자기 새가 수직으로 날아와 떨어지는 순간 세계가 잠시 기우뚱해진 사건을 말하고 있다.
‘오르페우스에게 보내는
소네트’ 장에 실린 시편들에서 가장 많이 눈에 띈 단어는 ‘칠현금’ 이다.
20세기 초 독일에서 고대 중국의 악기인 ‘칠현금’에 흠뻑 빠져서 ‘이미 칠현금을 받쳐 든 자만이 끝없는 찬가를 에감
속에서 부르게 된다’고 칭송한 릴케는 어떻게 칠현금에 빠졌을까 무척 궁금해진다. 한번 더 읽으면 수많은 의미로 다가올
시들이 많은 시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