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것은 인간입니까 - 인지과학으로 읽는 뇌와 마음의 작동 원리
엘리에저 J. 스턴버그 지음, 이한나 옮김 / 심심 / 2022년 7월
평점 :

절판

제목 : 이것은 인간입니까
저자 : 엘리에저 스턴버그
출판사 : 심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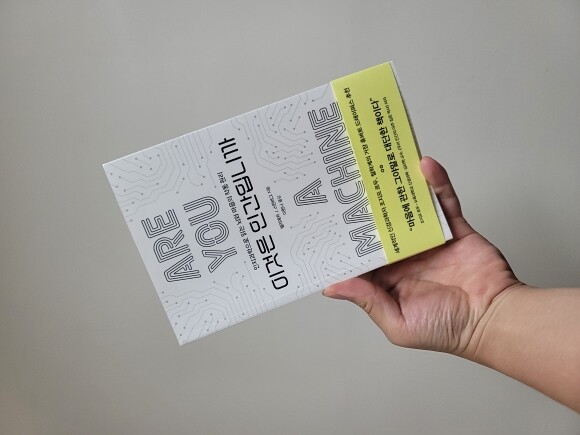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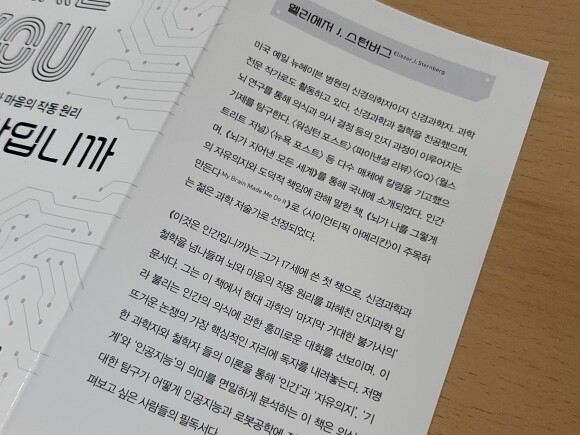
이 책은 인지과학, 심리철학 등등 여러 부분을 다루고 있다. 실제로 다루고 있는 질문들도
뇌는 어떻게 의식을 만들어낼까?
의식을 가진 기계를 만들 수 있을까?
나와 똑같은 기계를 만든다면 그 기계를 나라고 말할 수 있을까?
등등 '의식'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내용이 많다. 저자는 어릴 때부터 이 부분에 관심이 많았는지 이 책을 무려 17세에 쓴 책이라고 한다.
이 책의 원저는 'Are you a machine?'으로 본문 중에는 '우리는 기계입니까'라고 번역이 되어있다. 개인적으로 기존에 쓰여진 제목보다 이 제목이 훨씬 좋은 듯 한데 왜 굳이 의역을 해서 다른 제목을 적었는지 의문스럽고 이 책의 유일한 단점이다.
우리는 기계입니까?
저자는 이야기한다. 의식이란 무엇일까?
책 초반에 나온 말을 인용하면
의식은 마음의 과학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문제다. 의식적 경험만큼 잘 아는 것이 없는데도, 이보다 더 설명하기 힘든 것이 없다.
데이비드 차머스
이렇게 설명하기 어려운 의식의 개념이지만 이에 대한 큰 갈래의 설명은 존재한다.
17세기의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는 '인간은 육체가 없어도 사고가 가능하므로 마음이란 비물질적인 것이라고 결론'지었다고 말한다. 이렇게 물질계와 정신계 두 세계로 나누어져있다는 것이 이원론이다.
이와는 전혀 반대로 혁신적인 주장도 있따.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의식의 산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관념론이다. 관념론에 따르면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끼는 모든 것이 정신계에서 창조된 것이며, 물질계에서 이에 해당하는 사건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고 한다. 저자는 이를 이 책에서 더 이상 다루지 않는다고 했고 내가 생각하기에도 믿음이 가지 않는다.
다음은 유물론이다. 유물론에서 의식은 전적으로 뇌의 역학이라는 물리적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잇다고 주장한다. 이 이론을 발전시켜보면 결국 과학이 발전하면 의식도 과학의 영역으로 해석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철학자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과학적으로 입증하긴 힘들 듯 하다. 아직 밝혀진 것이 많이 없기 때문이다.
여기선 이런 관념 관련해서 재밌는 사고실험? 논증?을 여러개 소개한다.
<중국어 방 논증>
컴퓨터 자체를 하나의 방이라고 상상하자. 방 안에는 영어밖에 할 줄 모르는 사람이 한 명 앉아있다. 방의 한쪽 벽에는 외부에서 온 중국어로만 쓰여진 질문(입력)이 있다. 마찬가지로 다른 한쪽에는 중국어로 적힌 답만 보낼 수(출력) 있게 되어있다. 방 내부에는 어떤 기호들(중국어)를 받았을 때 어떤 기호들(중국어)로 답해주면 되는지 알려주는 규칙집이 있다. 그 책에는 질문에 대한 답이 모두 쓰여져있을 때, 방 안에 있는 사람은 주어진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을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는 중국어를 이해한다고 할 수 있을까?
그는 중국어를 할 줄 모른다. 단지 규칙집(프로그램)에 따라 정해진 답을 내뱉은 것에 불과하다.
예를 들면 "도덕이란 무엇인가"란 질문이 들어왔다고 해보자.
중국어 방에 있는 사람은 들어온 질문이 뭔지 모르고 '선과 악 또는 옳은 것과 그른 것의 차이에 고나한 것-옳거나 바른 행동'을 중국어로 써서 출력할 것이다.
하지만 이 질문을 다른 중국어를 잘 하는 사람이 보았다고 하자. '도덕'이란 무엇일까 힘오하게 떠올리고 고민을 할 것이다. 그런 후 '선과 악 또는 옳은 것과 그른 것의 차이에 고나한 것-옳거나 바른 행동'이란 답이 나올 수 있다.
중국어 방에 있는 사람은 중국어를 하는 사람과 같은 대답을 내놓았지만 문제를 이해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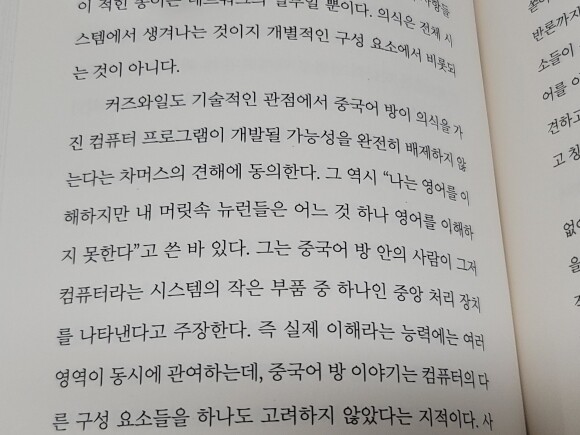
하지만 이 의견도 어느 부분에선 옳다. 커즈와일이 이야기한다.
"나는 영어를 이해하지만 내 머릿속 뉴런들은 어느 것 하나 영어를 이해하지 못한다"
즉, 중국어 방 안의 사람은 중국어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큰 시스템 상으로 봤을 때, 중국어방 전체는 중국어를 이해하는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 외에도 여러 철학적 질문에 대한 철학자들의 대답을 설명한다.
시각, 촉각, 청각 등 감각기관을 통해 들어오는 '감각질'은 의식의 핵심인지? 또 감각의 영역은 기계의 이해와 인간이 의식적으로 아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아닐까?
등등 여러 의견에 대한 답을 낸다.
짧은 페이지에 알차게 내용을 실었지만 역시 철학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다보니 모든 내용을 담지는 못한다. 하지만 그래서인지 저자는 친절하게 추가로 읽을 책도 설명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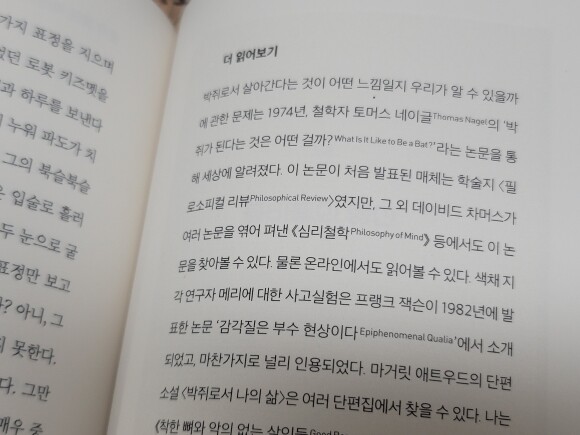
챕터별로 더 읽어보기 파트라 끝에 붙어있어 앞에 설명한 내용의 인용 책 또는 논문과 곁들여읽으면 좋을 것들을 설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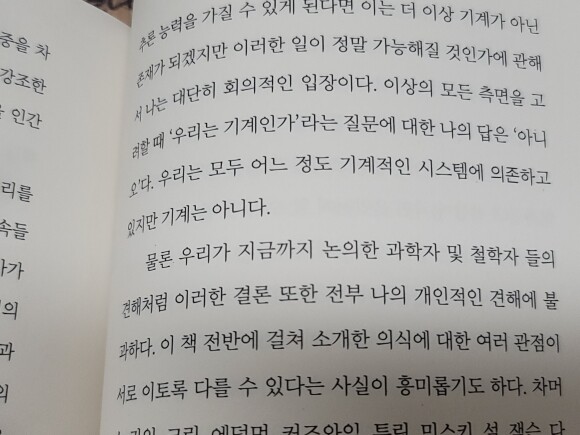
저자는 다른 철학자들의 견해를 다 설명한 후 마지막 챕터에 자신의 견해를 조심히 밝힌다. 결과만 말하면 '우리는 기계인가'에 대한 대답은 '아니오'이다.
인간이 기계라는 말은 몸의 물리적 구조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한다는 것이고 그 말은 우리 몸이 알고리즘에 의존해 작동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개인적 경험에 의한 감각질은 고유의 경험이기에 알고리즘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기계가 인간의 추론 능력을 가진다면 인간과 기계의 구분이 모호해질 수 있지만(의식의 측면에 있어서) 이런 일이 가능할지 회의적이다.
내 생각은 조금 다르다. 기술적으로 의식을 구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감각은 고유의 것이라고 하지만, 그렇다면 시각 정보가 없는 시각장애인과 우리의 의식은 다른가? 청각장애가 있어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과 우리의 의식은 다른가? 극단적인 예를 들기는 했지만 감각 기관에 따른 의식의 차이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즉 기계의 감각기관(입력기관)과 우리 인간의 감각기관이 다르다고 해서 근본적인 의식의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들지 않는다. 단지 아직 과학적으로 이해가 부족하기에 멀어보이는 거라고 생각한다.
어떤게 맞을지는 모르겠다. 철학이란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지 않는가? 질문에 대해 답을 찾아보고, 자기 자신의 정답을 찾으며 나의 사고를 확장시켜나가는 것, 그것이 철학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정말 생소한 생각을 하게 해준 좋은 책이었다.
'이 책은 몽실서평단에서 도서 지원을 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