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광장 / 구운몽 ㅣ 문학과지성 소설 명작선 1
최인훈 지음 / 문학과지성사 / 2014년 12월
평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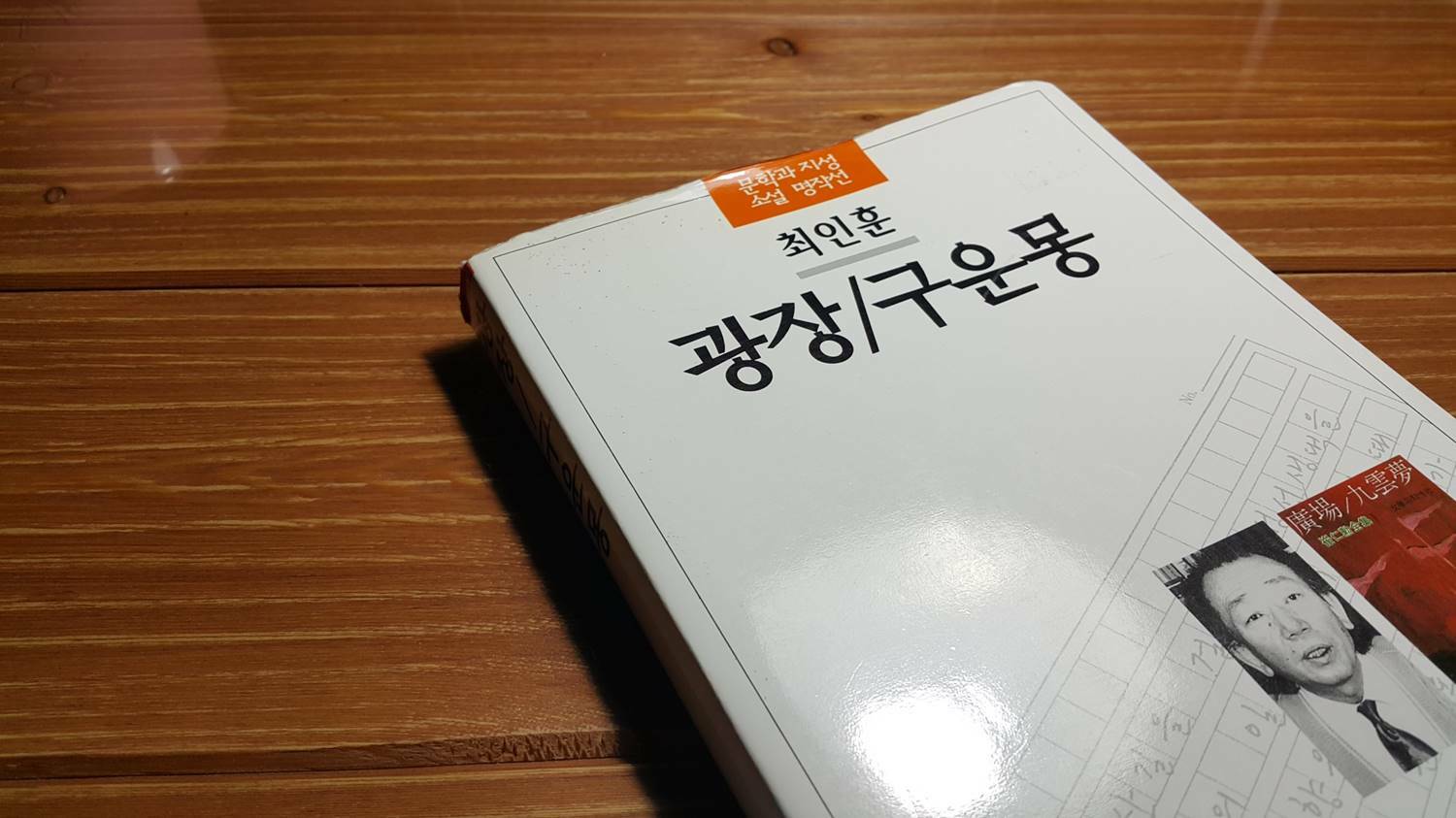
왜 광장이 한국문학이 포함된 추천 도서에서는 빠지지 않고 포함되어있고, 여러 카피라이터 및 철학사를 공부하는 이들이 꼭 한 번씩은 언급하고야 마는 글인지 제대로 알 수 있었다. 그동안 나에게 최인훈의 「광장」은 수능 공부할 때 자주 나오던 ‘중립국’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소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기 때문이었다. 중립국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아! 이게 그 소설이었구나.’ 하고 소리를 질렀던 건 비단 나뿐일 것인가?
한국 문학사상 처음으로 유토피아의 문제를 이데올로기적 갈등으로 풀어내었다는 광장은 참으로 복잡 미묘하고 그 마지막은 끝을 알 수 없는 심해 속으로 빠지고 만 한 나약한 개인이 되어버린 것 만 같다. 광장을 꿈꿨지만 남한이라는 사회는 개인의 부도덕한 욕심만이 가득한 ‘밀실’로만 채워져 있었고, 푸른 광장을 찾아 월북하지만 그곳에서는 집단의 이념만을 존재하는 ‘잿빛광장’만으로 채워져 있었다. 이것이 비단 그때만의 문제일 것인가? 지금의 우리 사회는 더욱 더 단단해져버린 밀실로 꽉꽉 채워지고 있으며, 그 밀실의 증가속도는 작가가 고민했던 때보다 더욱 빨라지고 있음에 분명하다.
하지만 작가가 서문에서 밝혔듯이 인간은 광장에 나서지 않고는 살 지 못한다. 정치적 이념으로 볼 수 있는 광장과 개인의 자유와 욕구로 생각되어질 수 있는 밀실은 언제나 상호보완적임과 동시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작가는 ‘광장은 대중의 밀실이며, 밀실은 개인의 광장이다.’ 라고 표현한 것일까? 그러나 밀실과 광장은 결코 하나의 공간이 될 수가 없다. 자유를 보장하면 평등이 깨어지고, 평등을 전제하면 자유를 제한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점점 더 밀실만을 생산하고 있는 사회에서 우리는, 그리고 리더를 꿈꾸는 자라면, 그리고 배웠다는 지식인이라면 더 깨끗한 밀실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그 밀실들이 모여서 지금보다는 더 나은 광장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예전처럼 새로운 광장을 만들고, 그 광장에 밀실을 만들어 넣는다는 실패로 판명이 낫기 때문이다. 광장을 추구했던 구소련의 붕괴도 그렇고, 밀실을 추구했던 미국의 극심한 양극화가 그렇기 때문이다. 이데올로기적 가치를 떠나, 시대적 상황을 떠나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은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한 단계 더 높은 정신적 단계로 끌어올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제 3국인 중립국을 향해 가던 명준 에게 푸른 바다 속으로 자신의 몸을 맡기게 만들었던 것은 무엇일까? 남한에서 북한에서 두 가지 체제를 직접 몸소 겪고, 그 곳에서 발전가능성을 본 것이 아니라 실패의 참혹함만을 맛보았던 그였기 때문에, 중립국이라는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곳일지도 몰랐지만,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기 때문일까? 아니면 결국 그런 경험 끝에 자신이,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소리칠 수 있는 광장은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나의 밀실을 함께 나누어 쓸 수 있는 한 사람, 즉 인간 자체만이 광장의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일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가 꿈꿨던 푸른 광장과 같은 드넓은 푸른 바다 속으로 자신의 피붙이를 안고 저 멀리 떠난 은혜와 딸을 생각하며 뛰어든다면, 그 속에서 죽음을 통해서 진정한 광장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
개인적으로는 이 작가가 다뤘던 사회 현실과 문학사적 의의는 크게 다가오지 않았다. 우리에겐 그 현실을 공감할 만한 사회 환경적 조건이 부재하기 때문에. 그저 많이 힘들었겠구나, 그런 상황에서 자신의 펜촉을 부러뜨리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 정도일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잊을 수 없는 한 작품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 작가의 문장력이다.
“바다는, 크레파스보다 진한, 푸르고 육중한 비늘을 무겁게 뒤채면서 숨을 쉰다.”
"속에서 탈대로 타고 난 무서움의 잿더미에 미움의 찬비가 소리 없이 내리면서,
남은 재를 고스란히 적시며, 명준의 온몸에 스며간다."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을 보고지라는 소원이 우상을 만들었다면, 보고 만질 수 없는 ‘사랑’을,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게 하고 싶은 외로움이, 사람의 몸을 만들어낸 것일지도 모른다.”
최인훈의 글귀는 한자 한자 꼭꼭 씹어서 소화를 최대한 시켜서 삼켜도 아직은 넘쳐흐르고도 넘쳐흐른다. 속독을 해서는 절대 되지 않는 문장들이다. 한 문장도 놓치기가 너무나 아깝다. 그는 "삶 들여다보기"의 진정한 고수다.
마지막으로, 서양문학의 번역본이 아닌, 이런 높은 수준의 필력을 자랑하는 작가의 원본을 그대로 읽을 수 있음이 가장 값지게 다가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