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나는 작은 회사에 다닌다 - 그래서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래.전민진 지음 / 남해의봄날 / 2012년 10월
평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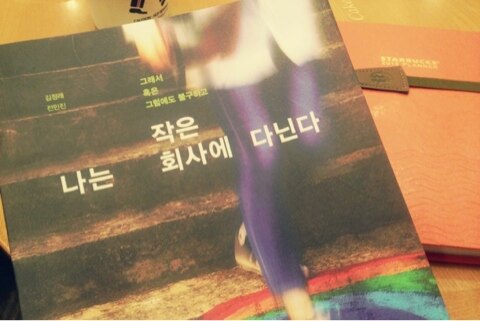
스물아홉과 서른, 두 젊음이 만나 열세명의 뜨거운 에너지를 한 권의 책에 담았다. 평소 관심있는 출판사 ‘소모’를 만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궁금하여 마주한 책에서 그들만큼이나 흥미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들은 모두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앞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거듭 확인해가며 자신의 길을 만들어 나가고 있었다. 그 들을 책으로나마 만날 수 있었던 건 가슴 떨리는 일이었다. 한 명 한 명과의 만남을 저자만큼이나 조심스럽게 또 기쁘게 마주했다.
사회가 규정하는 크기에 의해 '작은 회사'라고 이름하였을 뿐 그들이 몸 담고 있는 회사는 결코 작지 않다. 한 사람이 자신의 온 마음을 담아 일구어 나가는 세계를 감히 작다고 이야기하기에 우리는 얼마나 크고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걸까.
일전에 홍대에서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를 하는 지인에게 삼 일째 밤을 새며 작업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피곤함에 안쓰러운 마음을 전한 내게 돌아온 대답은 “괜찮아, 그래도 재밌어.” 그 한 마디 말에 크게 당황하여 오래 고민했었다. 어떻게 일이 재밌을 수 있는건지. 몇일 밤을 새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건지. 하루만 야근을 해도 일이 나의 소중한 시간을 빼앗아갔다는 생각에 분노하던 나였다. 야근이 당연한 일을 하다보니 일에 대한 분노와 그에 따른 스트레스만 커져가던 참이었다. 그러나 밥벌이의 신성함을 외면할 수는 없기에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매일 아침 머리를 감았다. 나에게 일이란 그저 나의 삶을 지원해주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다. 나에게 삶과 일은 완전히 분리된 영역이었다. 대게 회사에서 일하는 경우 하루 24시간에 노동이 차지하는 비율은 절반 가까이된다. 인생 전체로 따지자면 인생 절반 쯤을 일하는데 보내게된다. 자기 삶의 절반에서 자신을 소외시키는 반 토막 인생이 과연 행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먹고 살아야 한다’는 미명 아래 스스로 너무 많은 것을 희생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남들이 치열하게 일할 때 나는 치열하게 고민했다. 그 결과 그나마 가지고 있던 직업도, 돈도 사라졌지만 내 나름의 답은 남았다. 하나 남은 그 답을 통해 노동으로 인해 더 이상 내 삶에서 나를 소외시키지 않으려 한다. 그렇게 다시 살아도 이 것밖에 남지 않았을 것 같은 20대와 작별하는 중이다.
이 책 ‘나는 작은 회사에 다닌다.’는 노동이란 자기발견의 다른 이름이라 정의한 나의 생각에 확신을 더해주었다. 노동은 자신이 원하는 삶의 형태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며 자기에게로 나아가게 만드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그저 심장만 뛰며 살아있는) 내가 아닌 (가슴이 뛰며 존재하는) 내가 되기 위함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롭고 행복하기 위함이다. 이 책의 인터뷰이 중 한 명인 붕가붕가레코드의 팀장 김설화는 자유란 ‘자신의 목표와 일상, 자신과 일이 한 방향으로 일치해 가는 것 자체’ 라고 정의한다. 일과 삶의 경계를 허물고 분열되지 않은 궁극의 삶 앞에서 그녀를 자유를 느낀다는 것이다. 그렇게 자유 한 가운데서 그녀는 자기 자신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저자들과 인터뷰이들은 일을 통해 새로운 세계에 뛰어든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사람들이었다. 나 또한 일에 대한 비슷한 고민과 생각을 하며 그 나이를 통과하고 있기에 그들에게 더욱 공감할 수 있었다. 서른을 통과하는 저자 김정래는 우리가 통과하고 있는 그 나이대를 “봄도 아니고 여름도 아닌, 봄과 여름의 경계, 그 어디쯤이 아닐까? 봄의 설렘도 없이, 여름의 분명한 색깔도 없이 낮과 밤의 일교차를 묵묵히 견디며 조금씩 푸르러지고, 조금씩 무성해지고, 조금씩 단단해지는 시기.”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조금씩이나마 자기 자신으로 나아가고 있다면야 이 불완전하고 불분명한 날들을 조금 더 용기내어 나가갈 수 있을 것 같다. 강제윤 시인은 그의 시 ‘삼십세’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 행복하지 않았으나 불행이 동행은 아니었다. 나 아직 이룬 것 없으나 청춘을 허비한 적 없다. 나는 늙지 않았다.” 늦지도 늙지도 않은 나이. 이제 조금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이제 조금 내가 누구인지 알 것만 같은 나이. 작은 것이 결코 작지만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나이에 그들을 만나 든든했다.
일 속에서 자유와 만족과 기쁨과 스스로를 찾아가는 사람들. 영화 '양과자점 코안도르'의 여주인공처럼 그렇게 각자 자신의 일을 통해 삶에 윤기를 더해가는 모습은 한 편의 영화를 본 것 만큼이나 감동이었다. “직장이란 혹은 일이란, 인생이라는 계절을 살아내며 만나는 친구라는 생각이 든다.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아닌 친구 말이다. 그러니 단지 유명한 사람이나 잘나가는 사람보다는 자신과 잘 맞는, 자신의 마음을 내어주기에 아깝지 않은 사람이 친구로서 적격이 아닐까? 인생이라는 계절의 봄을 지나고 있는 지금, 좋은 친구를 만나 그 친구와 함께 때로는 아파하고 즐거워하며, 한 계절 한 계절의 진면목을 깊이 알아가고 싶다. 그리고 언젠가 짙푸른 여름을 맞이하고 싶다.” 홀로 서 있기에는 너무나 잔인한 겨울, 여름을 향해가는 열세명의 뜨거운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어 비록 손은 시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슴만은 따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