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
- 박용준의 아포리즘 - 인디고잉 25호

“좋은 사진은 사진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 롤랑 바르트, 『사진론』

지난 4년 동안 게재된 아람샘 다이어리에 이어 박용준의 아포리즘을 시작하며 오늘은 사진이 담긴 책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니, 때론 말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하는 사진들로 말을 건네보고자 합니다.

이 사진은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보통 사람들의 스타일리쉬한 사진을 담은 책, 『사토리얼리스트』의 저자인 스콧 슈만이 자신의 블로그에서 가장 소중한 사진 중 하나라고 소개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정갈한 흰색 가운에 담긴 아름다운 삶의 한순간.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의 겉모양새가 사실상 우리의 존재 방식이다. 가면이 곧 얼굴인 것이다.” - 수전 손택
또 하나의 사진집이 있습니다.
붉은 소파를 들고 전 세계를 돌며 사람들을 만나 인터뷰를 하러 다닌 호르스트 바커바르트의 책, 『붉은 소파』


1979년 뉴욕의 소호거리에서 낡은 ‘붉은 소파’를 발견한 바커바르트는 이 소파에 길을 지나가던 사람들을 앉히고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소파는 30년간 세계를 돌아다니며 보통 사람들을 만나 묻습니다.

‘당신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에게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당신에게 가장 흥미로웠던 경험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에게 사랑은 어떤 의미죠?’
‘다시 태어난다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죠?’, ‘개구리 왕자가 되고 싶어요. 공주의 키스를 받자마자 왕자가 될 것이니까요.’
“장식적인 스타일이라는 것은 없다. 스타일이 곧 영혼일진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영혼을 형식이라는 몸뚱이쯤으로 추정하는 것이다.”
- 장 콕토
누구든 이 소파에 앉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하게 하는 이 마법의 소파. 이 소파 하나로 모든 인간을 존재론적으로 평등하게 만드는 이러한 기획.
사진은 이렇게 많은 말을 걸어오기도, 또 많은 이야기들을 창조해내기도 하나 봅니다. 하지만 때론 사진보다 더 섬세하고 세밀한 묘사로 하나의 얼굴을 생생하게 그려볼 수 있게 하는 글도 있지요.
여러분도 아름다운 글을 읽으며, 하나의 방과 책상, 그리고 시와 같은 공간에 있었던 한 여인의 얼굴을 그려보시길….
아마도 가로 0.8미터, 세로 2미터쯤 되리라. 열차 침대칸 크기 정도다. 오크 나무는 아니지만 더 따뜻한 느낌의 배나무로 되어 있는 책상. 거기에 역시 나무로 된, 아마도 가족들이 아파트로 처음 옮겨 온 이십 년대부터 놓여 있었을, 바우하우스풍의 테이블 램프 하나. 거의가 수동으로 만들어진 듯 보이는, 하지만 그녀가 단 한순간도 신뢰하지 않았던 근대성의 약속, 그 약속에 맞게 만들어진 소박하고 기능적인 램프.
그녀가 집에 있는 동안 공부하고 잠자던 방에 그 책상이 놓여 있다. 이러 저리 휘돌던 그녀의 삶에서, 다른 어디에서보다 이 책상에서 더 많이 읽고 썼을 것이다.
그녀를 아는 사람을 만날 수가 없었다. 사진들은 많이 보아 왔다. 사진을 보고 그녀의 초상을 그려 보기도 했다. 아마 이 때문에 그녀를 오래 전부터 알아 왔다는 야릇한 느낌을 갖고 있는지도 모른다. 나는 그녀에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을 느낀다. 육체에 대한 혐오, 나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자각, 그녀가 줄 것 같은 사랑의 기회에 대한 들뜬 기분 등. 플라톤의 『티마이오스Timaeus』에서처럼 가난을 어머니로 삼아 생겨난 사랑. 그녀는 늘 의문의 여지 없이 나를 당혹시키곤 했다.
지난 주 파리에서 그 책상을 보았다. 책상 뒤에 있는 책꽂이에는 그녀가 보던 책들이 꽃혀 있었다. 책상과 마찬가지로 그 방 역시 작고 길쭉했다. 책상에 앉는 자세에서 왼쪽으로 출입문이 있다. 문은 복도로 이어져 있는데, 맞은편에 아버지의 진찰실이 있다. 복도를 따라 현관으로 걸어 나오면 왼쪽이 대기실이었다. 그녀의 방문 바로 바깥에 병든 사람들 혹은 병에 걸렸는지 불안해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아버지가 사람들을 보내고 맞는 인사 소리를 들을 수 있었을 것이다.
봉주르 마담, 앉으세요. 어디가 불편하지요?
책상 오른쪽은 창문이다. 북쪽을 향한 커다란 창이다. 오귀스트 콩트가(街) 육층에 위치한 아파트는 낮은 언덕에 자리잡고 있어서, 바로 아래의 뤽상부르 공원부터 사크레 쾨르까지 파리 전체가 내다보인다. 그 창가에 서서, 창을 열고, 겨우 비둘기 네 마리 정도 앉을 수 있는 발코니 쇠 난간에 기대어, 저 지붕들과 역사를 넘어 상상 속으로 비행한다. 상상 속의 비행에 꼭 맞는 높이다. 한 시대가 끝나고 다른 시대가 시작되는 도시의 먼 외곽, 그 방벽들을 향해 날아가는 새들의 높이. 그런 비행이 이 도시만큼 우아한 곳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그녀는 창 밖으로 보이는 그 풍경을 사랑했고, 그것들이 가진 특권의 부당함에 깊이 절망했다.
“진리와 고통은 자연스런 동류이다. 둘은 우리 존재 안에, 영원히 말없이 서 있도록 저주받은 침묵의 애원자들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파리 고등사범학교 입학시험을 준비하던 앙리 4세 리세(프랑스의 중등교육기관)시절, 이 책상에서 글을 썼다. 그때 이미, 그녀 평생을 이어 갔던 일기의 세 권째를 시작하고 있었다.
그녀는 1943년 8월, 영국 켄트 주 애시퍼드의 한 요양소에서 죽었다. 검시 보고서는 사인을 ‘굶주림과 폐결핵에 기인한 심장 근육 변성. 그에 따른 심부전’이라고 적고 있었다. 서른네 살의 나이였다. 법적 사인은 자살이었다. 굶주림은 단식에 의한 것이었다.
그녀의 글씨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은 무엇일까. 어린 학생들의 글씨처럼 끈기있고 공들여 씌어 있는데, 글자 하나하나가-로마자든 그리스 글자든- 이집트 상형문자의 모양을 하고 있다. 마치 단어를 이루는 개개의 글자 모두가 저마다 육신을 가지기를 원한 것처럼.
여러 곳을 옮겨 다녔고 묵었던 곳에서마다 글을 썼지만, 그녀가 쓴 모든 글들은 이 자리에서 씌어진 것처럼 여겨진다. 손에 펜을 쥘 때마다 마음은 그 첫 생각을 꺼내기 위해 늘 이 자리, 이 책상으로 돌아왔다. 쓰기 시작하면 책상은 잊혀진다.
어떻게 아느냐고? 대답은 나도 할 수 없다.
그 책상에 앉아, 나는 그녀 삶의 전환점이 되었던 한 편의 시를 읽는다. 그녀는 상형문자 같은 그녀의 글씨로, 그 영어로 된 시를 베껴 쓰고 외었다. 절망이 엄습하거나 편두통에 시달릴 때면 마치 기도하듯이 그 시를 암송했다.
그러던 중 어느 순간, 그리스도의 육체적 현존을 느끼게 되는 전율할 만한 경험을 한다. 아주 쉽게 눈앞에 나타나는, 신약성서에 나오는 기적과도 같은 환영들에 아연하게 된다. “…그리스도는 순식간에 나를 지배했고, 나의 상상력과 감각은 어떤 역할도 하지 않았다. 고통을 가로질러,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에 나타난 미소에서 읽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현존을 그저 느끼기만 했다.”
오십 년이 지난 지금, 조지 허버트의 그 소네트를 읽는 나에게, 시는 하나의 공간, 하나의 집이 된다. 그 집에는 아무도 없었다. 사하라 사막에 가면 볼 수 있는 무덤과 집들처럼 그 안은 돌로 만든 벌집 모양이었다. 살아오면서 많은 시를 읽어 왔다. 하지만 시를 찾아가 그 시 안에 머물러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낱낱의 시어들은 내가 찾아든 집을 이루고 있는 돌멩이들이었다.
아파트 입구(지금은 들어가려면 비밀번호를 눌러야 한다) 위 벽에 명판이 하나 붙어 있다.
“철학자 시몬 베유, 1926년에서 1942년까지 여기서 삶.”
- 존 버거, 「안티고네를 닮은 여자」, 『존 버거의 글로 쓴 사진』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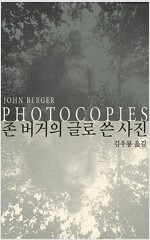
“얼굴이 완전히 순수할 경우……, 그 얼굴은 바로 의미이다.” - 리처드 아베든
[출처] 얼굴|작성자 asan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