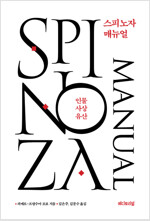라이트 블루 청바지를 주문한다. 사이즈를 한 단계 줄인 것이다. 황급한 문자다. 빈 방 좀 없나요. 식당 일조차 버거운 친구는 식당을 또 그만둔다.
몇 개월 내내 작업실 화구에 엉덩이를 밀착시키지 못한다.
걸려있다. 일터 재계약말이다. 긴 협상 끝에 힘으로 밀어붙이는 모습에 어리둥절하기도 하고, 어떻게 하나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가 이러면 안된다고 정신을 차린다. 마음 곳곳과 움직이는 동선 곳곳에서 대응을 어떻게 할까라는 기운을 살아움직인다. 잠결에도 대응진도를 많이 나가고, 몇차례 강도 높게 대응한 뒤 많이 약해졌지만 제 길을 걷고 있다. 언제 끝나나. 탄핵인용처럼 근간을 흔들고 있는 무리들이 동시에 겹쳐온다.
봄이 봄같아지다가 도로 동이다. 똥이다. 눈은 덕지덕지 쌓인다. 겨울내내 눈발 한 끝 쌓이지 않던 바닷가에도 눈기척이라니 놀랄 만하다.
십여년 같이 지내던 피씨가 먹통이다. 어찌 이리도 동시 다발적이란 말이야. 중고피씨에 복구했다고 가져온 하드를 살핀다. 어어 어어어 정작 필요했던 최신 바탕화면 링크 목록들이 보이지 않는다. 백업을 해둔 것도 아니고 뭣이람? 아득하다.
그렇게 북적이던 몇 달의 일상에 감기몸살도 두어 번 다녀간다. 그 와중에도 다행히 책들이 눈에 들어오기도 한다.



세 권의 책.
여기에 마음은 걸려있다. 아니 녹는 눈처럼 뭔지 딱 떨어지지 않는 느낌들이 뭉치려고 하고 있다라고 쓰니 좀더 마음은 편안하다. 셀 수 없는 성, 아니 우리가 선입견처럼 가지고 있는 성은 없다. 자연, 아니 우리가 편견처럼 알고 있는 자연은 없다. 그리고 스피노자와 이어진 책 정치적 정서는 놀랄만큼 다채로우면서도 이어져 있다.
이렇게 어수선한 일상들이 서로 겹치고 책들 사이 녹아내린다. 아니 곁에 물어주고 이어주고 다른 질문을 만들어주는 친구들로 단계, 단계 계단같은 순서를 밟을 수 있어 다행이다. 이번 주말, 늦어도 계약도 시국도 마무리되리라. 이왕이면 새로운 영점으로 재출발하면 좋겠다. 배제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서로 잘 살자고 하는 일이다. 지나친 욕심이 금물인 걸 아직도 잊었느냐. 검찰-검사동일체 이젠 그만하자. 나라를 말아먹는 것이 아니라 세계를 말아먹고 있다. 그래 우리가 제일 심해, 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