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 너무 시집을 안 읽는다.
읽으려고 노력한다는 게 일 년에 1~2권 정도다. ㅎㅎ
왜냐~ 시집을 고를 줄도 모를 뿐더라 아무거나 읽을 용기도 없고
읽었다고 해도 이해력이 부족한지 이해도 안되고 공감도 안된다.
어떤 시집은 처음부터 끝까지 시인의 자아에 갇혀 허덕이다가 빠져나와서는
'뭐라는 거야?'라며 허탈함에 한참 짜증을 냈다.
시인의 시상에 감히 다가갈 수 없겠끔 써 놓은 시들이 나를 시험대에 올려놓곤 해서
일찍 책을 덮었었던 것 같다.
우연하게
단편처럼 시를 쓰는 시인을 만났다.
빨간 표시가 눈에 띄어 그냥 넘겼더니 시집이였다. -_-;

안 읽으려 했는데 찰나에 눈이 몇 줄을 훑어 버려
한 편 읽게 되었다.
그 한 편의 시가 나를 홀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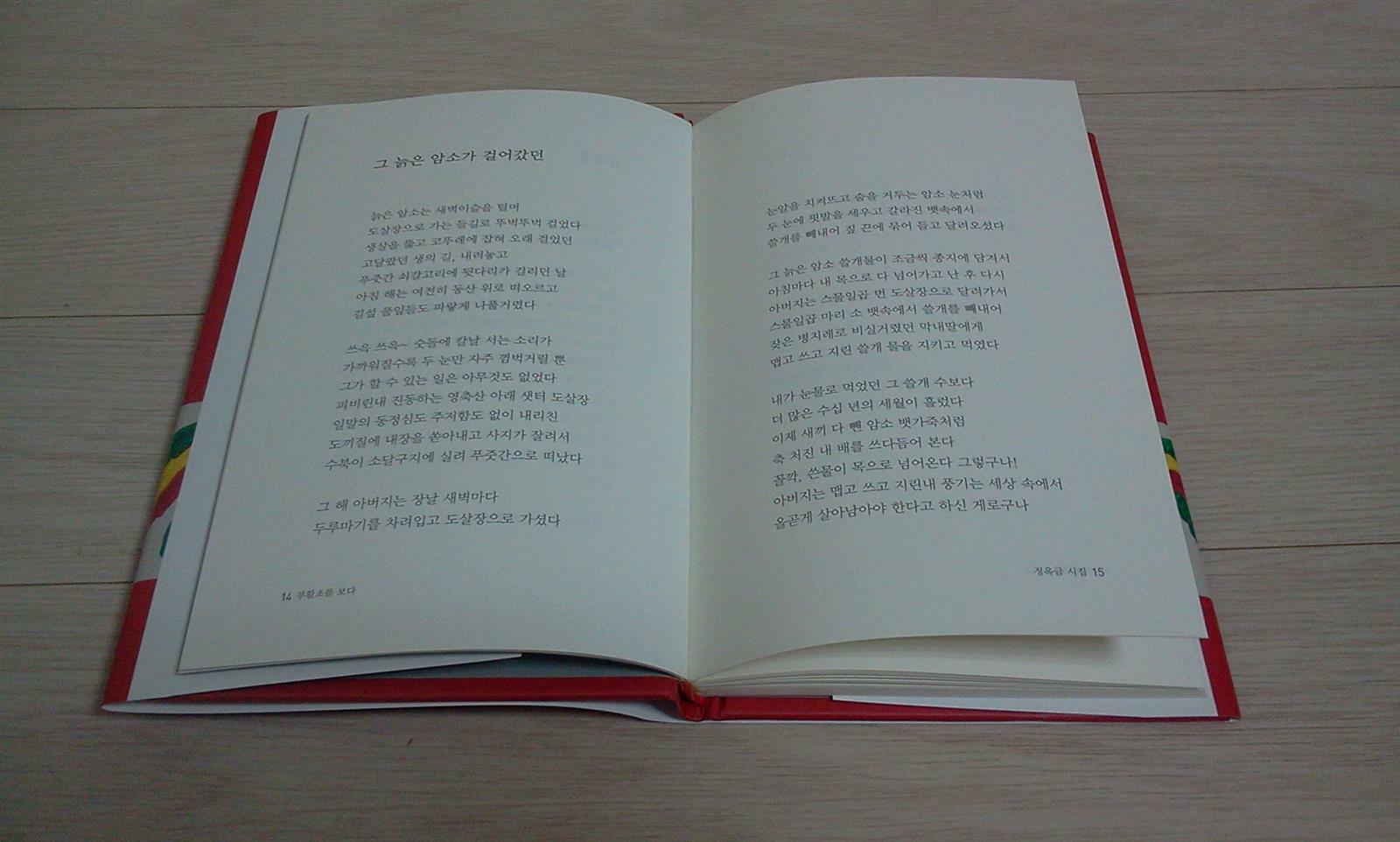
그 늙은 암소가 걸어갔던
늙은 암소는 새벽이슬을 털며
도살장으로 가는 들길로 뚜벅뚜벅 걸었다
생살을 뚫고 코뚜레에 잡혀 오래 걸었던
고달팠던 생의 길, 내려놓고
푸줏간 쇠갈고리에 뒷다리가 걸리던 날
아침 해는 여전히 동산 위로 떠오르고
길섶 풀잎들도 파랗게 나풀거렸다
쓰윽 쓰윽~ 숫돌에 칼날 서는 소리가
가까워질수록 두 눈만 자주 껌벅거릴 뿐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피비린내 진동하는 영축산 아래 샛터 도살장
일말의 동정심도 주저함도 없이 내리친
도끼질에 내장을 쏟아내고 사지가 잘려서
수북이 소달구지에 실려 푸줏간으로 떠났다
그 해 아버지는 장날 새벽마다
두루마기를 차려입고 도살장으로 가셨다
눈알을 치켜뜨고 숨을 거두는 암소 눈처럼
두 눈에 핏발을 세우고 갈라진 뱃속에서
쓸개를 빼내어 짚 끈에 묶어 들고 달려오셨다
그 늙은 암소 쓸개물이 조금씩 종지에 담겨서
아침마다 내 목으로 다 넘어가고 난 후 다시
아버지는 스물일곱 번 도살장으로 달려가서
스물일곱 마리 소 뱃속에서 쓸개를 빼내어
잦은 병치레로 비실거렸던 막내딸에게
맵고 쓰고 지린 쓸개 물을 지키고 먹였다
내가 눈물로 먹었던 그 쓸개 수보다
더 많은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다
이제 새끼 다 뺀 암소 뱃가죽처럼
축 처진 내 배를 쓰다듬어 본다
꼴깍, 쓴물이 목으로 넘어온다 그렇구나!
아버지는 맵고 쓰고 지린내 풍기는 세상 속에서
올곧게 살아남아야 한다고 하신 게로구나
그 늙은 암소가 걸어갔던 비릿한
무저항의 들길로 아버지가 오신다
소 쓸개를 들고...
---------------------
시집에 대한 나의 좁은 소견으로 보건데
선택된 단어들이 썩~ 시어답게 아름답거나 특이하거나 사랑스럽지는 않다.
그럼에도 먹먹함과 따뜻함이라는 여운을 내게 남기는 걸 보면
내 판단으로는 시집을 잘 읽지 않는 사람에게도 충분히 쉽게 다가올거라 생각된다.
또 다른 한 편의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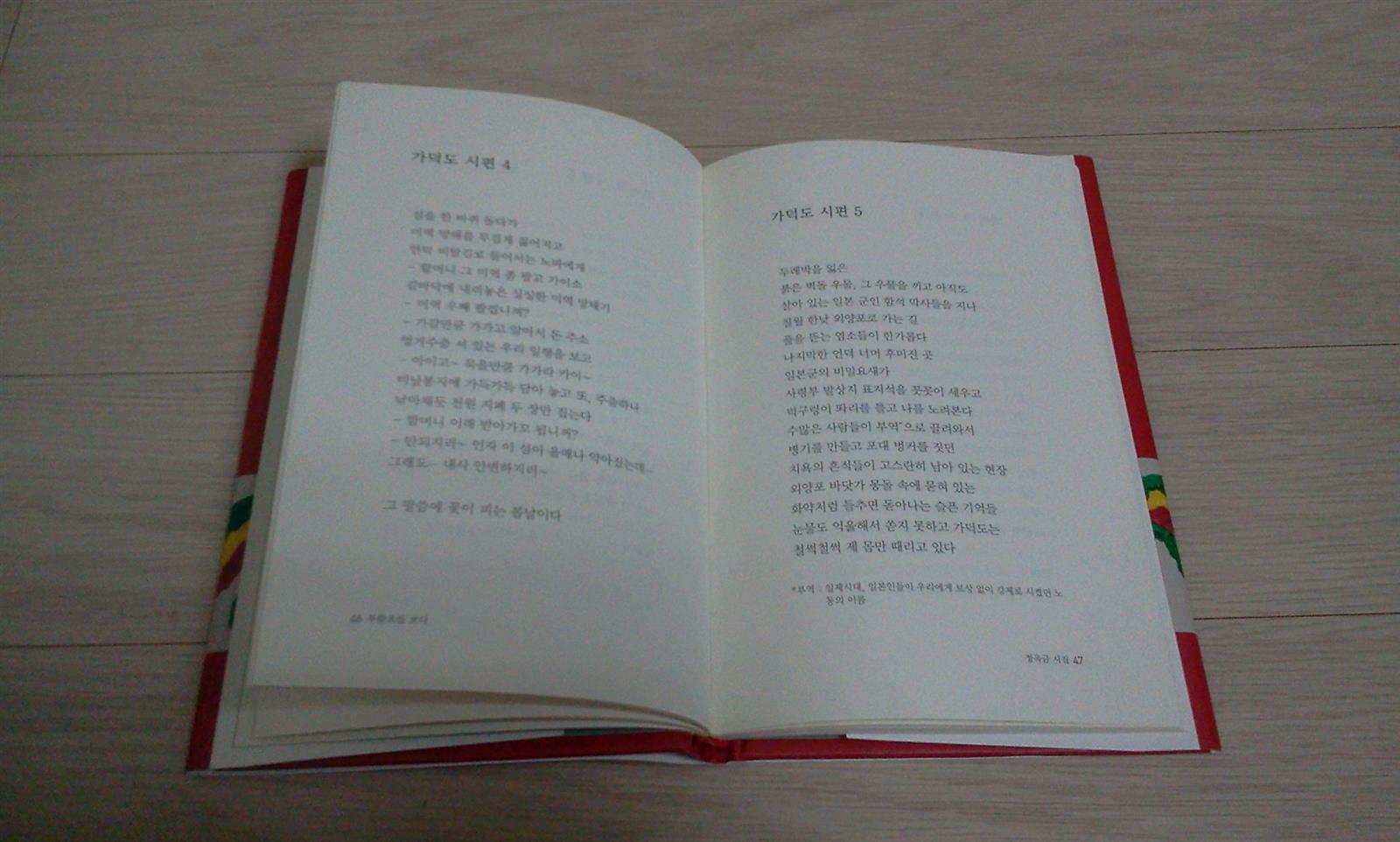
가덕도 시편 4
섬을 한 바퀴 돌다가
미역 망태를 무겁게 짊어지고
언덕 비탈길로 들어서는 노파에게
- 할머니 그 미역 좀 팔고 가이소
길바닥에 내려놓은 싱싱한 미역 망태기
- 미역 우째 팔낍니껴?
- 가갈만쿰 가가고 알아서 돈 주소
엉거주춤 서 있는 우리 일행을 보고
- 아이고~ 묵을만쿰 가가라 카이~
비닐봉지에 가득가득 담아 놓고 또, 주춤하니
낚아채듯 천 원 지폐 두 장만 집는다
- 할머니 이래 받아가꼬 됩니까?
- 안되지러~ 인자 이 섬이 울매나 약아짔는데...
그래도... 내사 안 변하지러~
그 말씀에 꽃이 피는 봄날이다
-------------------------------------
난 변하고 변해서 내가 없어질 판인데
할머니는 안 변하시겠단다. 멋지다. ㅋㅋ
독자랑 같이 놀줄 아는 시인을 만나 시집 한 권 재미지게 읽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