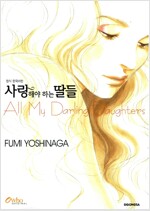
요시나가 후미 작품들에서는
시큰둥하거나 건조한 표정들이 많은데다
늘 어떤 시큰한 울림이 있다.
어디서 이런 게 오는걸까
먹먹해하며 생각해봤지만
그저 신기할 따름이다.
어쩌면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의 넓이 때문일지도.
후미의 작품에서는 늘 당혹스런 설정들이 나온다.
엄마가 갑자기 딸보다 어린 남자와 재혼을 하지 않나,
가학적인 관계만을 반복하는 여학생이라든지,
동성애도 즐겨 다루는 관계.
그 관계들은 아주 낯설어 당혹스럽게 하거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불쾌감마저 들게 하는데,
그럼에도 계속 읽어나가다 보면
그 관계들을 이해하게 되는 시점이 온다.
두 사람의 상황이 그런 것일뿐,
결국은 사랑받고 싶고, 복잡한 세상에 휘둘리며 사는
똑같은 사람살이란 걸 확인하게 되는 순간이 있는 것이다.
그때 아무리 내가 납득하지 모하고 불쾌하는 관계일지라도
그럴수도 있겠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순간의 기분이란
실로 묘하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이야기는 사야코.
착하고 주변 사람들이 기댈 수 있고, 성실한 사야코라는 아가씨는
아픈 할아버지를 간호하느라 혼기를 놓쳤지 뭐람.
결국 할머니 주선으로 선을 보기 시작하는데,
남자들은 꼭 한 부분씩 자신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더군다가 갈수록 이상한 남자들만 선자리에 나타나.
그러다 다리가 불편한데다 어머님 성격도 이상한 남자를 만나는데,
배려할 줄 아는 그 남자가 제일 마음에 들지 뭐니.
어쩜 그런 남자를 선자리에 데려오는거냐며 화를 내는 할머니에게
사야코는 이렇게 말해.
'아주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사야코는 그를 몇 번이나 더 만나. 그럴때마다 빠져드는 걸 느끼지.
그렇게 이어지는듯 했지만
결국 사야코는 자신이 사랑을 할 수 없는 사람이란 걸 깨닫지.
그녀가 간호했다던 할아버지 있지?
그 할아버지가 심지굳은 마르크스주의자로 평생 살아오신 신망받던 분이셨는데,
어릴때부터 사에코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대.
"사에코
절대로 사람을 차별해선 안 된다다.
어떠한 이유가 있다 해도
사람을 차별해선 안 돼.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대해주렴."
사에코는 그 말을 마음깊이 새겼었나봐.
너무 착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로 그 말을 지켜오며 살아온거지.
그런데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느낀 순간 깨달아 버린거야.
이건 자신이 지금까지 지켜온 원칙과 위배된다는걸.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사람을 차별하는 일이었던거야.
사랑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니 놀랍지 않아?
그 이야기에서 또하나 쓸쓸하게 남았던 건 할아버지의 말이었어.
평생 마르크스주의자로 살았다고 아까 말했지?
그런데 베를린 장벽을 무너지는 걸 TV로 보던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대.
"사야코,
내가 50년간 올바른 거라 믿고 있던 생각은 잘못된 건지도 모르겠구나"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렇게 말하던 할아버지의 내면은 어떠했을지 짐작이 가니?
그런데 말야,
사에코는 할아버지처럼 신념을 무너뜨릴수는 없었던걸까?
결국 사에코는 그 남자와 이별을 택해.
그리고는 자신의 길을 선택하는데 그 결정이 굉장히 놀라워.
그건 혹시나 이 책을 읽을지 모르니 비밀로 남겨둬야겠구나.
하지만 그야말로 자신의 신념을 잘 이어갈수 있는 자신만의 길이었어.
남자와의 이별은 안타깝지만 박수를 쳐줄수밖에 없더라니까.
책을 덮엎는데
사야코라는 그녀는 아직 남아있는 느낌이야.
이상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