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의 철학자' 강신주가 날라다니던 시절, 강신주가 낸 책이 있다.
<김수영을 위하여>라는 책이다.

출판사는 이 책을, 시인 김수영에 대한 문학비평서가 아닌, 김수영을 통해 한국 인문학의 뿌리를 찾으려는 철학자 강신주의 철학서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나는 이 책을 김수영을 향한 강신주의 절절한 연서로 이해했다.
누군가를 저렇게까지 좋아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강신주는 김수영에게 매료된 것 같았다.
마치 자신이 김수영이라도 된 것처럼 글을 썼다.
펄펄 끓는 열기는 그 누구라도 집어삼킬 듯했다.
부분부분 되읽은 건 말할 것도 없거니와 400쪽이 넘는 분량을 빨려들어가듯 통으로 두 번이나 읽었다.
그런 열기를 양혜원의 책 <박완서 마흔에 시작한 글쓰기>에서도 느꼈다.
양혜원은 기독교 서적 전문 번역가이자 저자이며 목회자의 아내다.
또한 여성학자이자 박완서 전문가이기도 하다.
그녀를 나는, 십여 년 전 <김수영을 위하여>가 출간된 해에 <교회 언니 여성을 말하다>로 만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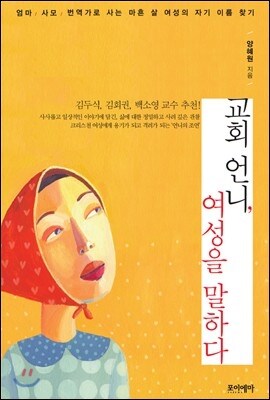
양혜원은 목회자인 남편을 대신해 경제활동을 하다 마흔이 훌쩍 넘은 나이에 홀로 유학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 시절 읽었던 박완서의 소설과 박완서라는 작가가 자신에게는 어두운 밤에 빛나는 등대와 같은 존재였다고 한다.
무엇보다 박완서가 전업주부로 있다 마흔에 등단한 상황이 자신이 처한 환경과 비슷해 더 몰입했던 듯하다.
박완서는 친근한 이미지와 함께 사실적이고 날카로운 묘사와 은근히 재미있는데다 슬쩍 비꼬아 의중을 전하는 문학적 재능과 명확한 주제의식으로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을 받은 작가다.
게다가 사십 이후 그녀의 삶은 그 자체가 선구적이었다.
그녀가 등단했을 때 우리 집은 마루에서 김장을 하고 있었고, 라디오에서 평범한 가정주부가 글을 써서 잡지사의 상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어린 내가 놀랐던 기억이 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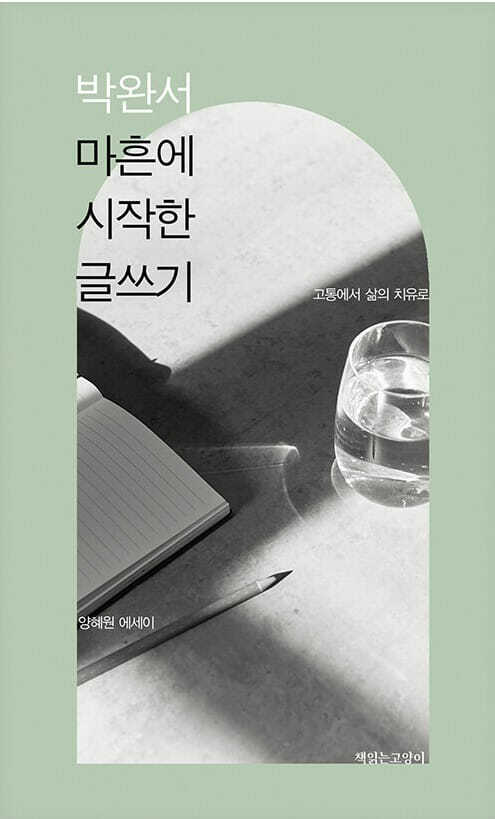
양혜원은 이 책을 6부로 나누어 이야기를 이어간다.
1부는 박완서의 마흔을, 2부는 평등과 연애에 대해, 3부는 섹스와 임신에 관해, 4부는 트라우마를, 5부는 고통을, 6부는 독립이라는 주제를 박완서의 삶과 작품을 묶어 하나씩 풀어간다.
양혜원은 박완서의 삶과 그녀의 소설이 만나는 지점을 중심으로,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박완서가 소설을 통해 이룬 사회적 성취와, 이 시대의 상황과 요구, 자신의 삶을 유기적으로 연결한다.
박완서의 소설 중 초기작을 나는 거의 읽지 않았다.
어릴 적 그녀의 소설이 신문에 연재됐던 걸 보아서인지, 아니면 성인 소설이라는 그때의 느낌이 남아서인지 선뜻 다가가지 못했다.
처음 접하게 된 박완서의 책은, 그녀가 남편과 아들을 3개월 간격으로 잃고 참척의 아픔으로 몸부린치던 시간을 기록한 <한 말씀만 하소서>였다.

그후 자전적 성장 소설이라 불렸던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먹었을까>,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와 <미망>, <못 가본 길이 더 아름답다> 정도에 이 책과 두어 권을 더할 뿐이다.
저자 양혜령은 박완서의 전 책과 삶을 통해 한 개인이 아닌 페미니즘의 발전 과정 또한 조망하는데, 그녀의 글에는 박완서에 대한 애정이 뚝뚝 묻어나 있다.
객관적 거리두기가 아닌 공감적 읽기를 통해 대화를 주고 받으며, 때로는 박완서의 입장이 되어 그녀의 마음을 대변하기도 한다.
이 책을 읽으면 우리는 몇 가지를 알게 된다.
박완서를, 양혜원을, 자신을, 그리고 여성을. 더불어 고통이라는 원치 않는 감정과 세계까지도 만나고 인정하게 된다.
또 있다.
박완서라는 깊은 우물이자 마중물을 통해 삶을 만나고 죽음도 준비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라는 찬란한 시간 속의 자신과도 반갑게 조우하게 된다.
그렇다면 늦지 않았다.
이제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