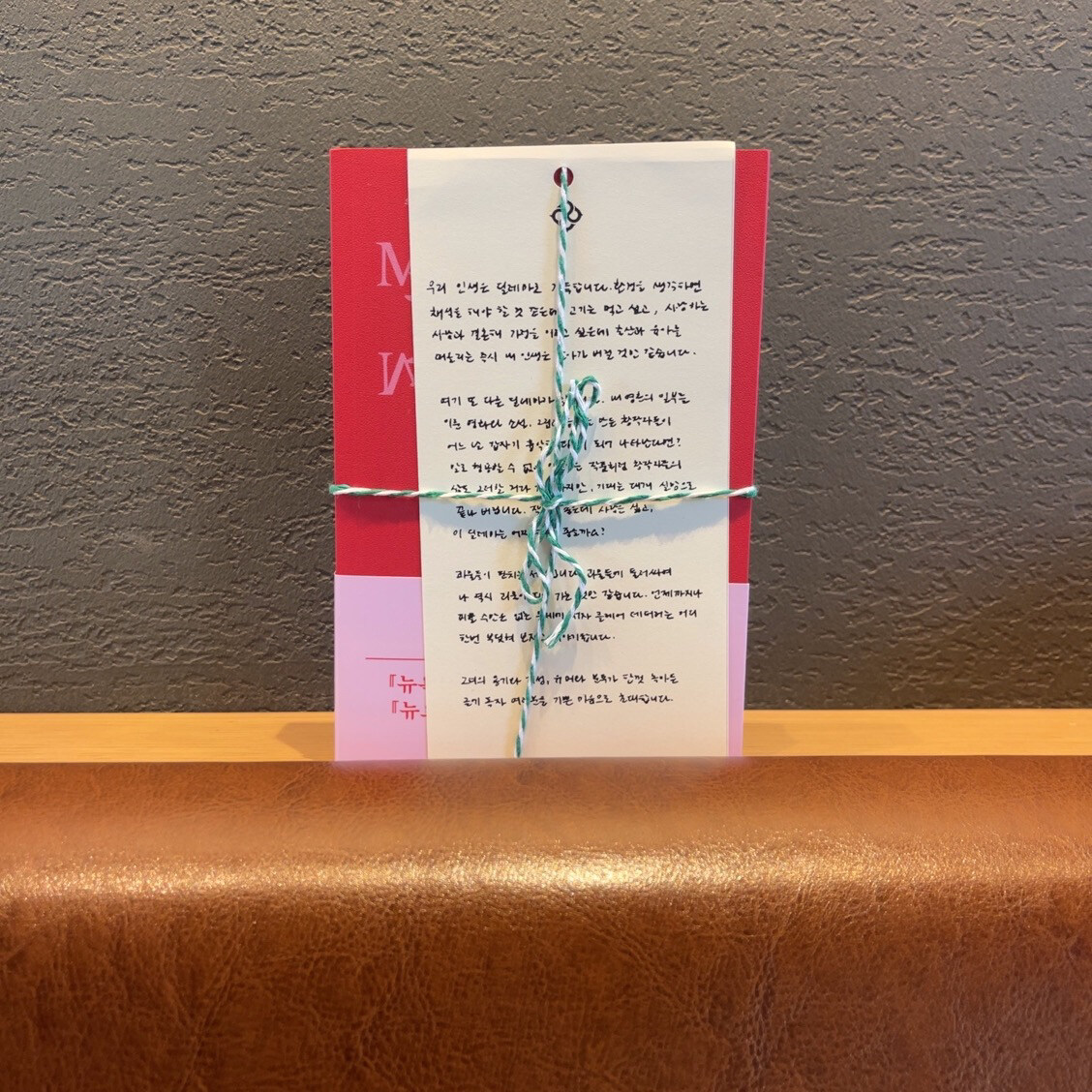#도서제공 #을유서포터즈5기 #을유문화사 #에세이추천 #몬스터즈 #괴물들 #클레어데더러
그제야 나는 생각만으로 로만 폴란스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알았다. 시인 윌리엄 엠프슨은 인생이란 결국 분석으로 풀 수 없는 모순 사이에서 자신을 지키는 일의 연속이라고 했다. 나도 그 모순 한가운데에 있었다. 20쪽
저마다 좋아하는 예술가(혹은 아이돌)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대상의 작품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부디 헤드라인 기사로 마주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함께 자라난다. 혹은 이미 괴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작품을 계속 찾아보려는 마음을 억제하기 힘들어지기도 한다. 이 책은 그런 이중적인 마음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지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몇 해전 한 여가수의 생애를 다룬 영화를 보면서 가족이란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 자녀를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도 이겨내지 못하는 우울, 중독증세에 관해 안타까움을 넘어 정리되지 않은 감정으로 불편했던 적이 있었다. 저자의 말처럼 내 침대에서 혹은 내 집 안에서라는 안전하고 편안한 울타리 안에서 그들을 마주하는 것은 온전하게 그를 마주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개인적으로 가족이 가족에게 주는 상처가 큰 이유도 극과 극의 감정을 처리하지 못하는 감정적 장애를 불러오기 때문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헤밍웨이가 개자식이었다는 평판은 피카소와 마찬가지로 그를, 혹은 그의 작품을 앞선다. 헤밍웨이라는 이름은 난투극과 여성 편력과 폭력의 동의어다. (...) 그는 아들들을 너무나 사랑하면서도 괴롭혔다. 특히 아들 그레고리와는 점점 소원해지다 만나기만 하면 서로 폭력을 행사해 결국 만날 수 없는 사이가 되기도 했다. 129쪽
위의 사례처럼 드러내놓고 괴물의 면모를 보여주었지만 대중의 뇌리에 ’천재‘의 모습만 남은 예술가들을 보여준다면 이번에는 작품에서 보여지는 인물의 성격 혹은 성향을 작가에게 투영시켜 그를 괴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우리는 주제 때문에 그 예술가를 벌할 수는 없다.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한다. 예술가의 주제 때문에 예술가를 항상 비난한다. (...) 과연 ’롤리타‘가 오늘날 출간될 수 있었을까? 난 아닐 거라 생각한다. 177쪽
과거 드라마에서는 나이차이가 많은 남녀의 사랑, 특히 키다리 아저씨를 표방한 내용을 보며 희망을 갖기도 했던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은 방영하기도 전에 시청자의 항의로 인해 두 사람 사이의 러브라인은 실현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저자는 다시금 열 세살 어린 소녀를 성폭행 한 폴란스키를 소환한다. 그리고 그 비열함에 다시금 분노한다. 왜냐면 그런 일들이 소설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한 저자의 비정상적 사고와 잘못된 호기심이 아닌 지금 어딘가에 여전한 일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런 끔찍한 일들을 저지르지 않았다. 그러니 나는 괴물이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또한 다른 모든 인간처럼 살면서 나쁜 행동들을 저질러 최소한의 내 몫을 채우기도 했다. 더 나아가 이딴 행동을, 그러니까 책을 쓰는 짓을 저질렀다. 203쪽
이 책의 서평은 처음부터 다시 쓰기를 반복했다. 자극적인 사건(혹은 아티스트의 유명도에 따른)을 배치할 것인가, 아니면 저자의 괴로움의 공감하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할 것인가, 이것도 아니라면 이렇게 집필 자체도 고통스러운 책과 독자도 만만치 않은 괴로움을 느끼게 하는 책을 왜 읽어야 하는지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를 적어야 할 지 고민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누군가의 엄마라는 존재로서 책 쓰기와 읽기에 관한 유대감. 그러다가 모든 것을 한꺼번에 넣어 쓰고 있다. 그러니 이제는 ’엄마‘에 대해 쓸 차례다.
다음은 아이 버린 엄마로 매도당할 가능성이 있는 행동들이다.
서재나 작업실의 문을 닫고 아이를 들어오지 못하게 (...)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긴다 244쪽
위의 목록을 보고 자유롭지 못해 놀랐다. 역자 서문에 적힌 ’비평서와 자서전의 결합‘이란 내용을 먼저 읽었더라면 좀 덜 놀랐을까 싶기도 하고, 어쩌면 후기를 후기로 읽어서 혼란스러움과 평정의 순서를 차례로 겪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어쨌거나 저자는 예술가든 누구든 도덕적 잣대로 그 사람을 추앙하거나 외면해야 한다거나 하는 이분법적인 결론을 내리진 않는다. 하지만 저자처럼 투명한 프리즘으로 들여다 볼 기회를 가져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이 책에서 언급된 예술가 혹은 그들의 작품을 좋아했던 독자라면 (게다가 누군가의 엄마라면) 함께 읽고 감상을 나누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