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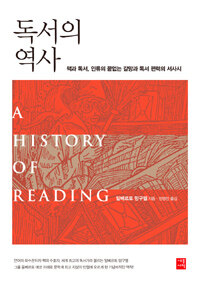
바쁜 일상에 치여 살아가다 보니 피곤하다는 이유로 책 한 권을 독파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진다. 인간관계로 인한 공치사라도 얽매이는 주말엔 금새 월요일이 오는 소리가 들리는 듯 하다. 그래서 예전에 잘 찾지 않았던 책에 관한 책도 요즘엔 눈여겨 보게 된다. 몰랐던 책의 새로운 발견이 가능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책이라도 또 다른 의미를 쌓아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마르케스의 서재에서>도 책에 관한 책이라는 사실은 맞다. 다만 엄밀히 말해서 '책을 읽는 것에 관한 책' 즉, 독서라는 행위의 전반에 관한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일단 제목과 책 자체의 내용이 마음에 들어 서점에서 훑어보고 바로 구매를 결정했다. 허나 책 제목은 원작의 제목을 완전히 무시하고 내용적 흐름에 맞게 손 본 제목이었다. (타이완판 원제를 풀어쓰면 '열독이야기' 라고 한다.) 지금의 독자 상황과 독서의 상황을 저자 나름대로 예리하게 분석하면서 독서에서 찾아야 할 의미와 의미를 찾기 위해 취해야 할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글이야 이렇게 간략하게 썼지만 책과 독서 그리고 서점을 좋아하는 독자라면 한가한 시간에 본인이 좋아하는 공간에서 차를 마시며 읽기 좋은 책임을 느낄 수 있다. 개인적인 느낌으로 번역도 잘 된 편인 것 같고 글의 흐름도 따라가기 어렵지가 않다.
한국어판 제목이 <마르케스의 서재에서>로 된 이유는 책 속에서 마르케스의 '미로 속의 장군' 소설 속 내용을 서두에 인용하며 글을 풀어나가기 때문인 것 같다. 또, '마르케스' 하면 한국에서 상당한 인지도를 보유한 스페인어권 작가이니 홍보에도 도움을 받고자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아무래도 '열독이야기'로 정했다면 뭔가 딱딱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을 듯. 이 옆에는 알베르트 망구엘의 <독서의 역사>를 붙였다. 독서라는 행위의 전반에 관해 이 보다 친절한 설명서가 많지 않아서다. 작년에 개정판이 나온김에 덧붙였다.



책 읽기에 관한 몇 종의 참고도서들이다. <책을 읽을 때 우리가 보는 것들>은 시원스런 일러스트와 간결한 문장덕에 임팩트가 큰 책이다. 이반 일리치의 <텍스트의 포도밭>은 조금 장황하지만 책 읽기에 관한한 고전으로 불려도 손색없다. <책 먹는 법>은 책과 관련된 다양한 직업을 거친 저자가 풀어내는 맞춤형 책 읽기에 관한 책이다.



이번에 책에 관한 책으로 신간이 나온 두 저자의 책도 소개한다. 가쿠타 미츠요의 <아주 오래된 서점>과 다치바나 다카시의 <다치바나 다카시의 서재> 두 권이다. 다치바나의 책은 본 결과 그냥 딴나라 얘기 듣는 기분이었다. 그가 소개한 책 중 국내 번역된 것이 많지 않아서인 것 같다. 반면, 가쿠타 미츠요의 책은 네이버 사전연재때부터 눈여겨 봐서 실물로도 구매를 고려해 볼 만한 책인 듯. <시바타 신의 마지막 수업>은 일본 출판계의 산 증인을 인터뷰한 책이다. 사놓고 거의 못보고 있는 찰나 알라딘에 중고로 겁나 많이 풀렸다. 이번 주말은 정자세로 <마르케스의 서재에서> 정주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