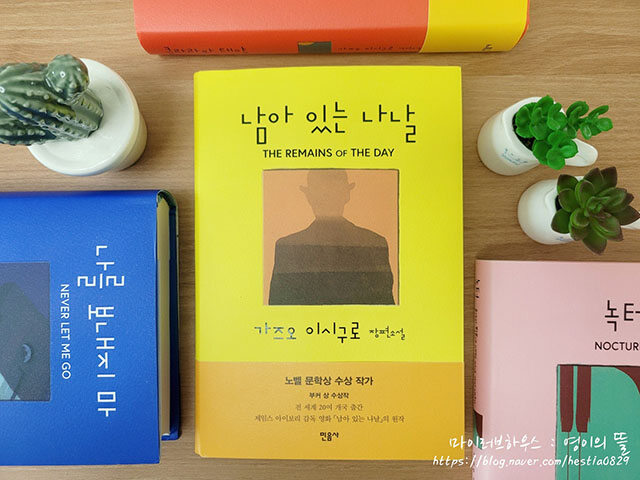
1930년대의 유럽을 보면 미국의 대공황과 독일의 히틀러가 자신의 야욕을 드러내는 시기로 영국으로선 격동기였다. 권력 인사들의 회의장소로 활용했던 저명한 저택 '달링턴 홀'에서 오랜기간 집사로 일했던 스티븐스의 짧은 6일간의 여행기록이 들어있다고 한다.
집사라고 하면 금테 안경을 끼고 주인님의 스케줄을 착오없이 관리하며 저택은 먼지 한 톨 없이 청결함을 관리하는 이미지가 떠오르는 것처럼 책 속의 집사도 고지식하고 바른 정신의 소유자여서 빈틈이 없어보였다. 그러던 어느날 주인의 호의로 처음 여행을 떠나지만 혼자 떠나는 여행을 기뻐하는 것보다 불안감이 더 컷던 스티븐스는 여행중에 느꼈던 소박한 배려와 친절로 자신의 삶을 되돌아 보게 되는 기회를 맞는다.

충직한 집사로 어느 하루 허투로 보낸 날이 없었던 스티븐스는 자신의 영역안에서 완벽한 직업능력의 소유자다. 남들에게 흐트러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주어진 일에 책임을 다하는 그 였으나, 주인 곁을 지켜야했기에 마지막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다. 그리고 자신으로 향하는 사랑을 멈춰세워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알면서도 모르는 척 켄터양의 감정을 외면하고 만다.
그렇게 여행길에서 만난 사람들과 소소하지만 작고 소중한 관계를 맺으면서 자신의 과거를 들여다 보는데, 자신의 삶이었다고 알고 있던 사실이 타인을 위한 삶이였음을 느끼게 됐을때 이루 말할 수 없는 도대감에 빠지게 된다. 스티븐스는 그대로 주저앉을 것인가? 인간의 내면을 파고드는 진정한 삶의 이야기가 가슴에 아주 천천히 스며들게 했다.
우리는 지금 현재의 자리가 아주 크고 중요하다고 여겨질 수도 있다. 하지만 세상은 넓고 나와는 다른 사람이 존재하며 다른 세계가 존재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다만, 우리는 현재 삶에 안주해 있는게 편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기가 두려운 것일지도 모르겠다. 이런 것들이 자신이 인식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는 점을 직시하는 남아 있는 나날은 그를 통해 자신을 들여다보는 계기를 마련해 주지만 끝까지 자신의 직무를 놓지않는 그를 보며 인간의 본성이 변하는 건, 결코 쉽지 않음을 새삼 깨닫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