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日)요일이 저물고 월(月)요일이 조용히 뜨기 시작하는 밤. 잠을 자야 할 시간인데도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는다. 일요일이 끝날 때만 생기는 불면증이다. 자꾸만 미룬 책들을 뒤늦게 펼쳐본다. 온종일 가만히 있었던 집중력이 되살아난다. 눈꺼풀에 매달린 졸음이 달아난다. 거뜬히 책을 읽고 나면 새벽 한 시. 집중력이 평소보다 높아지는 날이면 새벽 두 시까지 읽는다.

* 파스칼 드튀랑, 김희라 옮김 《우주를 품은 미술관: 예술가들이 바라본 하늘과 천문학 이야기》 (미술문화, 2025년)
지난주 일요일(9월 7일)에 《우주를 품은 미술관》을 완독했다. 하루 만에 다 읽었다. 서평을 쓰기 시작했다. 쉬엄쉬엄 다른 책을 보면서 서평을 썼다. 완성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 월요일(9월 8일) 새벽이 될 때까지 썼다.
월요일 새벽에 ‘붉은 달(blood moon)’이 뜬다는 뉴스를 알고 있었다. 달이 붉게 변하는 현상은 개기월식이다. 달은 지구의 그림자에 완전히 가려진 상태다. 《우주를 품은 미술관》에 일식과 월식 현상을 묘사한 그림들이 나온다. 고대 그리스-로마인들은 일식과 월식을 불길한 징조로 여겼다. 시대가 변하면서 일식과 월식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인식이 달라졌다. 기독교 미술에서 묘사된 일식과 월식은 갑작스럽게 나타난 신의 메시지를 의미했다.
달이 붉게 변할 때가 ‘개기식 최대’로 볼 수 있는 시간대다. 그런데 붉은 달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개기식 최대 시간이 새벽 3시 11분이다. 새벽 3시를 넘긴 채 월요일 새벽을 맞이한 적이 없다. 아침에 깨어날 때 막 몰려오는 피로감을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되었다. 자투리 잠을 잘 걸 그랬나. 하지만 서평 쓰는 데 몰입하느라 눈을 잠깐 붙일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다. 서평을 다 쓰고 나니 새벽 2시였다. 잠이 오지 않아서 옥상에 갔다. 2시 30분부터 개기식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밤하늘에 구름이 많았다. 구름은 서서히 붉어지는 달을 가렸다. 생각하지도 못한 변수다. 구름 뒤로 숨은 붉은 달이 있는 곳을 쳐다보기만 했다. 구름이 지나가길 바랐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구름은 붉은 달을 감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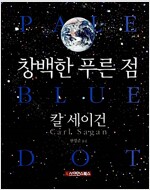
* 블레즈 파스칼, 이환 옮김 《팡세》 (민음사, 2003년)
* 칼 세이건, 현정준 옮김 《창백한 푸른 점》 (사이언스북스, 2001년)
한 시간 남짓 불빛 한 점 없는 옥상 한가운데 서서 밤하늘만 우두커니 바라보고 있으니 살짝 두려움을 느꼈다. 파스칼(Blaise Pascal)이 두려워하던 ‘무한한 공간의 영원한 침묵’이 어떤 느낌인지 조금은 알 것 같다. 내 눈앞에 펼쳐진 구름 낀 밤하늘은 크기를 가늠하기 힘든 우주의 아주 작은 일부분에 불과하다. 그런 우주 속에 살고 있는 인간은 아주 작은 존재다. 파스칼은 어린 나이에 계산기를 발명했고, 젊은 시절에 수학과 물리학에서 뛰어난 업적을 남긴 다재다능한 학자다. 게다가 그는 《팡세》를 쓴 철학자이자 신학자이기도 하다. 그는 천문학에 관심을 드러나지 않았지만, 무한한 어둠의 우주 속에 있는 인간을 티끌로 비유한 칼 세이건(Carl Sagan)의 말에 공감할 것이다. 우주에서 바라보는 지구는 ‘창백한 푸른 점’이다. 파스칼은 무한을 두려워했지만, 사실 내가 두려워한 것은 아주 가까이에 있었다. 그것은 바로 모기였다.

새벽 3시가 될 무렵에 구름이 전보다 줄어들었다. 지나가는 구름의 틈 사이로 붉은 달빛이 희미하게 보였다. 구름에 반쯤 가려진 붉은 달을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었다. 어설프게 고화질로 설정해서 찍은 건데 생각보다 붉은 달빛이 진하게 나왔다. 달 표면이 뚜렷하게 나온 사진은 아니지만, 맨눈으로 붉은 달을 봤다는 것만으로 만족한다. 3시 25분. 붉은 달 관측 종료.
집으로 돌아와서 바로 누웠는데도 잠이 오지 않았다. 억지로 눈을 감았다. 그날따라 눈 속의 어둠이 무한한 우주의 어둠처럼 느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