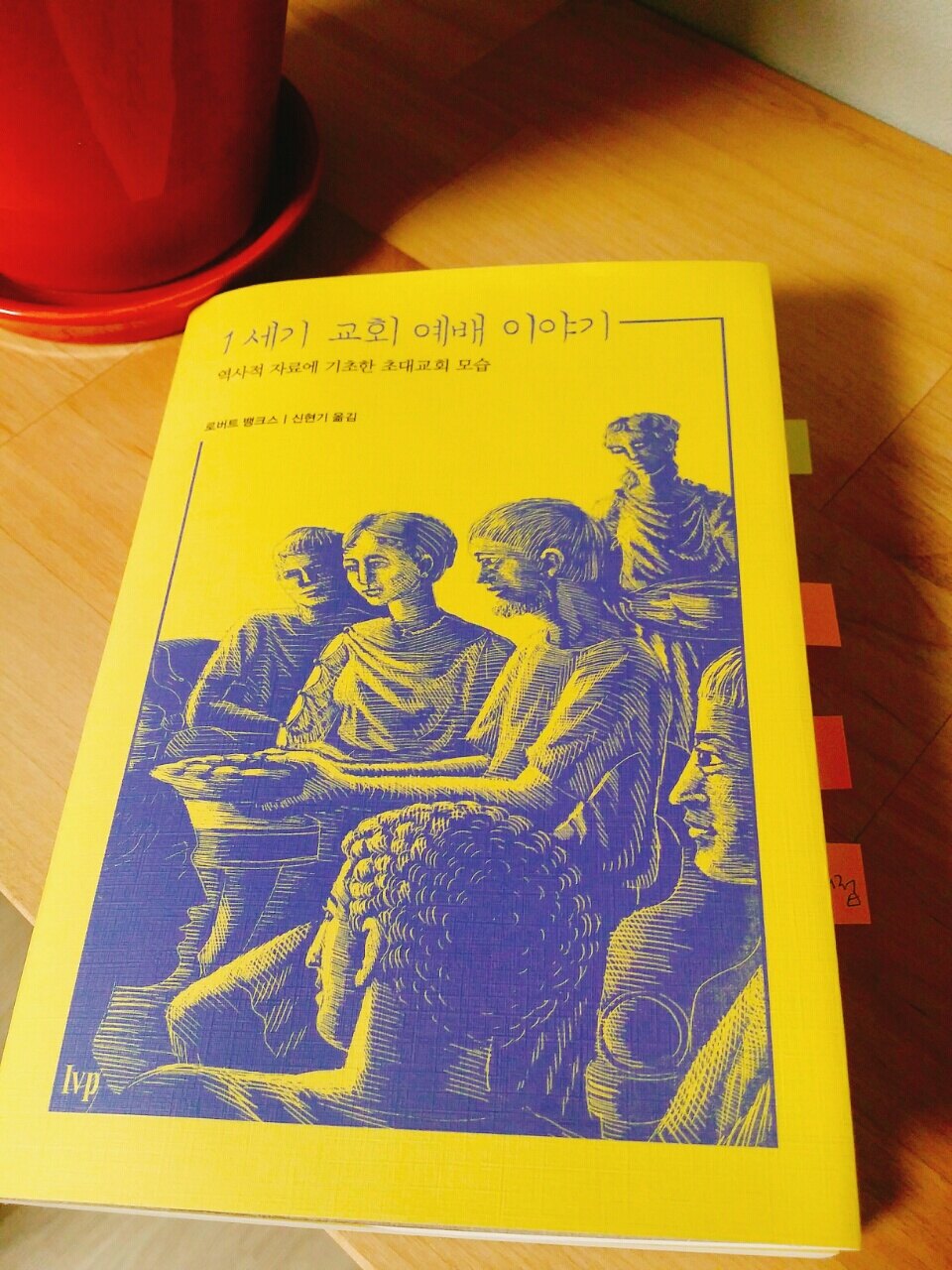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의 집에 나도 방문해봤다. 푸블리우스가 경험한 경로를 따라~
푸블리우스가 특이하고 낯선 경험이라면서 인상 깊게 나눠 주는 이야기들이 꽤 신선하고 솔깃했다.
알지만 실천에 있어서 소홀히 여기던 많은 단어들을 떠올랐고, 낯설지만 보기 드문 광경에 집중했다.
저자는 교회의 표준을 강요하거나, 개인의 신학적인 관점을 이렇다 하게 제시하려는 의도로 보이진 않는다.
다만 그간 일반적인(?) 교회가 동의한 형식과 절차를 떠나, 예배와 성찬, 신자의 신앙과 섬김의 태도와 역할 등에 대해 상상력을 가미한 스토리로 저자의 의도를 전개하는 듯 했다.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에 함몰되다 보면 상실하거나 외면하기 쉬운 부분들을 상기시켜 준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일깨워 주는데 유익했다.
형식과 절차를 중요시 여기는 반면에, 얼마나 습관적이고 조급하고 의식없이 행했던 것들이 많았던가 점검하게 해줬다.
예를 들면, 넉넉하고 평온한 삶의 일상 속에서부터 예배의 시작이라는 것부터 눈에 띤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서 전달되는 환대와 섬김, 차별하지 않는 마음, 관대함과 친절함의 손대접은 너무나 아름답다.
부부의 집에 초대되어 모인 사람들의 편안한 분위기는 서로를 배려하고 겸손하며 존중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짜맞춘 격식은 없지만, 진지하게 대화하고 협력한다.
빵을 떼고 나누며,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단순하지만 실제적인 기도를 한다. 매일 보고 들은 것들을 일상의 언어로 펼친다.
두루마리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의 의미를 되새기는 모습들은 비록 자유하지만 경박하지 않고 질서있고 차분하다.
서로의 은사를 알아주고 성장을 위해 배려하고 발휘되도록 사랑으로 돌보고 돕는 말과 손길이 익숙하다.
그들의 오고 가는 대화는 상투적이거나 화려하지 않지만 말의 힘이 있다.
그렇게 저자는 의아하거나 낯선 시선의 독자에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고 풀어냈다.
˝집으로 들어오면서 실제로 예배는 시작되었지˝(29)라고 하면서 말이다.
초대된 집에 방문했던 독자인 나의 소감은, 푸블리우스가 마지막에 남긴 말(본문 박스)로 대신한다.
짧지만 강한 인상을 남긴 책임에는 분명하다는 덧과 함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