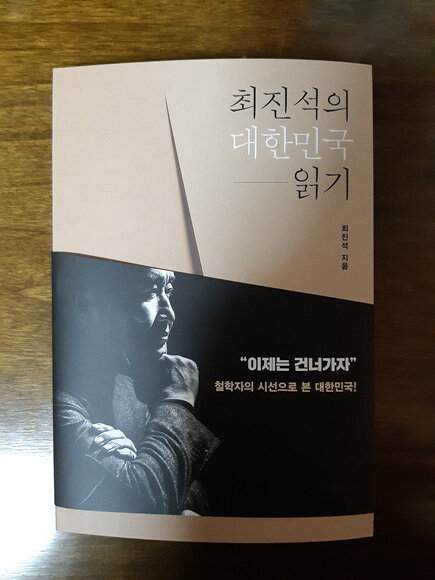
철학자의 사유를 현대적인 언어로
쉽게 들어볼 기회는 별로 없는 듯 하다.
꼭 철학자가 아니더라도 현시대가
자신의 생각을 곧이곧대로 얘기하는 걸
보기도 어려운 시대라 느껴지기도 하고,
굳이 자신의 생각을 그대로 말하고자 하고
들려주고자 하는 그런 풍경이나 사람도
매우 보기 드문 시간을 산다고도 느껴진다.
그런데, 그 어려운 걸 최진석이란
이 잘 알려진 철학교수는 실행에 옮긴 듯 싶다.
예전의 난 철학을 좋아했으나 잘 알진 못한다.
오히려 어느정도 깊이를 느끼는 정도만 해보다
나름의 적정선에서 놓아버리고 말았다.
보통의 책들로만 공부해내는 철학의 귀착점은 왠지
탁상공론으로 빠져버리거나 간서치라고 하는 식의
자기 생각만을 확고하게 되버리는게 될까봐.
그러다, 꽤 시간은 흘러 정통 철학책은 아니지만
한국의 주류 철학가인 최진석의 이번 책을 읽게 되었는데,
이렇게 옳곧은 책을 썼을 줄은 사실 기대 못했다.
쉽고 간결하고 분명하다.
스스로의 논점을 흐리지도 않는다.
그렇다고 독자로써 철학자의 책이란 이유로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처럼 무조건 따르는 식의
배우자식 독서는 아니었다.
실제 그의 흐름 따라감에 있어서
철학자의 말이기에 문외한인 독자가
그의 책속 얘기들에 반론을 제기한다는
그 자체를 자신도 모르게 터부시하며
마냥 경청하는 분위기로만
들은 듯 본 건 아니었다는 얘기다.
근데 책의 어느 흐름에서도
반론을 해 볼 여지는 거의 없었다.
되려 어찌보면,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들을,
더 많이 배운 이의 정제된 언어로
그가 지닌 철학적인 논리들로써
간접적으로 재정립 해보는 시간 같았다.
한국사회 전반적인 다양한 상황들을 다루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을 바라보기 앞서
청년 최진석이었던 80년대 말 90년대 초시절의
짧지만 중요한 자신의 경험담을 먼저 들려준다.
그 경험담 안에서 자신 또한 시류에 편승했던 이요
한명의 젊은이이자 학생이었던 시간이었다.
중국 하얼빈으로 넘어가 겪고 보았던 시간들.
떠나온 한국은 민주화 열풍이었고
자신이 떠나 들어간 곳은 사회주의 중국.
그곳에서 북한 유학생들과 건전한 교류가 가능했다고 한다.
그 시대 한국에선 결코 상상할 수 없었을 경험들.
쉽게 말하자면, 한국에서 영어를 배우고
레벨테스트로 스스로를 아무리 가늠해 본들 한국 내이다.
그런데, 원어민과 문화를 체험하는 격이 됐으니
당시 민주화 분위기에 큰 영향을 줬을만한
시대의 두 주축을 경험한 셈이었다.
그는 덤덤히 말한다.
이때 경험이 국내라면 결코 경험해 보지 못했을
사실들과 실체에 접근한 사유를
가능하게 해주는 경험이 돼 줬다고.
감시하는 북한, 못사는 중국.
헌데 한국에선 그 둘은 그냥 탐구의 대상.
책의 중간쯤에서 내제적 접근법이란 표현이 등장한다.
이는 북한을 북한의 눈으로 이해하고 바라보자는
풍조가 스민 한때의 학문적 처세였다 말하는데,
그 내제적 접근법이란 방법이 지닌 태생적 오류와
젊은 최진석이 중국에서 경험한 생생한 체험은
현실과 학문의 간극을 일맥상통 하듯 줄여주며
진실의 시야를 확대해 줬다고 느껴졌다.
사실이 아닌 걸 사실이라 따르기 위해
기준마저 바꿔야 한다면 그것은 가치가 없다했다.
내게 최진석은 노자를 가르치는 유명 철학자 정도였는데
이 책을 읽으며 보통의 철학자에게 느끼던
거리감도 줄면서 철학이란 학문도 다시 느껴보게 됐다.
어찌보면 완전히 맞지는 않겠지만
최진석과 또다른 철학자 김용옥의 의견은 완전 대척점처럼 보인다.
김용옥의 강연이나 이론들을 보면서는
철학이 마치 자기합리화의 고급과정 같다고 느꼈다면,
최진석을 통해서는 공감가능한 언어로 잘 정비한
시대가 필요로 하는 실사구시 같은 철학을 경험해 볼 수 있었다.
매우 귀히 여겨야 할 책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