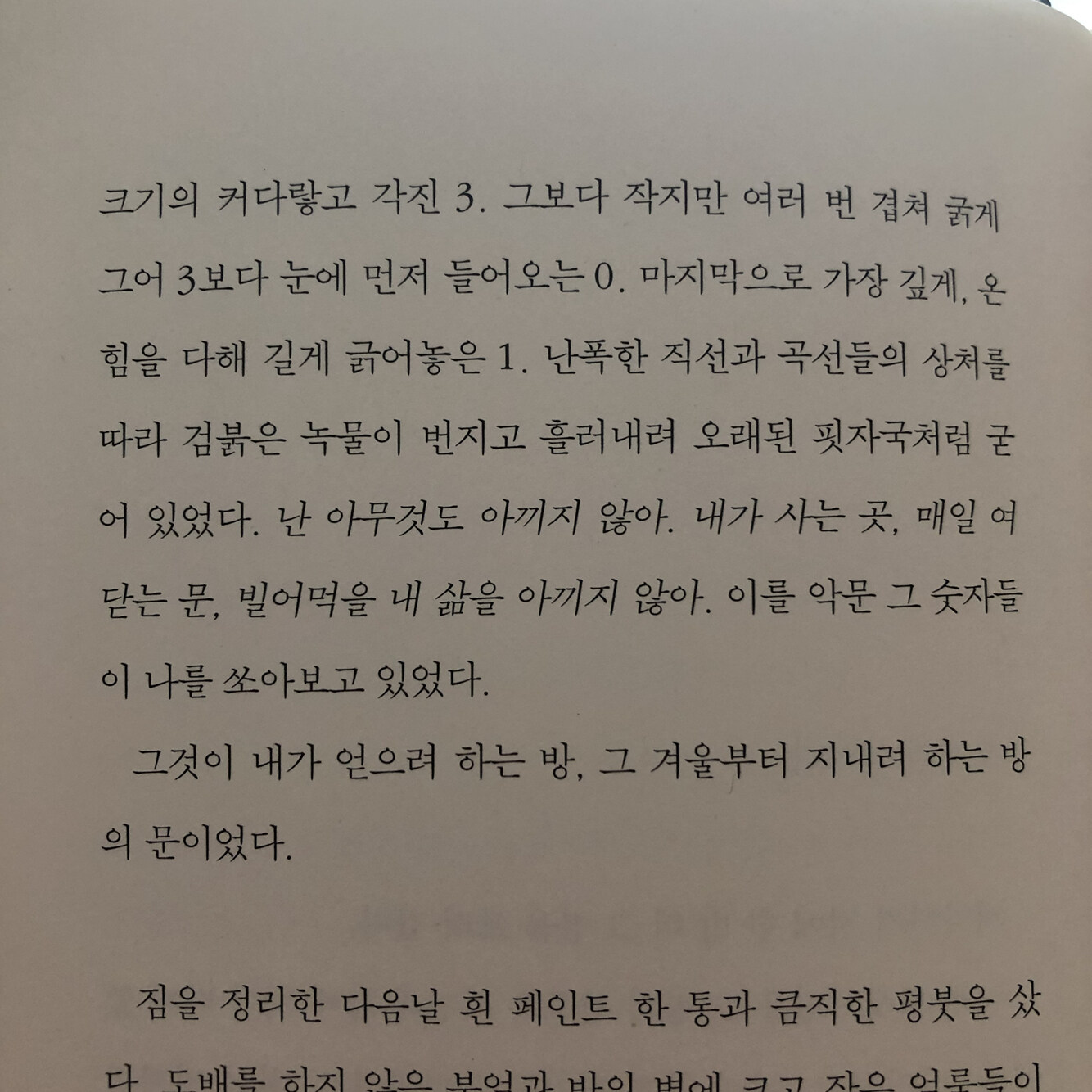겨울에 잘 어울리는 책이라 하면 떠오르는 몇 작품들이 있다.
한강의 흰은 눈에 대한 이미지를 꽤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그 안에 따뜻함이 느껴진다. 태어난 지 두 시간만에 흰 배냇옷이 수의가 된 자신의 언니, 자신이 가지고팠던 언니의 모습. 젊은 날의 어머니와 아버지. 깊고 난폭하게 파인 숫자와 같은 흔적들을 희게 덮는 페인트칠. 도시를 희게 덮어버리는 서리와 눈보라.
‘흰‘것은 ‘하얀‘것과는 다르다,고 작가의 말에 쓰여 있었다. 그렇게 보니 그런 것도 같았다. 희다는 말에는 뭔가 숭고함이 있다. (무게감이 있다.)
소설을 다 읽고 무심코 창 밖을 봤는데 눈이 내리고 있었다. 고개를 숙이고 걷는 행인의 모습이 꼭 갓 태어난 아기와 같은 웅크림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녀의 젊었던 어머니가 아기에게 읊조렸던 말 (‘죽지말라‘는)은 그 결말을 알기에 시리게 슬프고 아프지만 동시에 한없이 용기를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