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형식에 있어서도 그 이후의 많은 작가들에게 영향을 주었다. 이 책 역시 그 중 하나인데, 두 명의 저자들은 서문에서 이 책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의 영향을 받았음을 고백한다. 물론 편지라는 형식으로 중요한 신학적 주제를 전달하는 시초는 신약성경의 서신서를 비롯한 초기 교부들의 저작들에서도 발견되지만, 이쪽은 처음부터 특정한 목적을 갖고 가공의 편지를 썼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연속된 편지라는 형식을 통해 내용을 전달하는 것은 좀 더 개인적이고 내밀한 내용을 자연스럽게 풀어놓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어떤 사안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굳이 서론, 본론, 결론을 완벽하게 맞출 필요 없이 말하고자 하는 부분만 쑥 들어갈 수 있다는 (저자 입장에서의) 유익도 있으니, 이 장르적 특성을 잘만 사용한다면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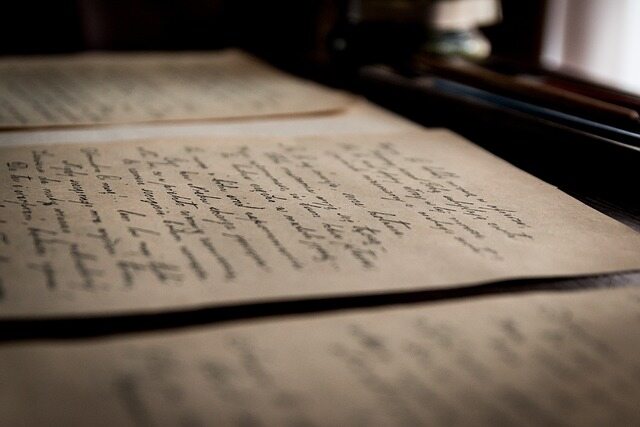
책은 팀 저니맨이라는 이름의 젊은이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의 친구인 우드슨 교수에게 받은 편지를 모았다는 설정이다. 실제로 주고받은 편지는 아니고 발신자와 수신자 모두 가공의 인물인데, 편지를 보낸 우드슨은 카슨과 우드브리지라는 두 저자의 이름을 합친 것이다.
저니맨은 프린스턴에서 공부를 하고 금융계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점차 기독교에 흥미를 갖게 되고, 나중에는 목회자가 되기 위한 공부를 트리니티와 예일에서 마치고 한 교회에 부임하게 된다. 내용상 십수 년에 걸친 팀의 이 믿음의 여정에서 우드슨은 그에게 필요한 조언을 정성스럽게 편지로 쓴다.
책 초반은 기독교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젊은이에게 구원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기독교가 갖는 독특성과 그 내부의 미묘한 문제들에 관한 내용이고, 후반은 본격적으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에 임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목회적 조언들이 주로 담겨 있다.
사실 두 파트 모두 읽을 만한 내용으로 잔뜩 채워져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후반부의 내용이 더 깊이 와 닿는다(전공을 속일 수 없는 것인지). 저자의 입장은 대체로 안정적인 보수적 관점을 취한다. 특히 에큐메니컬 운동이라든지 자유주의적 신학연구에 대한 경계 같은 부분에서 이런 면이 잘 드러나는데, 그렇다고 무턱대고 전통만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대신 얄팍한 면이 있는 현대 신학의 여러 사조들의 문제점을 제대로 짚어내는 식이라 읽어볼 만한다.

교회에서 전임사역자로 일하고자 하는 신학생들이나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이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다. 일단 그 즈음에는 뭘 어떤 걸 읽어야 하고, 문제를 어떤 식으로 다루어야 하는지 큰 프레임이 필요한 법인데, 이 책이 그 부분에 대단히 좋은 조언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루이스의 글에 비해 유머러스한 부분이 좀 부족한 게 아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