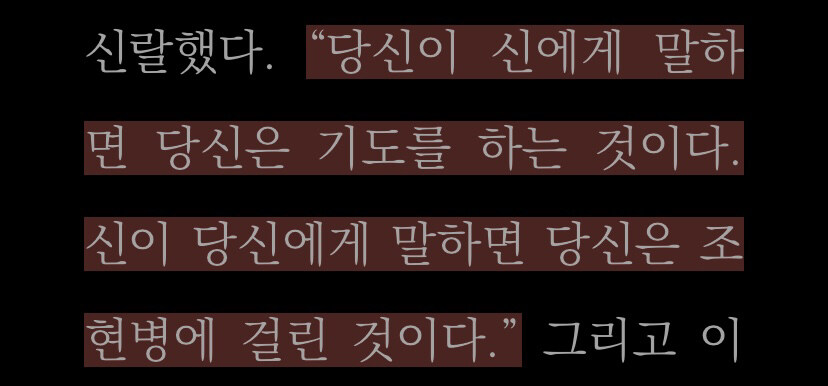우선, 이 책을 절대로 쓰지 않겠다고 자신과 약속을 한 이유를 굳이 시간을 가지고 깊게 생각하지 않아도 알 정도로 슬픈 마음을 애써 움켜잡고서 책을 한 글자 한 글자 써 내려갔을 저자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다.
예전부터 궁금했었던 수많은 정신과 의사들이 받기 꺼려하고 힘들어한다는 조현병 환자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책을 읽기 시작했다.
완치가 애초에 현대 의학 기술로는 아직 불가능하다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에 어두운 내용의 책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읽었는데도 그 예상보다 훨씬 더 어두운 내용이라
숙연해짐과 동시에 정상인의 정신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축복받을 만한 일인지까지 생각을 하게 될 정도였다.
중간중간에 두 아들 얘기에서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에게
어떤 케어를 해줬는지에 대한 역사적 사례들이 왔다 갔다 해서
흐름이 좀 끊기는 감이 있었지만, 디테일한 상황 묘사에
다시 깊은 몰입을 하게 되는 책이었다.
희망적으로 정신이 맑아졌다가 다시 재발하고,
입원했다가 퇴원하고를 반복하는 걸 옆에서 지켜보는 입장이 어떨지는 약간의 가늠만 할 수 있을 정도지만 그것만으로도
읽는 내내 끝없는 우울한 긴 터널을 저자를 따라 걷는 느낌이었다.
차라리 이게 소설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