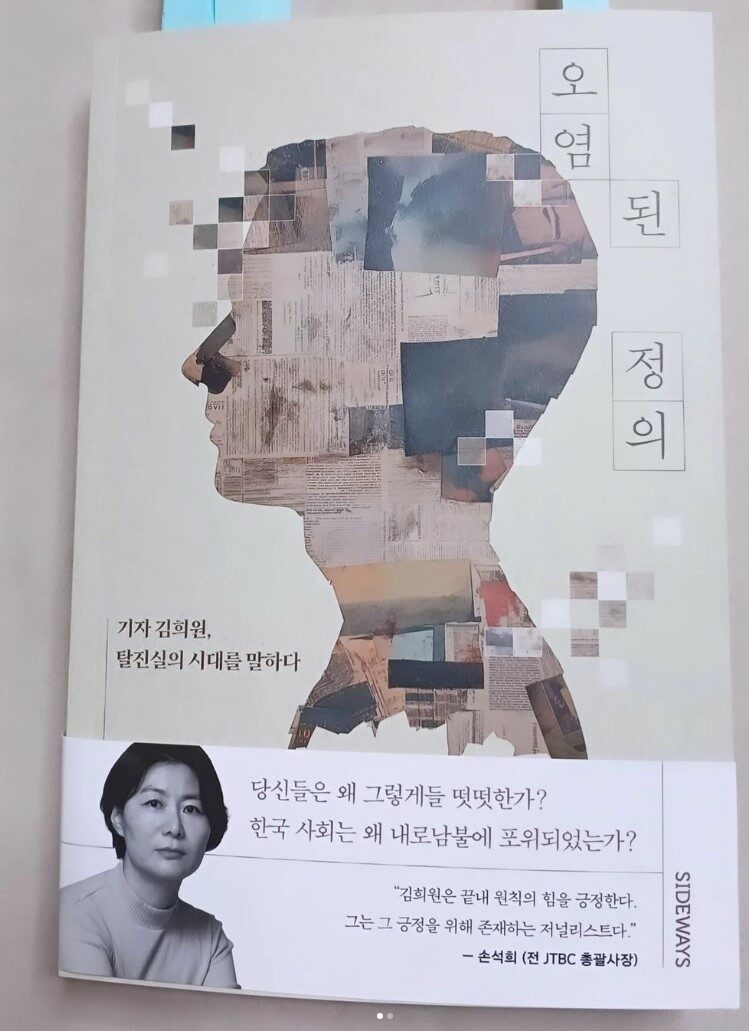
💡정의가 너무 많아 숨이 막혔다
사람은 보통 공기가 모자라면 숨이 가빠진다.
그런데 이 책을 읽는 동안 내가 숨 막힌 이유는 공기가 아니라 정의였다.
너무 많았다.
여기저기 정의라는 이름이 붙어 있었다.
정치인들의 정의, 언론의 정의, 평범한 시민들의 정의.
이 많은 정의가 서로 싸우는 광경이 어찌나 답답하던지.
저자는 이런 정의의 홍수를 직시한다.
그는 정치인의 거짓 정의를 폭로하고, 언론의 타락을 비판하며,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조차도 자신의 정의로 타인을 재단하는 모습을 날카롭게 파헤친다.
읽다 보면 뜨끔하다.
누군가의 잘못을 비판하며 내 행동을 정당화했던 순간이 떠오른다.
책은 그런 나에게 질문을 던진다.
"너도 그 정의의 일부였던 거 아니야?"
저자의 질문은 타인의 위선을 지적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우리 각자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만든다.
💡진실이란 놈은 왜 이렇게 뒷북을 치는 걸까?
진실은 항상 뒤늦게 온다.
그리고 그때쯤이면 이미 상처는 깊이 패여 있다.
저자는 언론의 비겁함과 무책임함을 조목조목 짚어가며 이 진실의 지체 현상을 이야기한다.
기자들이 "다들 그렇게 썼으니까" 라며 변명하는 모습은 이 책에서 가장 속이 터지는 부분 중 하나다.
하지만 그런 모습을 비난하며 속 시원해하기도 전에, 나는 또 다시 이 책의 질문과 마주하게 된다.
"당신은 진실을 외면한 적이 없었나?"
이 질문이 불편하게 다가왔다.
일상에서 진실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순간들이 떠올랐다.
진실을 추구한다는 것은 단순히 사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책임지는 일이라는 걸 이 책은 묵직하게 던지고 있다.
💡우리는 얼마나 쉽게 책임을 미루는가
책을 읽다 보면 책임이라는 단어가 무겁게 느껴진다.
저자는 정교한 문장으로 우리의 무책임한 태도를 날카롭게 비판한다.
정치인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언론인들이 기사의 파장을 외면하며, 시민들조차도 쉽게 남 탓을 한다.
그리고 그 책임의 빈자리는 어김없이 혼란과 불신으로 채워진다.
책이 던지는 질문 중 가장 뼈아픈 것은 "나 자신은 과연 어떤 책임을 졌는가?" 라는 것이다.
우리는 때때로 책임지지 않는 것이 훨씬 쉬운 선택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저자는 책임을 회피하는 순간이 결국 모두의 무거운 짐이 된다고 경고한다.
💡결국, 더 나은 선택은 가능하다
책을 덮으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쌓였는데, 정말 답이 있을까?
저자는 답을 제시하기보다, 우리에게 더 나은 선택을 위한 가능성을 열어둔다.
그는 정의와 진실이 오염된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 나은 선택을 한다는 건 완벽한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거창한 계획이 아니다.
그것은 작은 질문을 던지고, 불편함을 외면하지 않으며, 책임질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것이다.
이 책은 그러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설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