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증나니까 퇴근하겠다는 이 제목을 보고 마음이 동하지 않을 직장인이 몇이나 있을까. 나도 처음에는 제목에 이끌려 책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스페인령 카나리아제도에 사는 90년대생 인턴 메리엠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 책은, 이름과 지명을 바꾸면 우리나라의 어느 회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담을 글이라고 해도 전혀 위화감이 없는 내용을 그려내고 있다. 지금 사회초년생이거나, 사회초년생 시절을 겪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하며 읽을 수 있는 이야기였고, 나도 주인공과의 여러 공통점들을 발견해가며 재미있게 읽었다. 그동안 퇴근보다 퇴사를 선택할 때가 많았던 나는 사회초년생인데도 나보다 훨씬 단단한 마음으로 사회생활을 하는 메리엠의 모습을 보고 반성을 하기도 했다. 무려 500쪽이 넘어서 처음에는 살짝 멈칫했지만, 웃기도 하고 같이 열을 내기도 하다 보니 눈 깜짝할 새 이야기가 끝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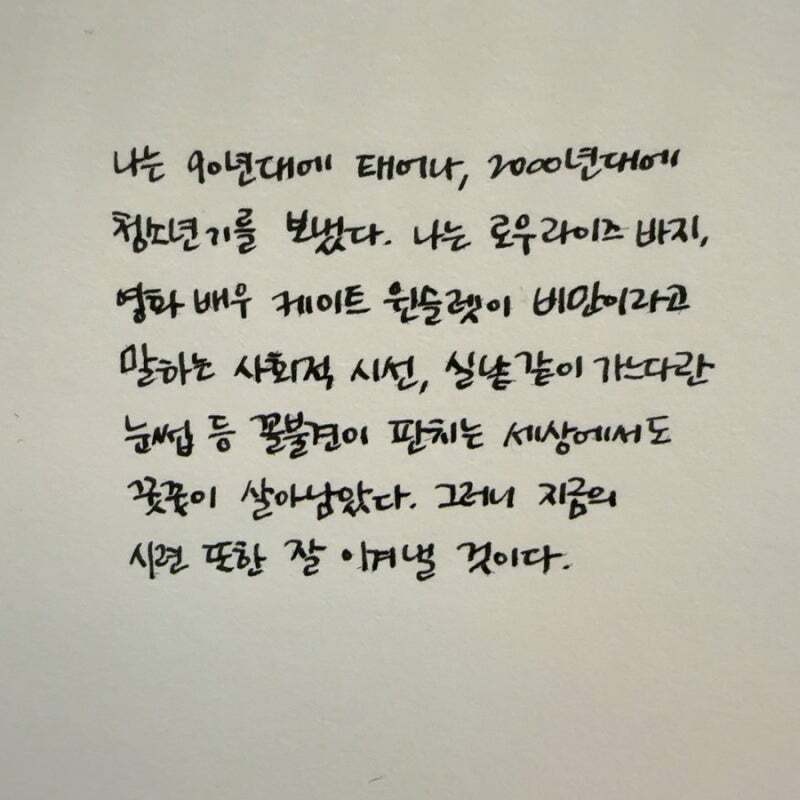
사회초년생의 사회생활이 거의 그렇듯 메리엠의 인턴 생활도 만만치 않은 일들로 가득차 있다. 읽는 동안 도대체 나라도 다르고 회사도 다른데 진상 유형은 어쩌면 이렇게 비슷한가 놀랍기도 하고 진저리가 나기도 했다. 어딘가에 숨어서 울기도 하고 화를 주체하지 못할 때도 더러 있지만 ‘지금의 시련 또한 잘 이겨낼 것’이라는 메리엠의 기본적인 태도가 든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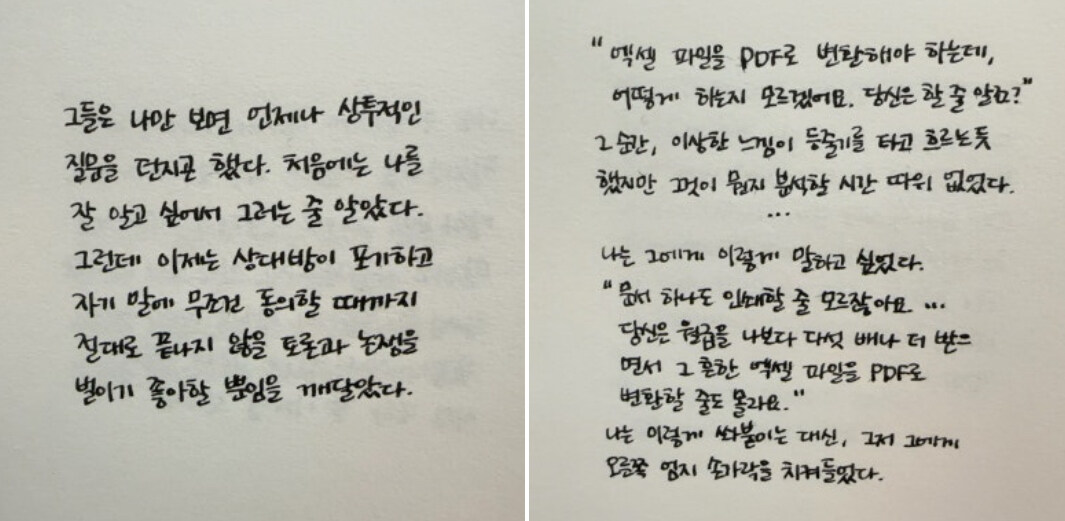
메리엠을 제일 지독하게 괴롭히는 상사인 욜란다는 차라리 그 괴롭힘이 너무 1차원적이라서 오히려 읽는 입장에서는 좀 덜 괴로웠고, 점잖은 척하면서 은근히 사람 피를 말리는 다른 상사들의 이야기가 나한테는 더 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너무 심할 때는 회사 구석에 숨어서 울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무던한 태도로 상황을 돌파해나가는 모습이 때로는 짠하고 때로는 멋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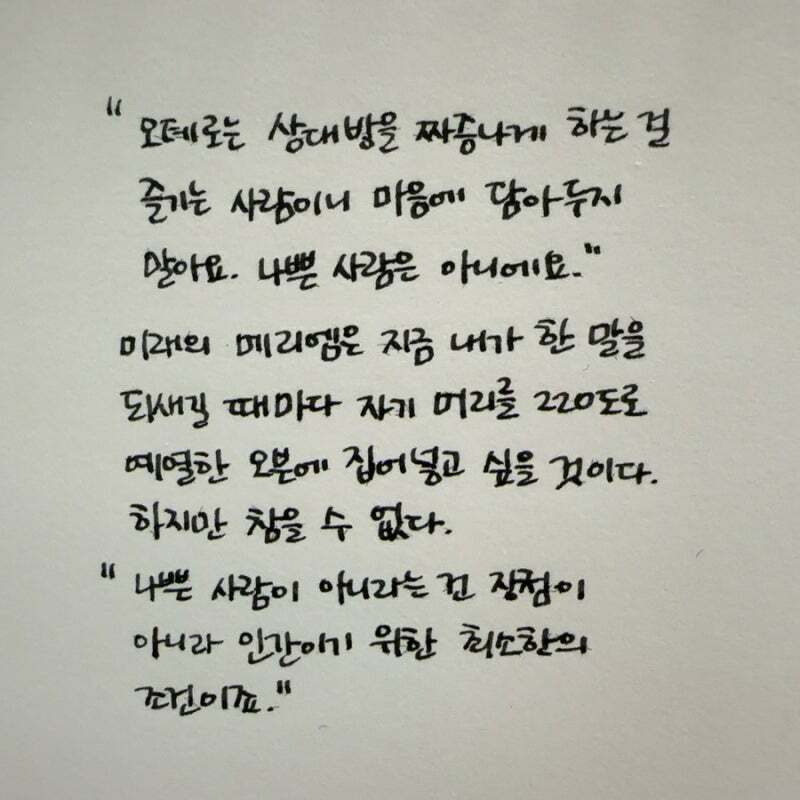
몇 번을 다시 읽어도 이해가 안 가던 문장. 상대방을 짜증나게 하는 걸 즐기는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게 사회적 약속 아니었던가요...? 저렇게 점잖게 대응해놓고 220도 오븐에 머리를 넣고 싶다는 메리엠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 소리를 들었으면 나쁜 사람 맞다고 패악을 부렸을 나는 1000도짜리 도자기 불가마에 들어가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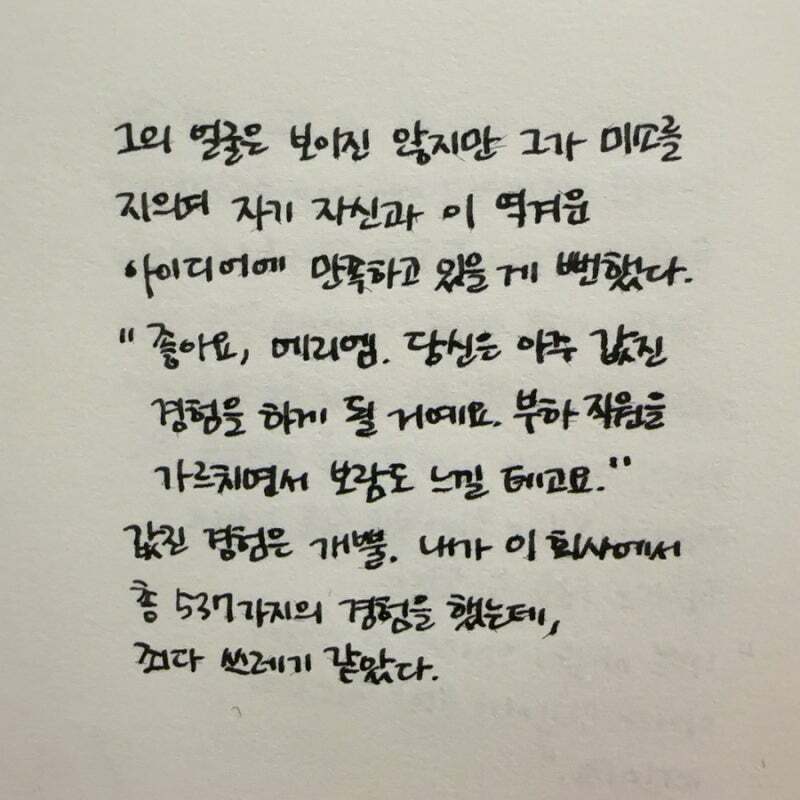
이것도 위에서 헛소리했던 상사가 했던 말인데, 매사에 저런 식으로 점잖고 매너 있게 사람을 긁는다. 차라리 대놓고 괴롭히는 욜란다는 여차하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라도 할 수 있는데, 저런 유형은 답이 없어서 더 환장하게 만든다. 메리엠이 저 회사에서 인턴으로 시작해 계약직을 거쳐 정직원이 됐다는 게 생각할 수록 너무 대단하게 느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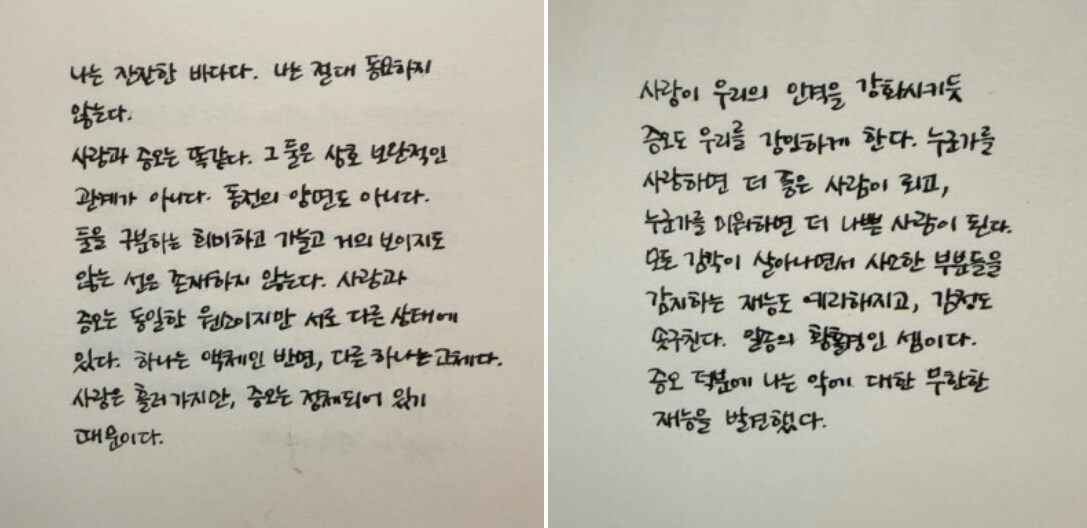
만만치 않은 회사 생활을 하는 동안 메리엠이 점점 철학자 같아지는 걸 보면서 웃기도 많이 웃었지만 짠하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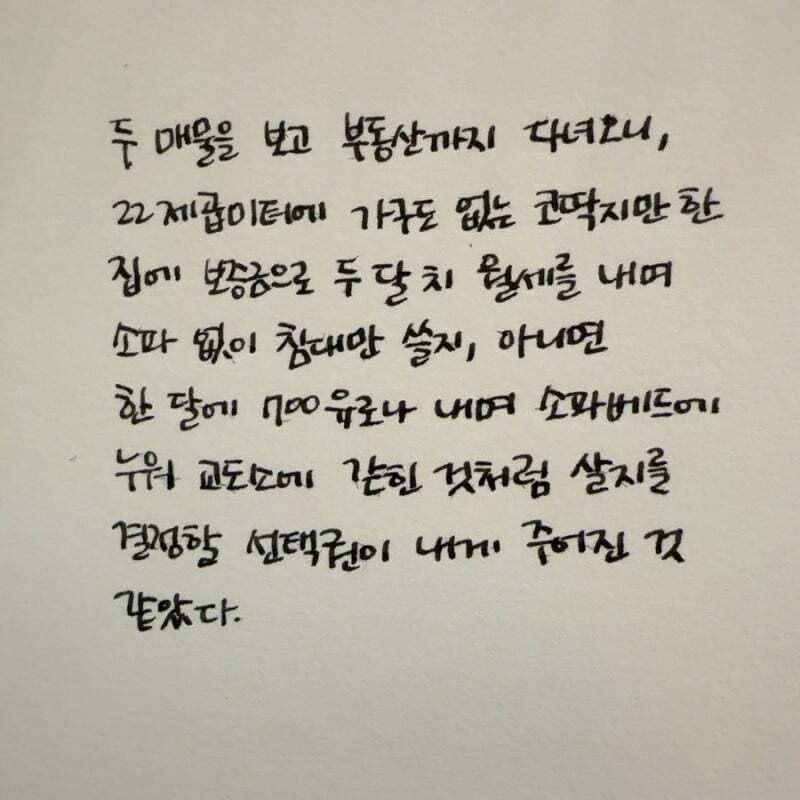
화폐 단위가 아니었으면 서울의 상황이라고 해도 전혀 위화감이 없을 이야기였다. 저 동네도 닭장같은 집을 비싸게 세놓는 건 똑같다는 생각에 씁쓸했다. 집과 직장이 멀어서 통근을 버거워하는 메리엠의 이야기를 읽으며, 사회초년생 시절 경기 남부에서 서울 북부로 통근을 하던 생각이 나서 약간 ptsd 오는 느낌이었다. 메리엠은 그래도 1호선은 안 탔잖아... 출근할 때 1호선 광인들까지 겪었으면 책이 700쪽으로 늘어났을 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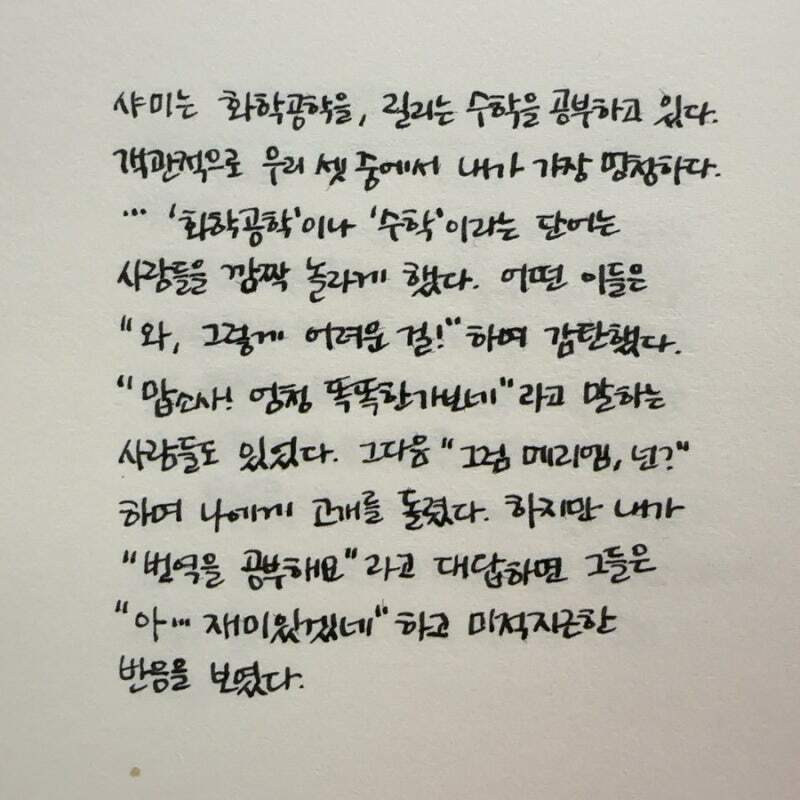
주인공 메리엠과 나는 공통점이 상당히 많았는데, 형제들 이야기를 읽으면서도 왠지 모를 동질감을 느꼈다. 더 똑똑한 동생들을 둬서 자랑스러운 한편 아주 가끔 머쓱해지는 심정도, 이과 집안에서 혼자 문과인 문송한 기분도 잘 알아서 왠지 모르게 더 응원하는 마음으로 읽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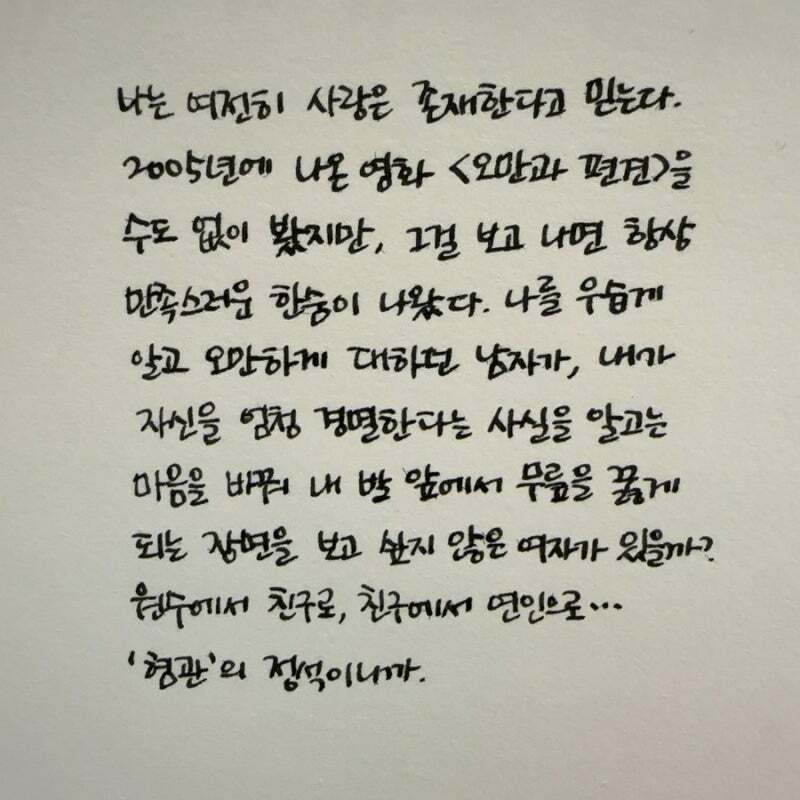
메리엠과 나 사이에 공통점만 있는 건 아니고 다른 점도 있었다. 혐관을 좋아하는 건 비슷했지만, 취향 판독 3대장인 ‘제인에어, 폭풍의 언덕, 오만과 편견’ 중에 메리엠은 오만과 편견 파였던 것. 폭풍의 언덕 돌잡이파인 나는 여기서 메리엠과 취향 차이를 느끼는 한편, 메리엠에게 미친 사람들의 매운맛 혐관도 한번 슬쩍 권해보고 싶었다. 책에서 본 말투나 개그코드를 보면 폭풍의 언덕도 좋아할 것 같은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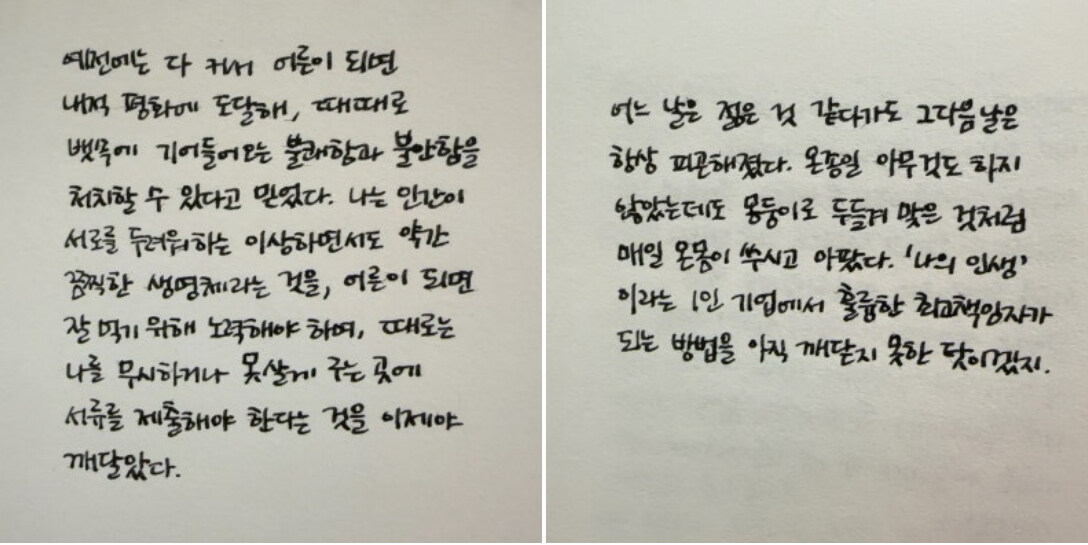
나도 내적 평화에 도달하지 못한 어른이고, ‘나의 인생’이라는 1인 기업에서 훌륭한 최고책임자가 되지 못한 사람이라서 그런지 이 부분이 마음에 와닿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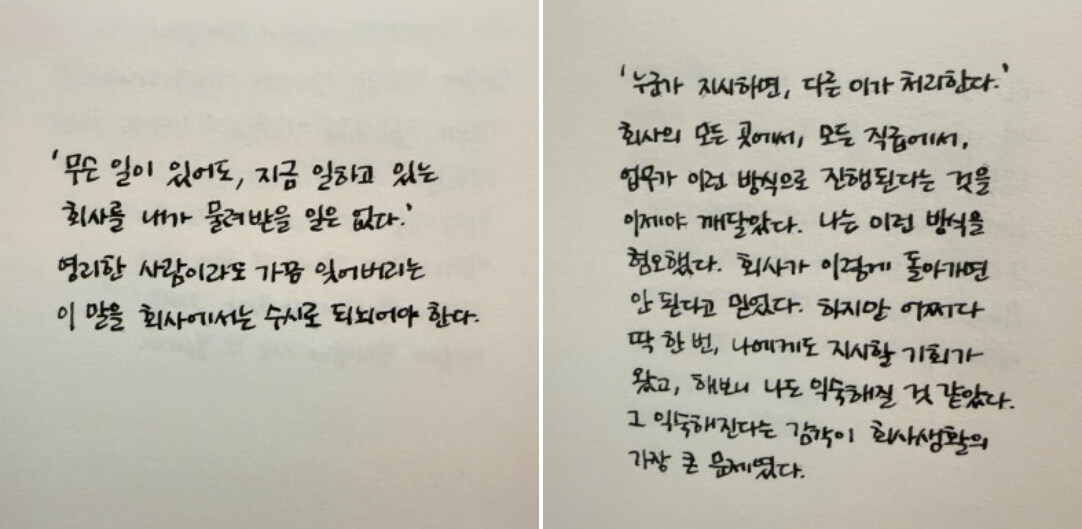
인턴을 막 시작했을 때 ‘무슨 일이 있어도, 지금 일하고 있는 회사를 내가 물려받을 일은 없다’고 되뇌던 메리엠이 계약직을 거쳐 정직원이 되었을 때 깨달은 ‘누군가 지시하면, 다른 이가 처리한다’는 진리가 나에게도 씁쓸하게 느껴졌다. 부당하다고 생각했던 일에 나도 모르게 익숙해진다는 감각이 큰 문제라는 것에 깊이 공감하면서 읽었다.
솔직히 다 읽을 때까지 이 책이 소설 카테고리에 들어가는 줄 몰랐다. 사실 책을 다 읽은 지금도 에세이인지 소설인지 헷갈리는데, 경험을 바탕으로 한 소설이라고 혼자서 정리했다. 책을 읽는 동안 결은 조금 다르지만 소설 <일의 기쁨과 슬픔>과 <언러키 스타트업>이 종종 떠올랐다. 어느 나라에서 어떤 회사에 다니든 먹고 사는 일은 만만치 않다는 걸, 그 만만치 않은 일을 이렇게 유쾌하게 그려낼 수 있는 사람들도 많다는 걸 새삼 느꼈다. 메리엠은 질색할지도 모르지만, 언젠가 관리자가 된 메리엠의 글도 읽고 싶다.
*출판사에서 책을 제공받아 읽고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