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에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를 읽고 나서 책을 읽는 중에 전쟁이 일어났다는 걸 믿을 수 없다고 리뷰를 남겼다. 더불어 전쟁을 겪은 사람들의 기억과 진술을 담은 생생한 이야기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끔찍했다는 것도 기억이 난다. 한편으로 그 귀중한 자료들로 에세이가 아닌 소설을 쓴다면 어떤 내용을 담을 수 있을까 궁금했다. 기존의 전쟁문학과는 또 다른 느낌의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었다.
이번에 소설 ‘기억의 기억들’을 읽으면서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았다’ 생각이 여러 번 났다. 러시아라는 공통 요소가 있기도 했고, 소설 속 화자가 남겨진 기록들을 찾아 탐구하면서 가족사를 써나가는 이야기라서 그랬는지도 모르겠다. 분명히 소설인데도 소설 속 화자가 작가 자신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야기는 픽션과 논픽션 사이 어딘가에 있는 느낌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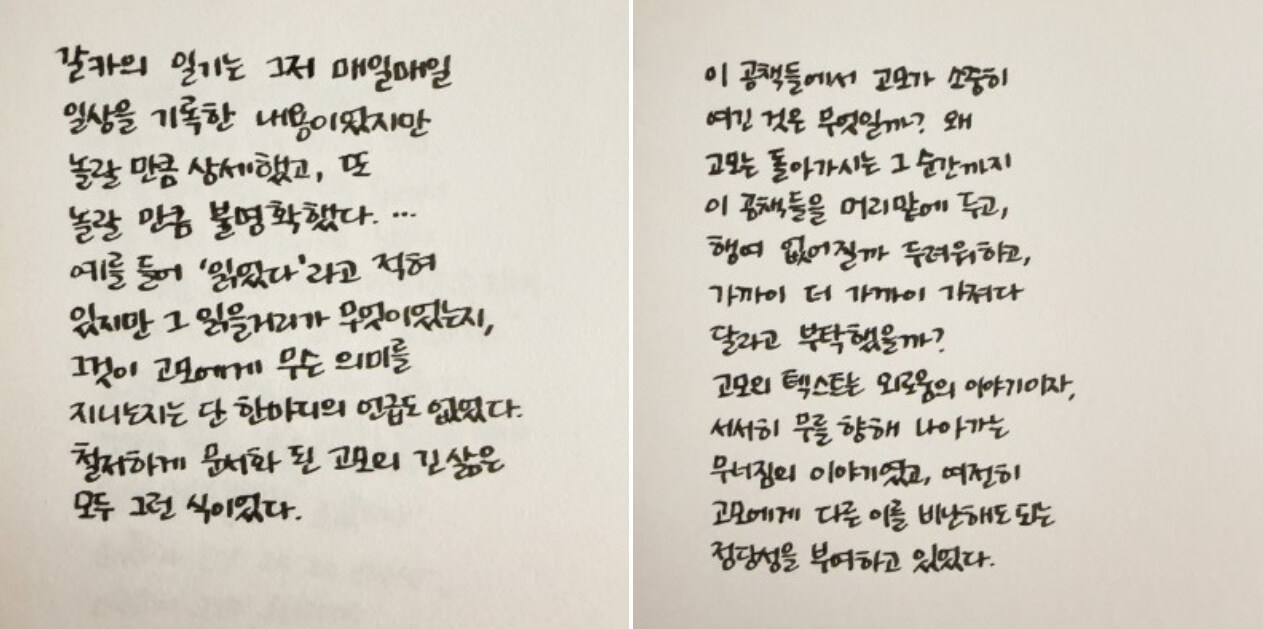
소설은 갈카 고모의 죽음에서 시작된다. 고모가 남긴 ‘상세하지만 불명확’한 기록이 ‘나’에게 가족의 이야기를 쓸 계기가 되는데, 이후로 무려 5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이야기가 펼쳐진다. 낯선 러시아 이름을 가진 등장 인물이 많아서 메모를 해가며 읽었는데, 책의 맨 뒤에 친절하게 가계도가 있어서 나중에는 가계도를 확인해가며 읽었다.

책을 읽으면서도 읽고 나서도 계속 이 부분을 의식하고 고민하게 되었다. 지극히 개인적인 누군가의 기억이 기록으로 남겨지고, 그 기록이 객관성을 꿈꾸는 역사의 일부가 되어가는 과정을 책을 읽는 동안 함께 지켜본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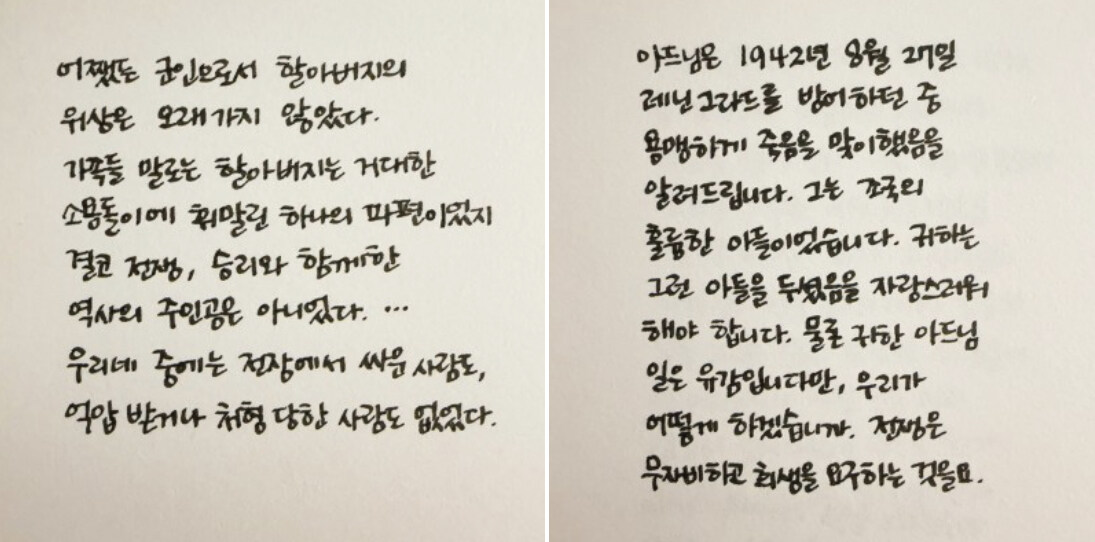
5대에 걸친 가족사를 돌아보는 동안 당연하지만 전쟁 이야기도 있었다. 그중 전쟁으로 아들을 잃은 사람에게 도착한 전사통지와 설명을 요구하는 가족에게 도착한 또 다른 편지를 읽으면서 참담했다. 아직도 전쟁 중인 곳에서 누군가는 저렇게 억장 무너지고 어처구니 없는 통지를 받고 있겠다는 게, 그리고 1942년에 전쟁 중이었던 나라가 현재도 전쟁 중이라는 게 안타까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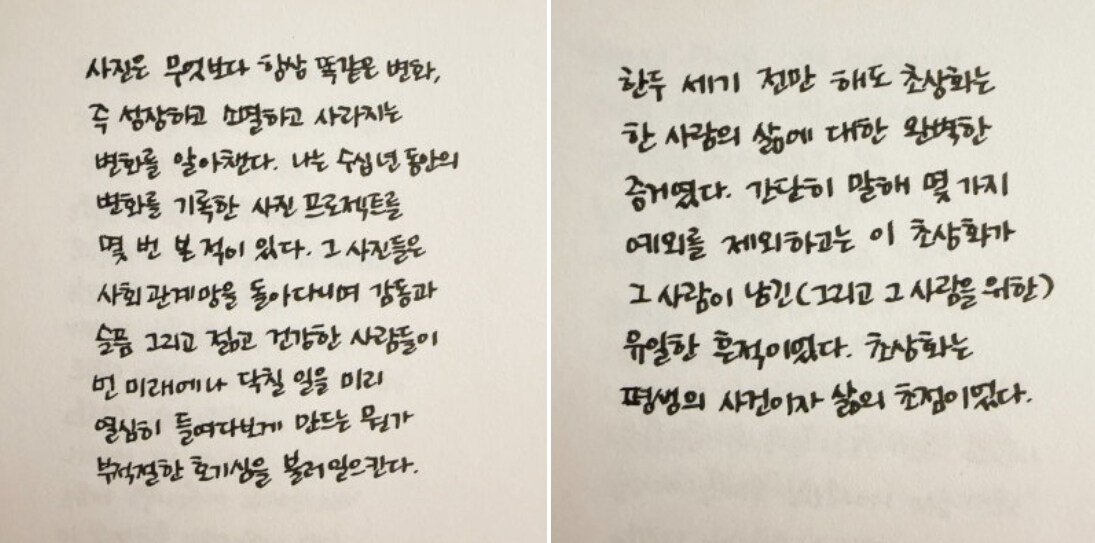
소설 속 ‘나’는 가족이 남긴 여러 기록들을 더듬어가며 가족사를 써내려간다. 그 기록들은 일기, 편지, 사진 등 종류가 다양하다. 읽다가 사진과 초상화에 대한 이야기가 흥미롭고 인상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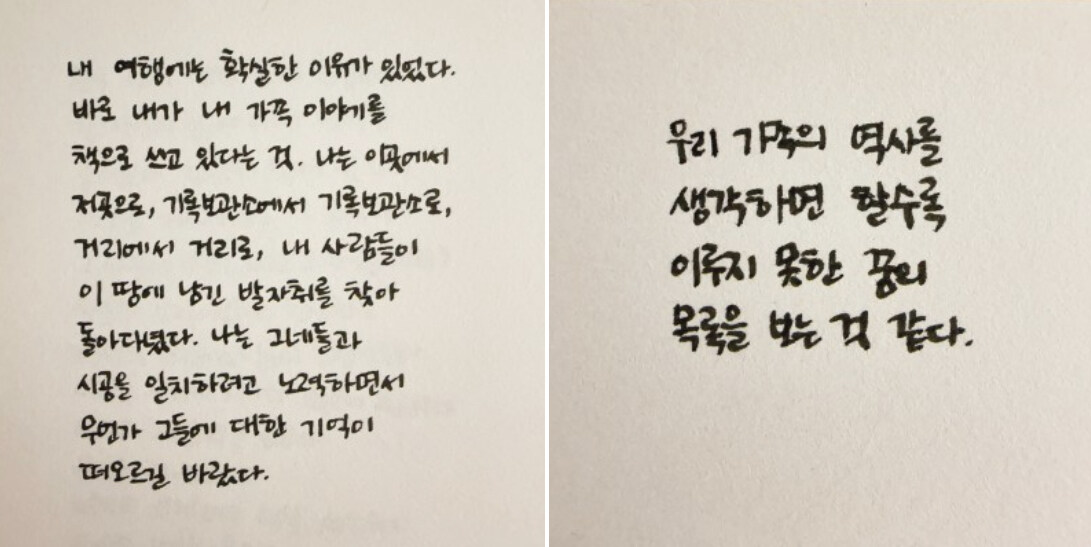
발로 뛰어가며 여러 기록들을 찾아서 글을 써나가던 화자가 남긴 ‘우리 가족의 역사를 생각하면 할수록 이루지 못한 꿈의 목록을 보는 것 같다’는 말이 안타깝지만 그 가족사를 너무 잘 요약한 문장이라서 마음에 인상적으로 남았다.
이 책은 가볍게 쓱 읽을 수 있는 책은 아니었다. 주제 자체도 가볍지 않았고 문장도 여러 번 곱씹어 볼 부분이 많았다. 그리고 낯선 러시아 이름들이 많이 나오기도 했고 누가 이 집안의 몇대째 인물인지 집중하면서 읽었다. 우리나라 영화 ‘국제시장’에서는 3-4대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현대사의 굵직한 사건들을 담고 있다. 이 책에서도 러시아 현대사에서의 굵직한 사건들이 언급되는데 알고 있는 것도 있고 낯선 것도 있어서 중간중간 찾아가며 읽었더니 더 흥미로웠다.
2022년에 시작된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 사이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되었다. 뉴스와 신문의 전쟁 기사로는 알 수 없는, 직접 전쟁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기억과 기록이 언젠가 다시 이런 형태로 세상에 나오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착잡했다. 누군가의 가족사, 나아가 현대사에서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안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