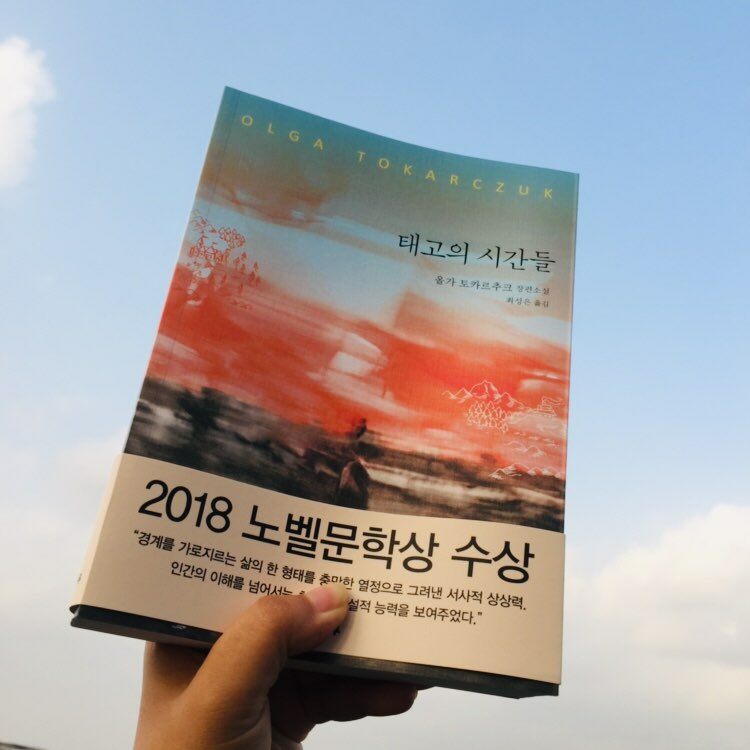
<웰컴 투 동막골>을 본 기억이 있다. 주된 서사들을 많이 잊어버렸지만 많은 사람이 명장면으로 뽑는 ‘팝콘씬’만은 생생하게 기억난다. 수류탄의 불로 달궈진 옥수수들이 하얀 꽃처럼 날아오르고, 마을의 미친년 여일이가 말갛게 웃는다. 치열한 전쟁 속에서 어디에 아름다움이 있는가, 생각해보게 하는 장면이다. 이 질문은 이렇게 변주될 수도 있겠다. 치열한 생 속에 아름다움은 있는가? 이 소설은 거칠고 잔인했던 2차 세계대전의 최전선, 폴란드의 이야기를 한편의 동화처럼 그려낸다. 그렇게 함으로서 소설은 무구함만으로 비극을 재구축 한다.
이 소설은 신화의 장소같은 ‘태고’를 소개하는 데에 책의 반을 할애한다. 인상 깊은 점은 이 태고를 서술하는 데 있어서 여러 존재의 눈을 빌린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 소설 전반의 태도이기도 한데) 인간과 인간이 아닌 것들의 입장과 위치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글 전반에 흐르고 있는 동화적인 풍경들과 달리 순간순간 차갑고 서늘한 깨달음을 전해준다.
책장이 반쯤 넘어가면 이야기는 반전된다. 1939년, 태고의 동화적 순간들은 2차 세계대전이라는 현실의 침입을 받는다. 그러나 이 소설은 여전히 개체의 목소리로 이야기를 전개하는 태도를 견지한다. 그렇기에 이 책을 읽는 것은 세계대전의 고통을 읽어내는 이왕의 고통스럽고 잔인한 독서 경험이 아니게 된다. 세계 대전의 고통을 묘사한 작품, 혹은 그 속의 인간 존엄이나 인간의 삶에 대한 작품은 이미 있었지만, 이 작품은 그것을 뛰어넘어 새로운 경지를 보여준다. 즉, 무참한 삶의 현장 속에서 ‘나는 여전히 어딘가에 존재한다(211p)’는 것을 슬프도록 절절하게 깨닫게 한다. 타인을, 사물을, 심지어 신을 화자로 한 다성적인 목소리가 만들어낸 신화의 숲 사이사이를 거닐다보면 그 슬픔은 사물에게로, 시간과 공간에게로 전이되고, 그렇게 연민은 탄생한다.
이 소설은 폴란드라는 아주 특수한 공간과 2차 세계 대전을 전후로 한 시간을 모티프로 만들어졌지만, 모든 좋은 소설이 그렇듯 특수에 머물지 않고 보편으로 나아간다. 세계대전이 끝남과 함께 이전의 세계는 망가진다. 그 시대의 원칙과 원리는 더 이상 통용되지 않고, 실제 세계에는 자본주의가 침투한다. 그 속에서 인간은 새로운 규칙들을 만들고 중구난방의 이야기를 만들며 제 멋대로 시간과 공간을 재배열-재해석 한다. 요컨대 이것이 ‘모던’이다. 이 소설은 모던을 겪어낸 모두가, 그러니까 우리들이 마주한 세계에 대한 비밀스런 성찰을 보여준다.
이 소설을 공간과 시간의 교차점으로 읽어보는 시도도 좋을 것 같다. 다수의 시간으로 구성된 챕터가 모여가며 하나의 형상을 이루는 것은 존재론과 인식론의 논의를 상기시키며, 한편으로는 발터 벤야민의 파편과 형세를 구현한 작품처럼 여겨지기도 한다. 이 소설을 신과 인간, 전쟁에 대한 챕터로 나눌 수 있고, 혹은 태고의 사람들, 모호한 꿈의 세계에서 게임을 계속하는 상속자 포피엘스키의 이야기와 게임의 시간, 신과 수호 전령을 포함한 인간 밖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로 나눠볼 수도 있다. 전쟁의 역사, 인간의 삶, 신학의 영역으로도 나눠볼 수 있다.(이 구분은 임의적이지만, 어쨌거나 이 세가지 지류가 촘촘히 엮인 구성물이라는 점은 정말 놀랍고 특기할만한 부분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더 어려운 성찰을 대신하여 ‘연민’으로 이 작품을 설명하고 싶다. 아름다움을 찾기 위해서는 연민해야한다. 우화와 신화의 세계가 그러하듯 단단하게 연민할 것. 그런 마음으로 이 작품 앞에 서면 우리의 영혼을 울릴 태고의 질문들이 우리를 향해 쏟아져 내려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