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대한 것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었지만
40년 전 소설이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 몰입도가 상당한 소설이었다.
초반부의 궁금증과 몰입감이 후반부로 갈수록 살짝 느슨해지고
스릴과 서스펜스라기에는 내용의 연결고리가 탄탄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가지 복합적인 장르들이 적절하게 혼합되어 있어 그 부분은 크게 신경쓰이지 않았다.
지루하지 않으면서도 복잡하게 머리 쓸 일이 없으며 사건은 계속 이어지는
'페이지터너'로서의 역할에 충실한 소설이라고나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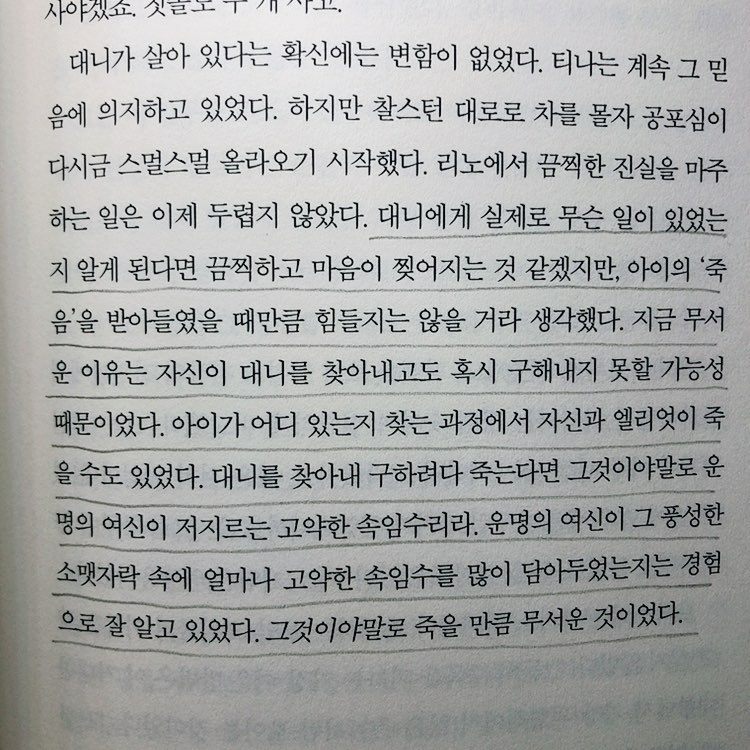
작품 속 우한-400 바이러스와 지금의 코로나는 그 발생과 전파 과정이 엄연히 다르지만
40년이 지난 지금 우연히 겹친 것 치고는 상당한 놀라움을 준다.
아마도 이 책이 40년이 지난 지금 역주행하는데 그 부분이 큰 영향을 주지 않았나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