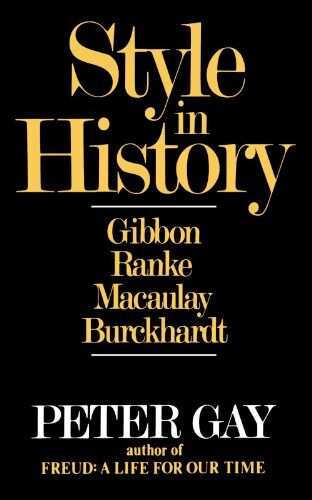
철학이 고통인 게 맞구나 실감한 건
요즘 니체 읽는 동안 같이 피터 게이도 읽으면서였다.
철학하기 좋은 나이라고 플라톤 <국가>에도 나온다는 나이, (.... <국가>는 언제 읽은 책이 됨?
읽은 것도 읽지 않은 것도 아닌 <국가>), 35세라던가 그 나이 즈음에 나는 철학책들 읽기 시작했고
재미있었다.
책으로 제일 재미있는 건 철학이지 않나 쪽으로
이젠 이미 오래 살아왔는데 (오래라 해서 그게 또 그 세월 동안 많이 읽은 것도 아님을 문득
기억해야 하고)
아무튼 그랬다 보니 잊고 있었다.
재미라 여겨지고 체험되는 것의 아마 한 70%는 고통이었을.
피터 게이의 <계몽시대>.
이 책은 어떻게 규정해야 이 책의 강도, 분위기, 범위 등이
한 번에 포착될 수 있을까. 막 대단히 엄청난, 다른 세계가 열리고 (그렇다 보니 지금까지 알던 세계에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그런 책은 아니다. 계몽시대 주제로 이 세상에서 만날 수 있는 최상의 과외교사? 이런 느낌 있다. 저게 칭송일 수 있다면. 친절하고 다감하고 정확하고 모르는 게 없고 등등의 느낌.
그리고 또 스타일이 있다.
에릭 홉스봄의 역사책들을 나는 도저히 읽을 수 없었는데
무엇보다 홉스봄의 <--의 시대> 연작엔, 스타일이 없다. 말들이 고생하는 책. 말들이
오직 일만 해야 하느라 고생하는 책. 홉스봄과 비교하면 게이의 책들에서, 말들은 춤도 추고
옷도 여러 번 화려하게 소박하게, 좋은 옷으로, 갈아 입고. 하여튼 그렇다. 읽는 재미가 있고
마음의 무거움이 걷힌다. 울면서 읽을 페이지라 해도.
그런데 철학책들은
심지어 니체의 책도, 그러지 않는다는 것. 그럴 수 없다는 것.
니체의 책에서 언어의 저런 면모라 알려져 있는 면모가 실은 저런 면모가 아니라는 것.
역사가의 스타일과 철학자의 스타일은 아주 다른 무엇이라는 것. 철학자의 스타일은 철학자의 문제의 ㅎㅎㅎㅎ
일부라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