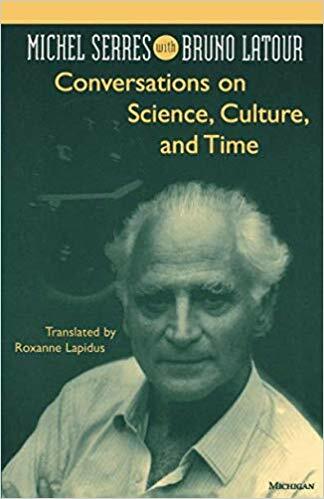
며칠 전 입수한 책.
대학원 시절에 대출해서 읽고 중요한 도움도 받았던 거 같은데
이제서야 가까이 두게 되었다. 미셸 세르는 최근 타계했다 (6월 초?).
"바슐라르 친구들의 연합" 이런 이름 프랑스 학회에 이메일 서비스 신청해서
뉴스레터 받아보는데 세르의 타계 후 온 소식에서: "그는 바슐라르의 지도 학생이었지만
과학을 과하게 이상화하는 바슐라르의 경향에 혐오감을 느끼며 바슐라르로부터 멀어져 갔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의 철학에 스며든 바슐라르의 영향을 감지한다" 이런 대목이 있었다. 멀어져 가는....
그 뒷모습을. 아무튼 웃겼던 대목. 이상주의 극혐. 취미 없음. 굿바이.
위의 책은 브루노 라투어와 나눈 대담을 기록한 책이어서
세르의 저술과는 거리가 있을 것이다. 그는 바슐라르 철학을 직접 비판하는 글을 쓰기도 했다.
"개혁과 일곱 개의 죄" 이런 제목. 라투어와 대담에서도, "이 정도면 바슐라르 입장도 들어보아야" 순간들이 있다.
거의 인신공격으로 향하는. 부당한 사감이 개입하는. 더 강력한 비판을 더 세련되고 공정하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러지 않았을까.
어렸을 땐 아니었던 거 같지만 지금은
바슐라르의 과한 이상주의를 극혐하는 세르 유형의 격한 반응들이, 그리고 그 때문에 생겨나는 긴장이 좋다.
도덕철학은 인류학과도 뗄 수 없는데
인간 본성을 어떻게 이해하냐에 따라 도덕철학의 내용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 이런 얘기 오늘 아침 들으면서
이 경우엔 그러니까, 인간 본성의 비관론자냐 (마키아벨리, 홉스) 아니면 낙관론자냐 (여긴 누가 속함?) 일단 이
두 그룹으로 나눠볼 수 있을 테지만
실은 낙관론과 비관론이 끝없이 충돌하는 전장 아닌가, 각 개인의 삶들이? 도덕철학이라는 학제로 갈 것도 없이?
그 전쟁을 계속 유지함이 (어느 쪽에든 완전히 지지 않음이), 그게 인생의 의미 아닌가?
같은 잡념이 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