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eBook] 지구만큼 슬펐다고 한다 ㅣ 문학동네 시인선 96
신철규 지음 / 문학동네 / 2017년 10월
평점 : 


부서진 사월 중에서
눈을 감으면 수면을 뚫고 수많은 소금 인형이 걸어나온다
데운 조약돌로 눈두덩을 지져도 사라지지 않는

페친인데 잘 알고 지내는 사이는 아니고 팟캐스트에서 그의 시가 소개된 건 몇 번 들은 적 있다.
시는 인상깊지 않았고 그 분이 말한 한 구절도 기억이 안 난다. 단지 드라큘라가 등장하는 게 인상적이었는데, 당시는 시집을 내셨을 때가 아니어서 언젠가 시집이 나오면 보려고 이름을 외웠다. 그러다보니 잘 잊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 시인의 시집을 봐선 안 되었다. 이유가 뭔진 모르지만 아마 이 분이 쓴 산문을 봐서가 아니었을까 싶다.
오늘 저녁 시집을 빌리러 가는 도중에 비가 왔다. 시집을 빌리러 왔는데 딱히 뭘 읽을거라 정해둔 게 없었다. 도서관이 문 닫기 직전이라 빨리 뭐라도 빌려야하는데 싶어 마음이 급했다. 아무거나 빌려야 비를 맞아가며 책을 빌리러 온 보람이 있을 것 같았다. 그런데 이 시인 이름이 보여서 일단 무조건 집어서 사서에게 건냈다. 그 때 시간이 도서관 문 닫기 1분 전이었다.
이 구절이 인상적인 건 우연찮게도 핸드폰이 고장나서이다. 충전단자가 고장나서 비만 오고 습기만 차면 계속 충전이 안 된다. 물기가 있다고 끊임없이 경고알람음이 울린다. 어떨 땐 가스불이나 토치를 켜서 충전단자를 지지면 물기감지경보가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할 때도 있었다. 그런데 이 시를 보니 상처받은 사람의 마음은 그 정도로도 경보음이 안 들린다거나 혹은 물기가 닦이지 않겠구나, 싶어서.
울 엄마 시집간다
해가 설핏 넘어갔는데도 우째 이리 눈이 부실꼬, 너그 고모들은 휴가 나왔으면 가만히 앉아서 쉬기나 할 요량이지, 저래 물에 들어가 나올 생각을 안 하니 내사 모를 일이다, 처녀 적에도 고디 잡으러 간다꼬 나서서 저물도록 집에 안 들어와 맘고생을 시키더만, 너그 할아부지는 큰애기들이 싸돌아댕긴다꼬 울매나 성화였는지, 하이고 물팍이 쑤시서 좀 앉아야 쓰것다, 하눌이 온통 단풍 들었구나
구야, 니 고디가 새끼를 우째 키우는지 아나, 고디는 지 뱃속에다 새끼를 키우는 기라, 새끼는 다 자랄 때꺼정 지 어미 속을 조금씩 갉아묵는다 안 카나, 그라모 지 어미 속은 텅 비게 되것제, 그 안으로 달이 차오르듯 물이 들어차면 조그만 물살에도 젼디지 못하고 동동 떠내려간다 안 카나, 연지곤지 찍힌 노을을 타고 말이다, 그제사 새끼들은 울 엄마 시집간다꼬 하염없이 울며 떼를 쓴다 안 카나, 울엄마시집간다꼬ㅡ, 울엄마시집간다꼬ㅡ

지금 읽어보니 뭔가 이름만큼 강렬한 인상이 남는 시들이 많은 듯하다. 뭔가 더 인상에 깊이 남으라는 의도인지 할머니의 말을 그대로 시에 써넣은 것 같은데, 위에 적은 시 빼고는 그닥 재미있는 건 없었다. 쓰는 의미는 알겠지만 공산당에 대한 비뚤어진 증오는 현실에서도 접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나를 지치게 했다. (그리고 붓 잡지 말라고 충고했다는 집안 중에서 정말 양반 그만둔 집은 없다고 역사를 찾아서에서 그러더라ㅡㅡ.) 나는 오리지널(?) 시인에게서 나왔을 법한 시가 더 재미있었다. 그러나 인상적이었던 구절을 하나쯤 적자면 이랬다. 역사이야기보단 할머니 본인의 삶에 대해 더 적었더라면 시가 재미있었을 것이다.
나는 특히 내가 사는 한국이 좁다고 느낀다. 그러나 확실히 이는 심리적 느낌일지도 모른다. 시골을 걸어다니다 보면 서울보다 상당히 크다고 느껴질 때가 있다. 정말로 크기도 하고, 혹은 사람이 적어서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다. 서울은 사람이 많다. 내가 어제 술을 마시고 길바닥에 토하는 걸 목격한 사람이 오늘 내가 술을 마시고 다른 길바닥에 토하는 걸 보지 못할 수도 있다. 중요한 건, 내가 귀를 막고 눈을 감고 그 사람을 기억하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점이다. 대부분은 아는 척하지 않고 그냥 스쳐 지나간다. 그러나 내 내부에 있는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는다. 난 그 때문에 사후세계가 있다 해도, 천국과 지옥의 형태를 띄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지상에는 천국도 있고, 지옥도 존재한다.
No surprises 중에서
광대는 울면 안 돼, 세계가 울음바다가 되니까
광대는 웃으면 안 돼, 세계가 웃음거리가 되니까
정부는 우리를 대변하지 않는다
우리는 추락할 때까지도 웃어야 합니까
우리의 기도는 바늘처럼 날카롭다
온몸이 바늘로 덮인 하느님
불에 탄 시체들이 하느님 주변에 스크럼을 짜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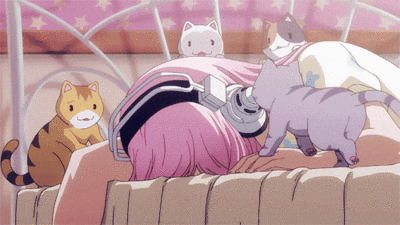
천재에 집착하는 건 자신이 천재가 되고 싶어서가 아닐까? 그러나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내가 네 시점으로 세상을 보고 싶다고 했던 걸 넌 기억하고 있을까? 네 키로, 네 눈으로 세상을 보고 싶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네가 되고 싶어도 나는 네가 될 수 없다. 너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이제 적당히 징징거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해야 하지 않을까? 꾸준히 한 계단씩 밟아가며, 매일의 시간을 네가 해야 할 일로 꽉 채워가는 거지.
이제 그렇게 말하기엔 너무 늦었구나. 나는 이제 더 이상 네가 천재 타령하면서 내 심장에 칼을 꽂는 널 보기 싫고. 너는 이제 더 이상 따뜻하게 감싸주는 사랑을 모르는 나를 보기 싫고. 우린 그렇게 횡단보도에서 만나도, 눈 한 번 마주치지 않고 스쳐지나가겠지. 난 너라는 칼을 감싸주는 검집이 아니었으니까. 또 다른 칼이었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