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래도 나는 ADHD인 것 같다. 도무지 한 가지를 진득하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어려서도 공부를 잘 못 했던 것 같다. ADHD가 진단명(?)이 된 것이 1980년대이다. 그러니 ADHD 증상은 어른들도 잘 몰랐을 테고 그래서 그저 좀 많이 모자라고 멍청한 아이로 취급을 받았던 것.
EBP 페이퍼라는 것을 써야 하는데 집중이 잘 안되네. 이 페이퍼는 미국의 간호대학이나 대학원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라 한 학기에 최소한 하나씩은 써야 하는데 갈수록 쉬워지기는커녕 여전히 막막하다. 그러니 ADHD 끼가 있는 데다 더 집중을 못 하고 이러고 있지. 그래도 일단 내가 사용해야 하는 저널은 충분히 찾아놨다. 그것들을 읽어야 하는데 눈에 안 들어와서 군것질하고 커피 마시고 왔다 갔다 걷다가 알라딘에 들어왔다. 그리운 사람들의 흔적이라도 찾으려고. 그런데 이제는 나와 많이(?) 친했던 사람들은 글을 거의 올리지 않는다. 그래도 여전히 알라딘에 들어오는 나는 뭔가 싶다.
예전에 네이버에서 우연히 내 일주에 대한 재밌는 글을 읽어서 적어놨었다. 출처는 안 적어놔서 없다. 이렇게 공개적인 글로 쓸 생각이 아니어서 그때는 안 적었는데 미안하네.
"**일주 여자는 남편 복보다 자식복이 크고, 자식 복보다 자기 복이 크다. 그러니 먼저 자신부터 세워라." 크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했다. 나를 먼저 세우라니. 그래서 내가 이 고생을 하면서 공부에 매달려 있는 것 같긴 한데, 무의식이 나에게 너는 남편이든 자식이든 의지할 곳이 없으니 너 살 궁리를 해라. 뭐 이랬나 보다. 신기해. 근데 남편 복이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담 반대로 내 복이 엄청 좋다는 건가? 뭐 해석하기 나름이지. 목에 걸면 목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아님 귀에 걸면 귀걸이.ㅋㅋㅋ
요즘 딸아이가 보내주는 손녀의 사진이나 비디오 보는 맛으로 산다. 내 자식들도 많이 이뻐했었지만, 손녀는 또 다르네. 어른들 말 틀린 것 하나 없음. 내가 안 키우면서 내 핏줄이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가 넘 귀여워 죽겠고, 딸아이가 하루라도 사진이나 비디오를 안 보내주면 바쁜 딸아이에게 성화를 하게 된다. 언제 보낼 거냐고. 그러면 남편이 어제 보내줬잖아라고 하면서 막 웃는다. 넘 욕심이 많은 할머니.ㅋㅋㅋ
비비 2개월 (한 달 전 사진)
예전부터 사용했던 Lock screen은 과감히 버리고 계속 이 사진을 사용하고 있다. 볼 때마다 나를 향해 환하게 웃어주는 이 아기 때문에 힘든 날 버틴 적도 많다. 학교가 진짜 빡세니까 그만둔 아이들도 있고, 나도 그런 마음이 굴뚝같은 날이 많은데, 내 핸드폰을 올려보며 좀 만 참아보자고 혼잣말을 한다. 아닌가? 손녀에게 하는 건가? 할머니가 좀 더 참아볼게. 뭐 이런?ㅎㅎㅎ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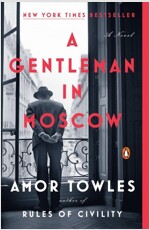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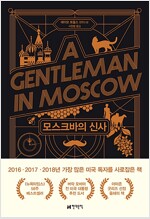

<모스크바의 신사>를 영문 오디오로 들으면서 다니고 있다. 학교가 거의 2시간이 넘게 걸리는 곳에 있다 보니까 다시 오디오북을 듣게 되었다. 지난 학기 내내 Maroon 5의 노래만 듣고 다녔는데 그들의 음악을 들으면 자꾸 속도를 내는 경향이 있기도 하고, 다시 오디오북을 들어야겠다는 생각도 들고 해서.
이번에 받은 오디오북은 표지가 바뀌었더라. 아무래도 HBO에서 드라마로 만들어서 그런가 배우의 얼굴이 나오는 것으로. 아무튼 그 드라마도 봐야 하는데. 여름 학기에 봐야지. 한 과목만 들을 생각이니까 좀 여유가 있겠지. 암튼 어제는 카운트가 소피아와 게임을 하는 장면을 들었는데 참 좋았다. 젠틀한 아저씨가 5~6살이 되는, 핏줄도 아닌 작은 소녀와 함께 노는 것. 이 책을 들으면 소설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 소설에 나오는 카운트 같은 남자를 직접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
힘든 일이 많지만,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좋은 일이 기다리는 것도 아닌데 마음에 설렘으로 작은 파문이 일고 막 행복감을 느낀다. 그저 살아있다는 것이 너무 좋아서.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름답고, 내가 그 안에 살아 있다는 것이 좋아서. 물론 더 파고들면 세상은 그처럼 녹녹하지도 않고 삶은 고달프고 그렇지만, 아침에 눈을 뜨면 늘 셀렌다. 이렇게 다시 숙제할 힘을 얻는 거지.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