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뭐래도 대한민국은 서비스 강국이다. 내 나라 떠나 잠시 일 년 가까이 머무르면서 뒷목잡을 일이 적지 않았는데 이젠 벼라별 일을 다 겪어서 뭐 더 별 일이랄게 있겠냐 싶었는데 대미를 장식할 일이 생겼다.
인터넷이 끊겼다.
대략 일 주일 남짓한 기간동안.
정확히 말해서 아직도 수리가 된 건 아니다. 이 짧은 몇 문장을 두드리는 와중에도 계속해서 와이파이가 끊길까봐 부지런히 걱정덩어리를 굴리는 중이다.
말로 다 표현 못 할 난리법석을 떨고 미국인들은 툭하면 고소남발로 협상의 물꼬를 튼다는데 우리도 그래야 하나, 고민하면서 여기 연락하고 저기 연락하고 집주인을 호출하고 서비스 공급업체와 한바탕 난리를 치고 결국 케이블 교체를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냈고, 드디어 대망의 공사(???)일이 내일로 다가왔는데!
이것은 무슨 조화인지 인터넷이 갑자기 연결이 된다.
이게 다 무슨 쇼인지...
내일 테크니션이 방문하면 이 신기방기(짜증)나는 일을 뭐라고 설명을 해야하는건지 감도 안 온다. 아이고.
인터넷이 끊기니까 삼시세끼 밥해먹는거 말고 할 일이 없어서 정말 책만 읽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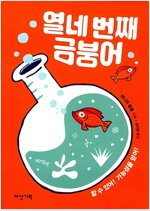
연극을 연출하는 엄마와 엘리가 사는 집에 느닷없이 열세 살 소년으로 회춘한 과학자 할아버지가 들이닥쳐 함께 살게 된다. 할아버지는 과학과 논리의 세계를 사랑하고 엄마는 열정과 예술의 세계를 사랑한다. 엘리는 할아버지의 세계에 훨씬 큰 매력을 느끼면서, 과학에 빠져드는 자신을 발견한다. 심지어 과학에서 무슨 사랑 이야기를 건져낼 수 있겠냐고 묻는 엄마에게 '과학에는 가능성에의 사랑 이야기가 있다'고 멋지게 반박한다. 명언이지 않은가? 가능성에 대한 사랑. 그런데 기본적으로 내가 뭔가에 미쳐있다면 동기도 사랑이고 과정도 사랑인거지(정확히는 애증이겠다...).
그러나 할아버지를 열심으로 변호하고 도왔던 엘리도 결정적인 순간에 할아버지의 연구 목적 자체에 의문을 제기한다. 나는 이런 이야기를 읽는 순간이 짜릿하다. 억지와 생떼만 부리는 어린 아이인 줄 알았던 아이가 문득 부쩍 자란 모습으로 당당하게 의문을 제기하고, 그 정당한 의문이 어른을 꼼짝 못하게 하는 순간이. 굳이 여기서 배역을 나누자면 나는 이제 꼼짝 못 하는 어른 역할을 맡아야 하는 입장인데도.
이렇게 좋은 이야기인데 책을 여러 번 덮어버릴 뻔 했다. 아, 이 수많은 오탈자들을 도대체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다른 건 다 못 본 척 한다쳐도요, 요즘에도 선생이 뭔가를 '가르킨다' 라고 쓰는 번역자나 편집자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해 봤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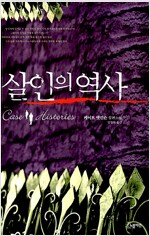
몇 개의 사건이 먼저 주르륵 나열된다. 딸 넷이 있는 집의 가장 사랑받던 예쁜 막내딸이 연기처럼 사라져버린다. 자기집 마당의 텐트에서, 밤사이에. 아이의 흔적은 당연히 찾을 수 없다.
두 번째 사건. 변호사 아버지의 편애하는 열 여덟 살 둘째 딸이 아버지의 회사 회의실에서 정체모를 괴한에게 살해당한다. 살해동기는 아무도 모른다. 범인도 잡히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아마도 아내의 산후우울증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젊은 아버지가 아이 엄마에게 잔혹하게 살해당하고 아기는 행방불명되어 버린다. 그리고 후에 한 사립탐정이 사건에 (전혀 내키지 않아보이지만) 뛰어든다.
이 소설은 장르를 말하기가 너무 어렵다. 범죄가 주요한 소재지만, 범죄 사건 자체보다 거기에 얽힌 사람들의 사건 전후의 감정을 아주 세밀하게 묘사한다. 내가 이렇게 했으면, 저렇게 했으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거야. ***는 여전히 살아 있을 거고 몇 살이 되었겠지. ***를 살려 놓을수만 있다면, 있다면... 이 정도가 피상적으로 피해 유가족의 심정에 대해 바깥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범주라고 하자. 이를테면 아코디언 파일 같은. 이 소설은 그 파일을 한껏 벌려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구겨져 들어가 있는지를 보여준다. 몇 번이고 시간을 되돌려 사소한 행동 하나를 바로잡고 싶은 욕망들, 자책감으로 몇 번이고 겹쳐 접어 너덜너덜해진 마음들, 흐르는 순간 조각나 바닥에 떨어져내리는 시간들.
이 소설을 읽으면서 마음이 너무 무거워져서 힘들었다. 몇 번이나 그만 둘까 생각했는데 끝까지 견디고 읽었는데, 가장 궁금했던 올리비아 사건의 전말이 몹시 사소하고, 아주 지저분하고, 너무 무거워서 진짜 괴롭더라.
하루종일 애들이랑 부대끼다보니 종일 책만 읽는 기분이긴 해도 실제로 읽은 양은 얼마 안 되는구나. 읽어주고 있는 책들도 내가 읽은 책에 포함시키기엔 왠지 양심이 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