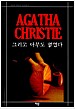순수의 전조
순수의 전조
애거서 크리스티 여사 탄생 125주년을 맞아 영국 국영방송 BBC에서 그녀의 대표작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 (And Then There Were None)]를 3부작 드라마로 제작·방영 중이다. 오웬이라는 익명의 인사에 의해 '인디언 섬'에 있는 외딴 별장에 초대된 각계 여덟 손님과 집사 부부의 연이은 죽음을 다룬 미스터리로, 1945년에 만들어진 영화 속 설정을 차용해서 원작에 나오는 열 개의 인디언 인형 대신 꼬마 병정 인형으로만 바뀌고 그 특유의 을씨년스런 기조와 법조망의 한계를 비튼 내용은 그대로라고 한다. 소설 속 중요 모티브인 마더 구즈(Mother Goose)의 동요는 원래 '검둥이' 이야기였는데 초판 발행후 인권 문제로 항의가 빗발치자 출판사와 협의 하에 인디언으로 바꿨다고 전해진다.

- 열 꼬마 검둥이 Ten Little Nigger Boys -
열 꼬마 검둥이가 밥을 먹으러 나갔네 Ten little nigger boys went out to dine;
하나가 사레들려 아홉이 남았네 One choked his little self, and then there were nine.
아홉 꼬마 검둥이가 밤이 늦도록 자지 않았네 Nine little nigger boys sat up very late;
하나가 늦잠에 깨지 않아 여덟이 남았네 One overslept himself, and then there were eight.
여덟 꼬마 검둥이가 데븐에 여행을 갔네 Eight little nigger boys traveling in Deven;
하나가 거기 남아 일곱이 남았네 One said he'd stay there, and then there were seven.
일곱 꼬마 검둥이가 도끼로 장작을 팼네 Seven little nigger boys chopping up sticks;
하나가 두 동강 나서 여섯이 남았네 One copped himself in helf, and then there were six.
여섯 꼬마 검둥이가 벌통을 갖고 놀았네 Six little nigger boys playing with a hive;
하나가 벌에 쏘여 다섯이 남았네 A bumble-bee stung one, and then there were five.
다섯 꼬마 검둥이가 법률 공부를 했다네 Five little nigger boys going in for law;
하나가 법정 소송에 걸려 넷이 남았네 One got in chancery, and then there were four.
네 꼬마 검둥이가 바다 향해를 나갔네 Four little nigger boys going out to see;
하나가 청어에게 먹혀 셋이 남았네 A red herring swallowed one, and then there were three.
세 꼬마 검둥이가 동물원 산책을 나섰네 Three little nigger boys walking in Zoo;
하나가 큰 곰에게 짓눌려 둘이 남았네 A big bear hugged one, and then there were two.
두 꼬마 검둥이가 볕을 쬐고 있었네 Two little nigger boys sitting in the sun;
하나가 홀랑 타버려 한 명이 남았네 One got frizzled up, and then there were one.
한 꼬마 검둥이가 외롭게 남았다네 One little nigger boy living all aline;
그가 목을 매어 아무도 남지 않았네 He got hanged, and then there were none.
사실 마더 구즈 동요 중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널리 일려진 작품은 아마도 [노간주 나무] 이야기 중에 나오는, 의붓어머니에게 학대 당하다 죽어 새가 된 소년의 한맺힌 노래 '내 어머니 날 죽이고(My Mother Has Killed Me)'일 것이다.
나의 어머니, 그녀는 나를 죽였고 My mother she killed me,
나의 아버지, 그는 나를 먹었다. My father he ate me.
꼬마 마를렌, 나의 여동생은 My sister, little marlinchen
나의 모든 뼈를 한 데 모으고 Gathered together all my bones,
그것들을 비단 손수건에 묶어 Tied them in a silken handkerchief,
노간주 나무 아래 묻어버렸다. Laid them beneath the juniper tree,
아아, 나는 얼마나 아름다운 새인가. Kywitt, kywitt, what a beautiful bird am I.
그리고 나는 저 마더 구즈의 '검둥이' 동요를 접할 때마다 한창 나이에 요절한 빌리 홀리데이의 절창 '이상한 열매(Strange Fruit)'가 떠오른다.
남쪽 지방 나무들은 이상한 열매를 맺네 Southern trees bear stange fruit
피로 물든 나뭇잎들, 뿌리에 흥건한 피 Blood on the leaves and blood at the root
남풍에 흔들리는 검은 몸 Black bodies swinging in the southern breeze
포플러 나무에 매달려 있는 이상한 열매 Strange fruit hanging from the poplar trees
훌륭한 남부 전원 정경에 Pastoral scene of the gallant south
부풀어 오른 눈과 뒤틀린 입 The bulging eyes and the twisted mouth
목련의 부드럽고 신선한 향기 Scent of magnolias, sweet and fresh
그때, 불현듯 살이 타들어 가는 냄새 Then the sudden smell of burning flesh
여기 열매가 있네, 뜯어먹을 까마귀를 위한 Here is fruit for the crows to pluck
거둬들일 피, 피를 빨아들일 바람, For the rain to gather, for the wind to suck
부패시킬 태양, 쓰러뜨릴 나무들을 위한 For the sun to rot, for the trees to drop
여기 이상하고 쓰디쓴 수확물이 있네 Here is a strange and bitter crop

애거서 크리스티의 원작 얘기로 돌아와서, 소설 자체가 동서고금을 통해 워낙에 인기있는 텍스트인 만큼 여러 차례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어졌다. 그중에 필견작으로 르네 클레르 감독이 헐리우드에서 연출한 1945년작 흑백영화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가 꼽힌다. 원작의 음습한 완전범죄 결말과 무겁고도 과격한 문제 의식을 포기하고 해피엔딩을 택한 대신 연쇄살인이 벌어지는 와중에 서로를 의심하고 경계하는 인간군상을 치밀하게 묘사, 그들 각자가 지닌 범죄와 양심의 긴 꼬리을 집요하게 응시함으로써 완성도를 인정받아 여지껏 수작으로 회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