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비터스위트 - 불안한 세상을 관통하는 가장 위대한 힘
수전 케인 지음, 정미나 옮김 / 알에이치코리아(RHK) / 2022년 6월
평점 : 


소노 아야코의 책「중년이후」에 이런 구절이 있다.
내 경험상 체험이 아니라 지식으로만 터득한 것은 나의 피와 살이 될 정도의 정열로 발전된 것은 거의 없었다. 축적된 지식이 나의 체험에 힘입어 하나의 사상이 된 적은 있었지만 다른 사람에게 들은 것, 교육받은 것 중에는 순수하게 그 자체가 나의 신조가 된 것은 하나도 없었던 것 같다.......사람이란 자신이 체험한 것밖에는 알 수 없다는 사고에서 나는 지금까지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p. 111
거의 매일 북플이 알려주는 나의 흔적들을 읽다보면 깜짝 놀랄 때가 많다. '내가 이런 책을 읽었어? 이런 글도 썼었어?' 종종 그런 생각을 한다.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릴 걸 읽어서 뭐하나... 콩나물에 물주듯 생의 어느 한 시기에 접한 책들도 나에게 피와 살이 되었을까....과연....
수전 케인의 이 책에서 마주친 한 문장에 한동안 생각이 꽂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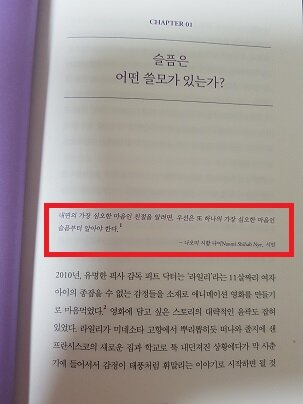
나오미 시합 나이(Naomi Shihab Nye). 1952년생. 미국 시인.
위의 구절은 그의 시 <친절>에 나오는 문장이라서 일삼아 찾아보았다. 원문과 번역한 문장도 옮겨본다. 오늘은 시간이 널널하고 모처럼 마음도 밝다.
Kindness
Before you know what kindness really is
you must lose things,
feel the future dissolve in a moment
like salt in a weakened broth.
What you held in your hand,
what you counted and carefully saved,
all this must go so you know
how desolate the landscape can be
between the regions of kindness.
How you ride and ride
thinking the bus will never stop,
the passengers eating maize and chicken
will stare out the window forever.
Before you learn the tender gravity of kindness
you must travel where the Indian in a white poncho
lies dead by the side of the road.
You must see how this could be you,
how he too was someone
who journeyed through the night with plans
and the simple breath that kept him alive.
Before you know kindness as the deepest thing inside,
you must know sorrow as the other deepest thing.
You must wake up with sorrow.
You must speak to it till your voice
catches the thread of all sorrows
and you see the size of the cloth,
Then it is only kindness that makes sense anymore,
only kindness that ties your shoes
and sends you out into the day to gaze at bread,
only kindness that raises its head
from the crowd of the world to say
It is I you have been looking for,
and then goes with you everywhere
like a shadow or a friend.
친절(류시화 번역)
친절함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알려면
네가 가진 것을 잃어 봐야 한다
싱거운 국에 소금이 녹아 사라지듯이
미래가 한 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느껴 봐야 한다.
손 안에 갖고 있던 것
숫자를 세며 소중히 간직해 온 것
그 모든 것이 떠나가야만 한다
그래야 알게 된다
친절함이 없는 곳의 풍경이 얼마나 삭막한지
결코 멈추지 않을 것 같은 버스에 타고 있는데
승객들은 옥수수와 닭고기를 먹으며
영원토록 창밖을 응시한다
친절함의 부드러운 중력을 배우려면
흰 판초를 입은 인디언이
길가에 죽어 있는 곳을 지나가 봐야 한다
그가 너일 수도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도 나름의 계획을 갖고 밤을 여행한 사람이었다
그를 살아 있게 했던 것도 단순하 호흡이었다
친절함이 내면의 가장 깊은 것임을 알려면
또 다른 가장 깊은 것인 슬픔을 알아야 한다
슬픔에 감겨 잠에서 깨어나 봐야 한다
너의 목소리가 모든 슬픔의 실들을 알아차려
그 천의 크기를 알 때까지
슬픔과 이야기해 봐야 한다
그때 친절함 외에는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없어지고
친절함만이 너의 신발끈을 묶어 주고
밖으로 나가 편지를 부치고 빵을 사게 할 수 있다
오직 친절함만이 세상의 많은 것들 속에서
머리를 들어 말한다
네가 찾고 있던 것은 바로 나라고
그리고 너의 그림자처럼 또는 친구처럼
너와 함께 어디든 갈 것이다
(*'밖으로 나가 편지를 부치고'......요부분은 원문에서 안 보이는데...)
지난번 포스팅했던 <내가 만난 장애아 엄마1>를 쓰면서 떠올린 감정이 슬픔이었는데 그 슬픔이 이렇게 친절로 연결되는 거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슬픔을 알아보는 안목(?)이 있어야 보이는구나, 라는 생각도. 나도 슬픈 거였구나, 라는 자각. 슬퍼야 보이는구나. 다시 소노 아야코로 돌아가서, '사람이란 자신이 체험한 것밖에는 알 수 없다'에 수긍 또 수긍. '친절'이 무엇인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은 느낌. 내가 모르는 것이 참 많다는 내가 아는 것이 참 없다의 다른 표현. 나이 먹는 즐거움 중의 하나는 '이제는 솔직할 수 있다.'라는 생각.
시 한 편 건진 것만으로도 이 책은 읽을 만하다. 솔직히 이런 류의 책은 잔상이 오래가지 않는다. 읽는동안 마음의 위로를 받는 건 분명하지만 책을 덮고나면 곧 잊어버리고만다. 비터스위트라는 달콤씁쓸한 감정을 찾아 나선 작가의 열망과 부지런함이 되려 불편해지는 순간이 결국엔 들이닥치고. 차고 넘치게 설명하지 않아도 알아들을 수 있구먼, 하는 교만한 태도에 흠칫 놀라기도 하고. 독자로서의 예의를 끝까지 잘 지킬 것.
허준이 교수의 졸업식 축사를 동영상으로 보고 축사 원문도 찾아 읽었다. 그중 한 부분.
취업 준비, 결혼 준비, 육아 교육 승진 은퇴 노후 준비를 거쳐 어디 병원 그럴듯한 일인실에서 사망하기 위한 준비에 산만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례와 혐오와 경쟁과 분열과 비교와 나태와 허무의 달콤함에 길들지 말길, 의미와 무의미의 온갖 폭력을 이겨내고 하루하루를 온전히 경험하길, 그 끝에서 오래 기다리고 있는 낯선 나를 아무 아쉬움 없이 맞이하길 바랍니다.
서로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친절하시길, 그리고 그 친절을 먼 미래의 우리에게 잘 전달해 주길 바랍니다.
'오래 기다리고 있는 낯선 나', '먼 미래의 우리'. 중학생 아이들을 가르칠 때 종종 이런 말을 했다. "너희들이 보기에 선생님(나)이 늙어보이지?" 아이들 대답, 이구동성으로 "네." 그러면 이렇게 말한다. "얘들아, 잠깐이다." 아이들이 고개를 젓는다. "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무서워요."
썩 살갑게 다가오지는 않지만 그래도 마지막 축사의 말에 '친절'이 들어가서 좋다. '절 중에서 최고의 절은 친절'이라던 어느 스님의 말씀도 떠오른다. 부디 친절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