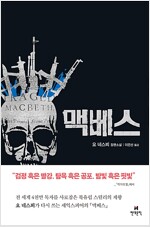요 네스뵈의 [멕베스]를 자기 전에 떠들어 보다 고작 몇 줄 못읽고 잠이드는데 오늘도 하루종일 종종거리다 저녁 준비 전에 잠깐 책을 폈다.
셰익스피어의 [멕베스]부터 다시 읽으려고 꺼내놨고, 더불어 '주제들' 시리즈로 나온 [멕베스 / 양심을 지닌 아킬레스](폴 A. 캔터)를 펼쳐보다가 매우 흥미로운 주제를 다루고 있길래 오랫만에 흥분되는 마음으로 이리저리 살펴본 바 느낀 바가 있어 잠깐 메모해둔다.
나는 최종철 교수가 번역한 민음사 번역판 한 종만을 가지고 있다.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터라 늘 [맥베스]와 [오델로]를 햇갈려 하는데;;;;; 어쨌든 캔턴의 책을 번역한 권오숙은 열린책들에서 [맥베스]를 낸터라 최종철과 권오숙의 번역을 함께 읽으면 좋을 듯하다. 캔턴은 [맥베스]에서 3막 1장에 나오는 장면을 주목한다. 새로 왕이 된 맥베스가 '절망적인 처지의 남자들을 부추겨 뱅쿠오(뱅코)를 암살하게 하려고 설득하는 장면'이다.
여기에 나오는 'gospell'd'란 단어의 중요성을 다룬다.
어떤 자료를 혹은 책을 읽었던건지 다시 펴본 내 [맥베스] 등장인물 페이지에는 연필로 '기독교적 덩컨 vs 스코틀랜드적 맥베스'라는 메모가 있다. ......???? 내가 분명 썼건만 오잉?, 한다.
그리고 캔턴은 "셰익스피어는 영웅적 전사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절대적 진리 사이의 갈등으로 비극 [맥베스]를 전개해 나간다"'(16)고 분석한다. 앞으로 이 주제를 다룰 예정인 것이다.
요 네스뵈의 [맥베스]는 1970년대로 시간을 옮겨, 과거 왕성한 산업도시였다가 몰락한 도시, 그냥 몰락하기만 한 게 아니라 더럽게 타락한 도시를 배경으로 "25년간 철권통치를 해왔던 경찰청장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신임 경찰청장 덩컨이 부패 척결과 범죄 조직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특공대장이었던 맥베스를 조직범죄수사반장으로 승진시키면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한다"(옮긴이의 말)
맥베스는 건장하고 탄탄한 몸을 지닌 특공대 대장이다.
원작에서 맥베스가 어땠나? 마녀로부터 장차 왕이 될거라는 예언을 들어 근질근질하던 맥베스가 살인과 암살을 밥먹듯 하여 목적을 달성해나가는 악당, 반영웅이라고 할 수 있다. '죄책감과 불안감'으로 '소진되어'가는 것으로 해석하던 기존의 분석들과 해석들을 요 네스뵈는 어떻게 재해석하며 기꺼이 이 책을 구입한 나의 흥미를 채워줄 것인가.
그리고 캔턴의 이 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