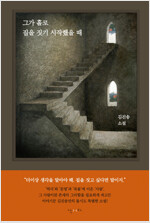
어려운 말은 모르겠다. 김진송 작가의 에세이를 읽은 기억때문에 이 책 역시 당연히 에세이일 것이라 생각했다. 한달 전 장기간 입원이 예상되었을 때 가까이 있던 이 책을 무심코 짐가방에 넣은 것은 에세이일 것이라는 선입견때문이었다. 그리고 결국 이 은유인지 비유인지 현실인지 에세이인지 소설인지 모르겠는 글을 읽기에는 병원이라는 환경과 환자라는 신분으로서는 도무지 집중이 되지 않았다. 그런데 집에 와서 다시 책을 읽기 시작하니 그리 읽기 어려운 책은 아니라는 느낌이다.
표제작인 '그가 홀로 집을 짓기 시작했을 때'가 첫 단편으로 나오는데 솔직히 문장의 표현이 다를 뿐 그 내용의 흐름은 이미 알려져있는 것들과 그리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다 글을 다 읽을때쯤, 예상과 다르지 않은데도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다. 내가 너무 극적인 생각에 빠져 이야기를 확대시켜버린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모두가 다 무심히 툭, 하는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따뜻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다. 이것이 직접적으로 들이대지 않는 소설의 묘미일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소설집을 읽기 시작했는데 이야기를 읽을수록 점점 더 에세이같은 느낌이 들었다.
누군가는 문장의 표현을 포기할 수 없다고 했지만 현실과 멀리 떨어진 느낌의 화려한 미사여구와 문장들은 크게 와 닿지 않는다. 이 소설집은 읽다보면 현실생활에서 튀어나온 글이라 확신하게 되는 문장들이 담겨있고 일상의 사유에서 나온 문장들이 보이는 것 같았다. 적어도 내 느낌은 그랬다.
소설을 읽는 재미라기보다는 그런 문장을 읽고 돌아보는 시간이 그리 나쁘지는 않다.
첫번째 단편의 따뜻한 느낌과는 달리 달팽이를 사랑한 남자, 종이 아이 같은 경우는 조금 그로테스크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서울 사람들이 죄다 미쳐버렸다는 소문이,의 경우 강력한 풍자가 넘쳐나고 있기도 해서 다양한 느낌으로 소설을 읽을 수 있는데 여전히 현실과 비현실에서 조금 더 현실인 느낌이 강해 그저 재미있는 이야기로만 읽을 수 없었다는 것이 지금 이 책을 읽은 느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