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학이 끝났다. 세상에ㅠㅠ 이럴 수가. 휴가도 못 갔고, 많이 놀지도 못했고, 그렇다고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책도 맘껏 못 읽은 거 같은데. 방학이 끝났다. 월요일 개학 기념으로 방학 중 최고의 이벤트였던 '스피박 실물 영접 후기'를 써보자.


강연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가게 되면 앞에 앉는 편이다. 앞쪽에 앉을 때, 가운데 앉는다. 스피박 강연 때도 그랬는데, 앞쪽 두 줄이 초대석이었다. 나도 신청하고 간 건데, 맨 앞줄의 저 초대석은 신청 안 하고 '초대된' 사람들이 온 걸까 궁금해하면서 앞에서 4번째 줄, 초대석 더해서 6번째 줄에 앉았다. 더 앞쪽으로 갈까도 싶었는데, 가운데 쪽이 좋아 그 자리에 앉았다.
무사히(?) 강연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다. 앞쪽, 즉 초대석에 앉은 사람이 손을 들었다. 앉아있을 때는 몰랐는데, 키가 큰 남자, 말 그대로 서백남이었다.
강연도 자주 가지 않거니와, 강연에 참석한 경우에라도 질문하지 않는 편이다. 하지만, 강연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강연을 마친 후에 질문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면, 조금 서운하지 않을까 싶어, 용기 내어 손을 들고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과 비슷한(?) 마음을 느끼곤 한다. 첫 번째 질문자는 그 대학의 교수였다. 질문을 시작했는데, 아... 질문의 배경에 대한 설명 혹은 언급이 끝나지 않는 거다.
그때 갑자기, 스피박님께서 손을 내저으시고는 청중을 향해 물으셨다. "질문이 상당히 긴데.... 여러분, 이 질문 다 이해하고 있는 거죠? 지금, 잘 따라오고 있는 거죠?" 청중은 긍정의 의미로 제각각 웃었다. 행사 진행과 부총장의 축사, 스피박님의 강연이 전부 통역 없이 영어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까지의 과정을 함께한 청중들이라면 그 질문을 이해할 수 있을 터였다. 스피박님의 의도는 명확했다. 질문을 하시오. 기다리고, 기다려도 질문은 등장하지 않았고, 결국 돌아오는 선생님의 역공. Go to the question.
그다음 질문 역시 초대석의 서백남이었고, 역시나 교수였다. 이 교수는 앞 교수의 교훈을 오늘에 되살려 최대한 짧게 질문하려 했으나, 역시나 돌아온 스피박 선생님의 역질문. What is your question?
그 이후의 질문 시간도 마찬가지였는데, 인도에서 공부하기 위해 한국에 온 젊은 여성이 유일하게 스피박님에게 좋은 질문을 했다며 칭찬을 들었다. 서발턴은 아이덴티티로서가 아니라 포지션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 그에 대한 그람시의 해석 등등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흥미로웠던 건, 질문 그 자체라기보다는 질문하는 사람들의 모습, 태도에 대한 것이었다.
의도에 대해서라면 알 수 없다. 외모로 판단할 수도 없는 일이다. 다만, 스피박님의 강연을 들으러 온 그 소중한 자리에서 열심히 질문하는 모습과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만들어진 그 질문들이 얼마나 어이없는가에 대해, 혹은 필요 없이(정확히는 쓸데없이) 장황했는가에 대해 나는 오래오래 생각했다. 세계적인 석학인 스피박님에게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고 할 수 있을까. 같이 강연을 들었던 자신의 학생들에게 강렬한 모습을 남기고 싶었던 건 아닐까. 확언할 수 없고, 장담할 수 없지만, 나는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나와 비슷하게 느꼈을 거라 생각한다.
여기에 대해 이렇게 길게 쓸 수 있는 이유는 이 일이 남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나 역시 그런 사람이고, 내가 그런 사람이란 걸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생일 즈음에,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싶었다. 그 노력이 완전히 실패했다고는 할 수 없는데, 깊은 인상을 남기기는 했다. 나쁜 쪽으로 혹은 안 좋은 쪽으로. 이불킥과 머리 쿵쿵의 시간이 얼마큼 지나고, 말복이 지나도 찬바람이 불지는 않았지만, 나는 조금씩 제정신을 찾아가고 있었다. 이런 혼란의 순간에 김건희의 말이 떠오른 건 또 무슨 일일까. 무수한 학력 위조와 의도적 조작이 드러났을 때, 김건희는 말했다. 돋보이고 싶은 마음에 그랬습니다. 아, 그 마음을 알겠는 내 마음. 이내마음.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고픈 마음. 스피박 선생님에게 칭찬받고 싶은 마음. 강연자들에게 은근한 찬탄을 받고 싶은 마음. 학력을 위조해서라도 돋보이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 이내마음.


자기 증명과 인정 투쟁의 그 지긋지긋한 정글에서 벗어나는 길은 없을까,를 고민하면서 악셀 호네트의 책 두 권을 대출해 왔다. 자세히 보지 않아 모르겠지만, 목차로 살펴보기에 내가 궁금해하는 '자기 보존을 위한 투쟁'보다는 '인정투쟁을 정체성 인정을 넘어 물질적 재분배까지도 획득해 내는 운동으로 발전시키려는 악셀 호네트의 시도'(알라딘 책소개)가 펼쳐진다고 한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 문제에 대한 진정한 승자는 에밀리 디킨스와 프란츠 카프카이다. 그리고 소설 속 인물로는 주커먼. 과거의 내가 필립 로스를 그렇게나 좋아했던 이유를, 나는 이제야 알 것도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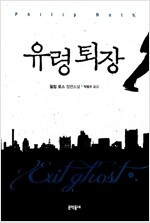
나는 만찬회 같은 데도 참석하지 않고 영화 구경도 가지 않고 텔레비전도 보지 않는다. 휴대전화나 VCR나 DVD 플레이어나 컴퓨터도 가지고 있지 않다. 나는 계속 타자기의 시대를 살고 있고, 월드와이드웹이 뭔지도 모른다. 선거 같은 것도 더는 신경 쓰지 않는다. 나는 하루의 대부분을, 대개 밤늦게까지 글을 쓰며 보낸다. 독서도 하는데, 주로 학생 때 처음 접했던 책들을 읽는다. (『유령 퇴장』, 13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