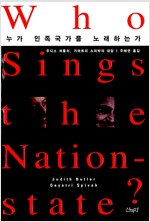진득하면 참 좋을텐데 태생적으로 진득하지 못 해, 『오리엔탈리즘』을 다 읽지 못 하고, 『오리엔탈리즘과 에드워드 사이드』를 읽는다.



『읽는 인간』에서 오에 겐자부로가 한 장을 통틀어 강조해 말할 때의 ‘에드워드 사이드’는 참 멀리도 존재하는 외계인 같았고, 양자오의 『꿈의 해석을 읽다』의 ‘에드워드 사이드’는 같은 행성을 살기는 하되 이름만 아는 지구인 중의 하나였다.
배경지식 없이 『오리엔탈리즘』을 읽으면서는 아시아/타인종을 타자로 바라보는 유럽/백인의 시선이 여성을 타자로 대하는 남성의 시선과 묘하게 비슷하다고 느꼈다. 이 책의 저자 발레리 케네디는 모호한 느낌을 이렇게 표현한다.
다시 말해서, 익숙한 여성에 대한 남성들의 경멸감과 처음 본 여성에 대한 두려움과 즐거움 속의 남성들의 짜릿함 사이에 여성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서양의 경우 타자성이 동양 속에 체화되어 있다면, 남성의 경우 타자성이란 여성 안에 체화되어 있다. (11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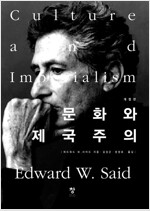
『문화와 제국주의』라는 후기 저작에서, 사이드는 젠더와 계급이 문화와 제국주의와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이라고 밝히기는 했지만(183쪽), 실제 그가 비평적 해석을 위해 선별한 텍스트들은 유럽 중심적이고 대부분은 서양의 고전들(210쪽)이다. 『문화와 제국주의』는 『오리엔탈리즘』보다는 조금 더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작가들을 다뤘지만, 이들 역시 비서구의 남성들 뿐이기에, 저자는 타자의 ‘타자들’은 여전히 어둠 속에서 잊혀져있다고 주장한다.(216쪽)
특정 인종을 객관화하며 다른 인종을 희생시켜 주체화하고, 객관화된 인종을 역사를 넘어선 초월적인 존재로 만들어 버리는 인종차별의 지형도는 시몬 드 보부아르에 의해 초월적 주체로서의 남성과 내재적 객체로서의 여성과의 관계 속에서 이미 철저히 탐구된 바 있다.(111쪽)
평생을 이방인으로 살았고,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채로, 오직 학자로서의 양심을 지키고, 지식인의 책무에 정진했지만, 젠더 문제에 관한 한 에드워드 사이드는 끝까지 작은 실마리마저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가장 가까이에 존재하지만 가장 멀리 떨어진 대상으로서, 억압의 실체조차 밝혀지지 않은 타자가 바로 여성이라는 사실을. 에드워드 사이드는 서양이 동양을 ‘여성성’이라는 관념 속에 묶어두었다고 지적했지만, 실제의 여성들이 그런 방식으로 삶이 제약되고 있음을 보지 못 했다.
에드워드 사이드의 한계에 대한 저자의 비판적인 사유에는 일면 동의하지만 저자의 주장에도 억지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걸 덧붙이고 싶다. 저자의 주장대로, 사이드는 스스로를 ‘백인 중산층 서구인’으로 위치시키고 있지만, ‘앵글로 아메리칸 학계라는 특권 사회에서 정회원으로 사는 것은 망명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사치스러운 자기 정체성의 자리매김(114쪽)’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자기 나라에서 쫓겨나 살 곳을 잃었는데 그럼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살라는 말인가. 에드워드 사이드가 앵글로 아메리칸 학계에 자리 잡지 않았다면, 도대체 누가 그의 주장에 귀 기울였겠는가. 평범한 젊은 학자였던 사이드가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된 건, 그가 앵글로 아메리칸 학계의 정회원이어서가 아니라, 『오리엔탈리즘』이라는 독창적이고 독보적인 성과를 만들어냈기 때문이 아닌가, 라고 저자에게 묻고 싶다.
에드워드 사이드는 끝내 탈식민 문제를 젠더와 연결시키는데까지 나아가지 못했지만, 적어도 그가 제안한 탈식민 이론과 탈식민 담론 연구는 페미니즘 이론의 정교화에 일정부분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호미 바바와 스피박의 책을 몇 권 골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