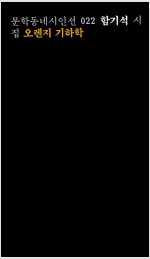아이들이 학교에 간다. 단축 수업이긴 하지만 매일 등교하는 게 나에는 여유를, 아이들에게는 규칙적인 생활을 가져왔다. 요즘은 낮에 걷는다. 밤에는 반려견을 산책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된다. 더 쓰지 않아도 되는 여백을 걷게 된다. 낮에는 저녁 준비나 아이들과의 약속이 있어 시계를 봐야 하지만 해가 있다. 해가 내 어딘가를 살균해 주는 느낌이 있다. 어제 보니 나뭇잎이 많이 떨어져 있었다. 오토바이가 지나가자 그 바퀴에 휩쓸려 뒹구는 잎들. 어쩐지 쓸쓸해진다.
오랜만에 시를 읽다 웃었다. 배수연의 '청혼'. ' 너의 외투 속을 날아다니는 작은 새/그 새의 둥지를 부수지 않고/너를 꼭 안아 줄 수 있을까'라는 의문은 연인에게만 해당하는 일은 아닐 것이다. 나는 아이들 마음의 둥지를 부수지 않고 안아 주고 있는 걸까. 떨어진 잎이 아니라 이제 막 피는 싹 같은 청혼이라 흐뭇해지는 걸까.
창밖의 나무들이 움직임 없이 서 있다.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다. 내가 알지 못하는 흔들림이 나무껍질을 뚫고, 잎을 떨어뜨리고, 쉼 없이 무언가 중얼거리고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