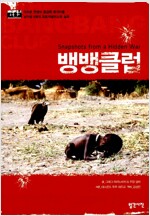뱅뱅클럽
지난 2012년 4월, 영화 〈뱅뱅클럽〉이 한국말로 나와 디브이디로 사서 볼 수 있다. 올 2013년 3월, 이야기책 《뱅뱅클럽》이 한국말로 나왔다. 이야기책 《뱅뱅클럽》은 총알이 빗발치는 싸움터에서 죽음을 아랑곳하지 않고 사진을 찍어 ‘전쟁이 얼마나 끔찍하고 나쁜가’를 밝히려 하던 네 사람 삶자락을, 이들 가운데 두 사람이 죽고 두 사람이 남은 뒤 2000년에 내놓은 책이다. 자그마치 열네 해만에 《뱅뱅클럽》이 한국말로 나왔다. 한국사람은 이 책이 한국말로 나오기까지 ‘케빈 카터’를 비롯한 남아프리카공화국 사진기자들 삶과 넋을 조금도 제대로 살피지 못했으리라. 아니, 제대로 살필 틈이 없었겠지. 왜냐하면, 한국말로 된 이야기가 알려지지 못했을 테니까. 그러나, 정보가 없더라도 마음이 있으면 알 수 있으리라. 죽음과 삶 사이에서 죽음하고 훨씬 더 가까운 자리에 서면서 죽느니만 못하다고 느끼는 모습을 날마다 숱하게 부대끼며 사진으로 담아야 했던 사람들 가슴에는 무엇이 있을까. 죽은 사람 곁에서 죽음을 사진으로 찍어야 하고, 곧 죽을 사람들 언저리에서 이들이 삶 쪽으로 돌아가도록 손끝 하나로도 돕기 어려운 형편에 놓인 사진기자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는 동냥하는 사람 곁을 그냥 지나치지 못한다. 내 옆지기도 우리 아이들도 동냥꾼 곁을 그냥 지나가지 못한다. 내 옆지기는 더할 나위 없이 마음이 넓어, 주머니에 5만 원짜리가 있으면 그냥 이 5만 원짜리를 내려놓고 가는 사람이다. 나는 집살림을 조금 돌아보면서 차마 5만 원짜리는 내려놓지 못하고 1만 원짜리로 바꾸어 내려놓는다. 그렇지만, 하루치 살림돈조차 없어 허덕일 때에는 100원짜리 쇠돈 하나 내려놓지 못하고 지나가는 때가 있다. 이때에는 마음만 내려놓고 간다. 우리 식구들은 살림돈 없어 100원 아닌 10원조차 내려놓지 못하지만, 우리 아닌 다른 아름다운 분들이 넉넉히 사랑 베풀리라 믿습니다, 하는 마음을 내려놓는다.
뜬금없는 소리라 할 테지만, 영화 〈뱅뱅클럽〉을 보고 싶은데 아직 못 본다. 디브이디 살 돈이 못 되어 아직 못 본다. 이야기책 《뱅뱅클럽》도 읽고 싶지만 입에 군침만 흘리면서 못 읽다가, 고마운 어느 분이 이 책을 선물해 주어 이틀에 걸쳐 찬찬히 읽었다. 아이들 밥 차려 주면서 읽고, 아이들과 함께 놀면서 읽었다.
사람들이 ‘사진과 윤리’ 또는 ‘사진과 도덕’이라는 말을 함부로 내걸며 뭇칼질하는 도마에 오르는 케빈 카터라고 하는 사진기자는 고작 서른셋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케빈 카터라고 하는 사진기자는 ‘콘도르가 지켜보는 아이’ 사진으로 퓰리처상을 받았으나, 이녁 스스로 퓰리처상 받을 생각이 없었을 뿐 아니라, 퓰리처상이 있는 줄조차 몰랐다. 케빈 카터로서는 남아프리카뿐 아니라 아프리카땅 이웃나라 어디에서나 너무 쉽게 마주하는 슬프고 힘들며 고단한 사람들 삶을 사진으로 널리 알려 이들한테 사랑어린 손길이 닿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하나로 사진을 찍었다.
케빈 카터한테 퓰리처상을 주지 않았다면, 아니 뉴욕에 있는 〈뉴욕타임즈〉 편집자가 ‘뉴스위크 잡지에서는 아직 퓰리처상 받은 사진기자 내놓지 못한 아쉬움’을 풀려고 ‘이 사진 한 장을 일부러 내놓아 상을 받으려 한 꿍꿍이’를 품지 않았다면, ‘이 사진이 퓰리처상을 받은 뒤에라도 이 사진에 깃든 넋과 마음을 슬기롭게 헤아려서 사진기자한테 무거운 짐덩이 들씌우지 않았다’면 어찌 되었을까.
모르는 사람들은 너무 쉽게 말한다. ‘콘도르가 지켜보던 아이는 어떻게 되었느냐’ 하고. 그래, 그러면 그 다음도 물어야지. ‘이 사진 찍은 사람은 그 뒤 어떻게 되었느냐’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도 물어야지. ‘이 사진으로 〈뉴욕타임즈〉 이름값 올리려고 애쓴 그 편집자들은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느냐’ 하고. 마지막으로, ‘이 사진을 본 당신은 오늘 어느 곳에서 어떤 삶 일구느냐’ 하고. 그런데, 이에 앞서 물어야 할 이야기가 있지 않나. ‘왜 그 아이는 굶주린 나머지 콘도르가 지켜보는 앞에서 엎드려 쉬어야 했을까’ 하고. ‘왜 권력자들은 독재정권 뱃살 불리기만 하고, 평화를 외치는 인도주의 나라는 군사무기 만드는 데에 어마어마한 돈을 펑펑 쏟아붓는가’ 하고. 4346.3.29.쇠.ㅎㄲㅅㄱ
(최종규 .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