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라딘에서 21세기 라는 문구를 보기는 했어도 딱히 관심이 생긴건 아니라 뭔지도 몰랐는데, 어제 잠자냥 님의 페이퍼를 보고서야 오! 했다.
어제의 잠자냥 님 페이퍼는 여기 ☞ 나도 한다 <21세기 최고의 책>
2000년부터 2024년까지 출간된 책이라는데, 자, 나도 잠자냥 님 따라 한 번 해보도록 하겠다.

21세기 최고의 책,
이라는 타이틀을 보자마자 가장 먼저 떠올린 책은 바로 '레이첼 모랜'의 《페이드 포》였다.
나는 이 책을 두 번 읽었고 읽을 때마다 감탄했다.
같은 일을 겪고도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또 그것으로부터 어디까지 뻗어나갈 수 있는지는 각자에게 다를텐데, 통찰이라는 면에서 봤을 때 레이첼 모랜은 최고의 경지에 이른게 아닌가 싶다.
성매매에 어떻게 들어서게 됐는지, 거기에서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레이첼 모랜이 보고 느끼고 생각한 것이 이 책에서 굉장히 깊고 넓게 펼쳐진다.
돈을 받고 성을 팔 수밖에 없는 여성과 그녀들에게 성을 구매하는 남성들 모두가 점점 더 타락할 수 밖에 없는 '타락의 상호작용' 부분은 특히나 인상깊었다.
이 책과 같이 읽을 책들이라면 이런 책들이 있다.




두번째 책은 '애나 칭'의 《세계 끝의 버섯》.
도대체 버섯으로 무슨 이야기를 한다는걸까. 세상 어딘가에서 버섯으로 인문학 책을 쓰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신기했는데, 이 책을 펼치니 와, 놀라운 이야기가 가득했다.
인간의 간섭이 어떤 생명에게 파괴를 가져오지만 또 어떤 생명에게는 탄생을 가져온다는 것에서부터,
자본주의와 가장 멀었던 버섯 채집이 그러나 채집꾼들의 손을 떠나 자본주의 세계로 들어오고, 최종적으로 일본인에게로 가 선물이 될 때 다시 자본주의에서 멀어지는. 세계가 어떻게든 어떤 식으로든 얽힐 수밖에 없는 과정을 보는 것은 내내 흥미진진했다.
이 책도 두 번 읽었다.

사실 가장 먼저 떠올린 한국 소설은 '박경리'의 《토지》였지만, 그 책은 2000년 이전에 쓰여진 작품이라 패쓰. 사람들이 이승우의 소설 중 무얼 먼저 읽을까, 를 내게 물을 때, 나는 이 책, 《일식에 대하여》에 실린 단편 <고산지대>를 추천한다. 일단, 이것만 읽어봐, 라고.
이승우가 쓰는 소설은 다른 소설가들의 그것과는 다르다고 나는 생각한다.
사실 그건 이야기보다는 이승우 고유의 문장이 차지하는게 좀 더 크긴한데, 그 뛰어난 문장들로 숙연한 이야기를 담아낸 게 <고산지대>이다. 고산지대의 마지막을 읽노라면, 소름이 돋는다.
'최고의 책'이라고 해서 <고산지대>가 실린 이 책을 선택하긴 했지만, 사실 나는 이승우의 《사랑이 한 일》을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아한다. 아브라함과 아들의 이야기, 그리고 하갈의 이야기를 이승우 식으로 다시 쓰기한 것이, 그 안에 담긴 고민과 정서가 그리고 사랑이 너무너무 좋다.

네번째는 '아다니아 쉬블리'의 《사소한 일》.
아, 바로 이 맛에 문학을 읽는거야, 문학은 이런 일을 할 수 있어! 라고 감탄하며 읽었던 책이다.
팔레스타인 작가가 쓴 전쟁과 그 안의 인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그대로인 상황에 대한 이야기. 어떤 지점에서 분명 괴롭지만, 그러나 그 괴로움이 바로 지금 현재 상황의 것과 다르지 않기에, 이 책이야말로
'일독을 권한다'
과거의 일이었으며 현재의 일이다.

다섯번째, '장 지글러' 의 《인간 섬》.
현재를 사는 사람들중 대부분은 난민의 존재를 뉴스에서만 접하고 나랑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할텐데, 분명 어딘가에 어려운 삶이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면, 그 삶을 잘 들여다보아야 그 다음으로 갈 수 있는게 아닐까 싶어서 읽어보게 된 책이다.
사실 계기는 소설이었다.
'카밀라 그레베'의 《애프터 쉬즈 곤》에는 난민에 대한 혐오를 가지고 있던 인물이 그 자신이 난민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장면이 있다. 어딘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면 바로 여기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등장인물의 '내가?' 를 보고 난민에 대해 너무 모르고 살지는 말자, 하고 장 지글러를 읽게 되었다.
나는 우리가 이 책을 읽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섯번째 책은 '게일 다인스'의 《포르노랜드》
2000년에서 2024년까지 가장 크게 발전하고 가장 빠른 속도로 발전한 게 포르노가 아닐까.
지금의 포르노는 중장년이 알고 있는 그 포르노가 아니다.
포르노 안에는 우리의 주변인물이, 어쩌면 바로 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많은 여성들이 학대를 당하며, 그리고 그 안에서 빈번하게 폭력과 여성혐오 인종혐오가 파생된다.
포르노는 낄낄거리며 즐길 수 있는 혹은 섹스에 참고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
폭력적 행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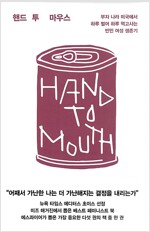
일곱번째 책은 '린다 티라도'의 《핸드 투 마우스》이다.
이 책을 읽고서야 비로소 내가 그동안 빈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다.
빈곤은 게으른 사람에게 찾아오는 게 아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을 하고 또 해도 제대로 된 토스터기 하나 살 수 없는게 빈곤이다. 나쁜 소비인줄 뻔히 알지만 나쁜 소비를 할 수밖에 없는게 빈곤이다. 빈곤은 몸을 병들게 하고 빈곤은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한다.
막연히 빈곤이 어떨것이다, 라고 안다고 생각하는 것과, 이 책을 통해 실제 빈곤을 마주하는 건 차이가 있다.
같이 읽으면 좋을 책들 몇 권 추려본다.




여덟번째 책은 '도나 해러웨이'의 《해러웨이 선언문》.
이 책을 읽으면서 철학관련 팟캐스트를 듣기도 했는데, 와 이 책 역시 놀라운 책이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고등동물로서 저 혼자 잘나서 살고 있는게 아니라는거다. 나라는 이 하나의 인간이 존재하는 건 수많은 비인간 존재들의 엮임과 얽힘으로 가능하다는 것.
이런 식의 생각을 도나 해러웨이로 인해 처음 접하게 됐고 그래서 신선했으며 좋은 의미로 충격이었다.
언젠가부터 동물 노동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는데, 해러웨이 선언문 읽고나니 비인간 존재들의 이야기가 더 궁금해졌다. 그러나 그들이 직접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그 이야기들마저 인간들로부터 온것일텐데, 그건 과연 비인간 존재 그들의 이야기일까?
아 여섯시다.. 퇴근해야 되는데.. 여기까지만 쓰고 갈까, 잠깐 고민하다가, 마저 쓰고 가는 걸로 하자..

아홉번째 책은 '캐시 박 홍'의 《마이너 필링스》이다.
점점 더 모국이 아닌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이 책은 저자인 캐시 박 홍이 미국에서 아시아인 여성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작년 여름 이탈리아에서 잠깐의 인종차별을 당한 후에, 외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런 식의 인종 차별을 더 오래 당할텐데, 그런 식이라면 성격까지 바뀔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외국에서 아시아인 여성으로 살아가는 이야기는 아시아인 여성에게도 그리고 비아시아인에게도 비여성에게도 꼭 필요한 이야기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 책과 함께 백인 여성인 '로빈 디앤젤로'의 《백인의 취향성》도 읽어보기를 추천한다.

열번째 책은 '다니엘 글라타우어'의 《새벽 세시, 바람이 부나요?》이다.
이 책은 많은 사람들이 가벼운 로맨스로 읽지만, 이 책은 그보다 더 크다.
물론 성인 여성과 성인 남성이 서로의 존재를 알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감정이 짙어지는 로맨스인건 맞다.
지금은 더이상 특별하지 않지만 이 책이 쓰여졌을 당시에는 '이메일' 자체가 편지를 대신해 쓰이는 수단이었다. 그 수단을 이용해서 설렘을 전하는 것도 좋았고, 그래서 그들이 주고 받는 이메일을 활자로 읽으며 그들이 느꼈을 감정을 고스란히 전달받는 것도 이 책의 특별한 점이다. 그러니까 이 책은 문학이 할 수 있는, 아니지, 문학'만'이 할 수 있는 큰일을 했는데, 그건 바로
등장인물들이 '활자'를 읽으며 느끼는 감정을 독자 역시 똑같이 '활자'를 읽으며 느낀다는 거다. 그들의 설렘과 실망과 초조함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건 주인공들과 독자가 같은 수단으로 감정 교류를 하고 있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문학'만'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을 보여준건, 이 책의 등장인물들은 서로의 얼굴을 모른다는 거다. 본 적이 없다는 거다. 독자가 그러는 것처럼.
거의 모든 소설 속의 이야기에서 등장인물들은 서로의 모습을 안다. 대화를 하고 안고 싸우고 이 모든 과정에서 그 사람들은 서로에게 실체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에미가 레오에게 실체이지 않고, 그리고 에미가 독자에게 실체이지 않다. 그 실체를 궁금해하는 게 독자만의 몫이 아니라는거다. 내가 에미가 궁금하듯, 레오도 에미가 궁금하고 에미가 레오를 궁금해하듯 독자도 레오를 궁금해한다. 후버까페에서 그들이 만나기로 했을 때, 이 사람이 그 사람일까, 저 사람이 그녀일까, 라는 초조함을, 책을 읽는 내내 독자가 똑같이 가져가는거다. 이 책에서만큼은 등장인물들과 독자가 동등한 위치에 서있다. 우리는 그(녀)의 모습을 모른다는 것. 그런데 그들 사이에 오고가는 이메일은 함께 읽고 있다는 것.
문학만이 줄 수 있는 참 묘미가 이 책에 있다.
자, 다 썼다. 이제 퇴근해야지
뿅!!